![[천자칼럼] 항생제 딜레마](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024903.1.jpg)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세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인류를 세균 감염에서 구원한 기적의 물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부상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대 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던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강연에서 항생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누구든지 가게에서 페니실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부터는 항생제 내성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플레밍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정 처방 매뉴얼을 보급하고, 항생제 처방을 덜 한 병원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번 내성균이 생기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위중한 세균성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기준으로 127만 명이며, 2050년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31.8DID로 집계됐다는 소식이다. 인구 1000명이 매일 31.8인분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4위를 기록한 2022년(18.9DID)보다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 국내 의사들도 항생제 남용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처방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환자 대다수가 항생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약을 세게 쓰는 병원이 ‘명의’로 이름을 날리는 세태가 항생제 과잉 처방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우리도 항생제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됐다. 처방이 잦은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인식 전환이다. 독한 항생제는 독한 병을 대비해 남겨둬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송형석 논설위원 click@hankyung.com

 3 weeks ago
10
3 weeks ago
10
![[부음] 유규상(서울신문 기자)씨 외조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新 광수생각]진짜 불로소득을 묻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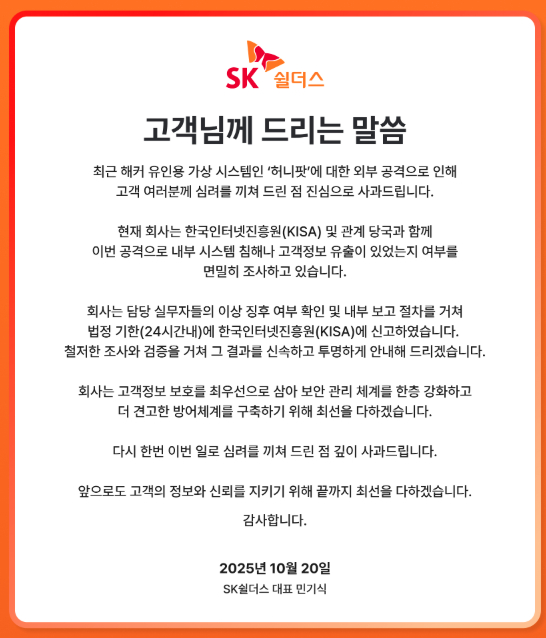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