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처럼 가입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프로덕트(제품) 단에서 타사와 협력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최윤정 넷플릭스 사업개발 디렉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네이버스퀘어 종로에서 열린 '네이버 넷플릭스 밋업' 세션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서도 네이버와의 협업이 특별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최 디렉터는 "넷플릭스 입장에선 네이버가 가진 대한민국 고객 인프라가 굉장히 폭넓게 연령, 지역별로 펼쳐져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넷플릭스도 글로벌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넷(네이버·넷플릭스) 제휴' 이후 넷플릭스에는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됐다. 최 디렉터는 "네넷 제휴를 통해 35~49세 사용자와 남성 사용자들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지역 커버리지 역시 기존보다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네넷 제휴를 통해 넷플릭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또는 한동안 넷플릭스를 떠났던 사용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네이버와의 제휴 이후 넷플릭스의 시청 패턴이 다양해진 것이 그 방증이다. 통상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 랭킹은 당시 출시된 작품 위주로 구성되는데 네이버 가입자들 시청지표는 신작보다 이미 공개된 작품 위주로 형성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흑백요리사'나 2022년 방영된 '더 글로리'가 각각 네이버 가입자들 시청지표 1위와 6위를 차지하는 식이다.
최 디렉터는 "자신의 방식과 리듬대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이런 결과는 넷플릭스가 늘 원하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취향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더 넓은 고객층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네넷 제휴는 콘텐츠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협업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구본정 넷플릭스 마케팅 파트너십 매니저는 "네넷 캠페인을 통해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넷플릭스 작품을 접목해보는 새로운 실험들이 있었다" 면서 "네이버는 이커머스, 예약, 지도 등 사용자 일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사용자 일상으로 확장되는 경험들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네이버 또한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냈다. 네이버 멤버십 파트너사들로부터 호응이 있었던 게 대표적이다. 정한나 네이버 멤버십 리더는 "멤버십 파트너사분들이 넷플릭스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게 기억에 남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나은빈 네이버 마케팅 책임리더는 "이번 ‘네넷’ 이후 이후에 다른 카테고리의 브랜드사와도 성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네넷'은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협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나 리더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와의 만남을 두 브랜드의 로고를 붙이는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두 브랜드를 '하나의 사용자 경험'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네넷'이란 단어 조합은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네이버에서 넷플릭스를 보세요'라는 조합의 명확성과 함께 '네넷'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내포하고 있다.
구 매니저는 "글로벌 동료들에게 네넷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발한 단어 조합이고, 한국 문화에 얼마나 특화된 상징성을 가졌는지 전달하는 게 큰 도전이었다"며 "론칭 이전에는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들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놨다. '네넷' 2차 마케팅 캠페인에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서의 파트너십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넷 제휴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만남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멤버십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제휴와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전 국민 중심의 높은 접근성을,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와의 협업과 사용자 혜택 측면에서 윈윈(win_win)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14 hours ago
3
14 hours ago
3
![광고 없이 추천만? 챗GPT '공짜 쇼핑'의 숨은 전략 [AI브리핑]](https://image.inews24.com/v1/3e4dfb5665e8f5.jpg)
!["순혈주의 깼다"…현대오토에버, 'S급' 외부 인재 폭풍 영입 [강경주의 테크X]](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3382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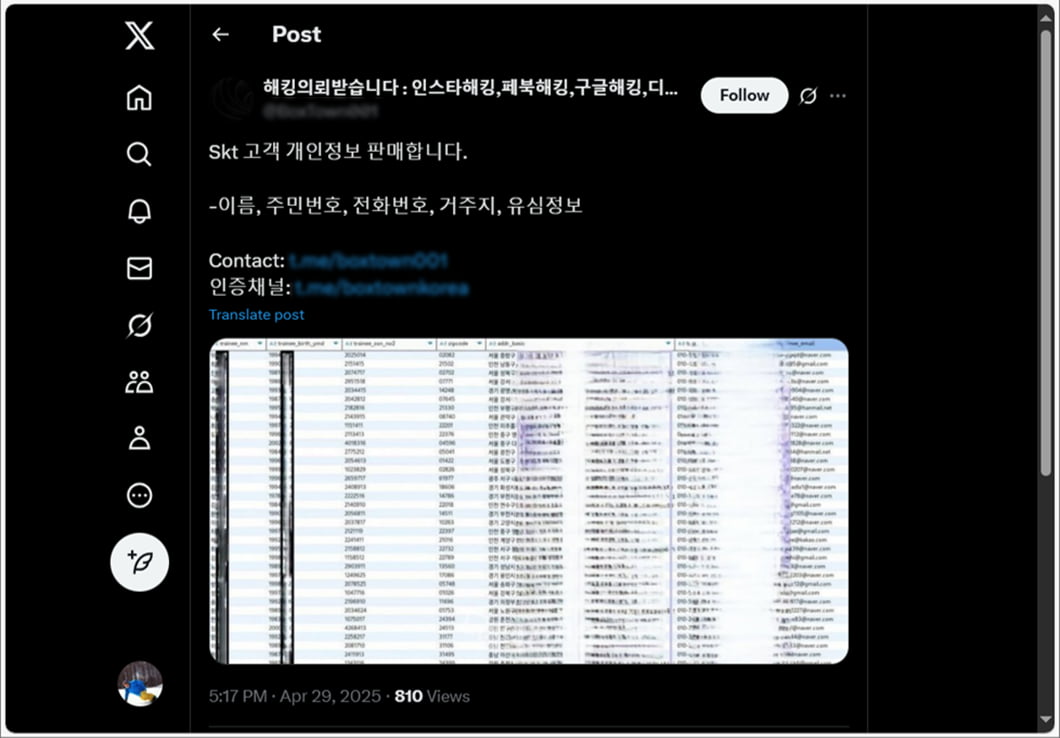













![[순위표] 박지훈 역시 강하다⋯'약한영웅2', 글로벌 2위 출발](https://image.inews24.com/v1/0a92b61201261d.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