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추천받은 빗소리 좋아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29648277.1.jpg)
추석 내내 비였다. 내려갈 때도 비. 올라올 때도 비. 빗소리에 젖어 있으니까 더 이상 젖을 것도 없는데 그칠 줄 몰랐다. 카페 창밖을 두드리는 비에서 굽 소리가 들린다. 머릿속엔 어느새 영화 ‘싱인 인 더 레인(Singin’in the Rain)’의 주인공 돈 룩우드가 빗속에서 탭댄스를 추는 장면이 펼쳐진다. 비처럼 젖어 드는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차고 신선하게 내 심장을 두들겨댔던가.
대학 도서관 꼭대기 층에는 미디어 자료실이 있었고, 나는 자주 거기서 영화를 봤다. 이 영화도 미디어 자료실에서 헤드셋을 쓰고 작은 구식 모니터로 본 영화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습작 노트 위에 덧그린 이름 하나가 있었다. 나는 지긋지긋한 비를 좋아해 보려고 비 따위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이름 하나 가져본 적 있다는 걸 기억해 냈다.
친구는 책방 ‘햇살 속으로’ 사장님이 추천해 준 책이라며 내 앞에 앉아 조승리 작가의 책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읽고 있었다.
“좀 전까지 우리가 여행에 관해서 얘기했잖아. 책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 중이야.”
보이지 않지만, 여행지의 낯선 풍경을 감각하고 오롯이 자신만의 여행으로 만들어내는 조승리 작가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일부만 전해 들었을 뿐인데도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동에 빠졌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봐. 읽어보면 알 거야. 글이 정말 좋아.”
내가 펼친 페이지에서 작가와 친구들은 안개비를 맞으며 음반 가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 사려고 한 앨범은 없고 가게마다 에릭 사티의 피아노 연주곡만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실망할 것도 같은데, 작가는 가만히 듣기를 선택한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에릭 사티의 연주곡이 촉촉이 가슴을 적셔오던 그 순간으로 자신이 떠나온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몇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 나는 새로운 빗소리를 추천받았다.
친구는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도 이름을 잊기 일쑤인데 그 사람이 추천한 책은 못 잊는다고 했다. 친구에게 ‘햇살 속으로’ 사장님은 아마 이 책으로 기억되려는 모양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한 사람이 떠올랐다.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한 사람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름도 잊었고, 얼굴도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그가 추천한 책은 잊을 수가 없다. 도서관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가 내민 책은 이만교 소설가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였다. 친구는 소설 제목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요새 도파민 중독이 난리라는데 우리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
지난 주말에는 일어설 수 없는 그림자를 데리고 ‘플리마켓-쓰는 사람들’에 셀러로 참여했다. 한국작가회의 젊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시각장애 여성들과 연대하는 행사였다. 조승리 작가의 책을 읽고 난 후라 더 뜻깊었다. 시각장애 시인이 시를 낭독할 때 가슴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손뼉 쳤다. 그들의 손등에 내 손을 살며시 올려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환호와 박수 소리로 진심이 건네졌길 바랐다.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전부 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잘못 먹은 탓인지 새벽 내내 토했다. 그러고 일어나 글을 쓴다. “목동의 손만 홀로 남아/벌판 한가운데 놓인 탁자에서 타자를 쳤다”는 이선욱의 <탁탁탁>이란 시에서 타자 치는 소리는 솔가지 타는 소리로 비유되다가 손등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시가 끝난다. 그래서인지 나는 타자 치는 소리가 꼭 가을 빗소리 같다. 비 맞고 온 시월을 달래주는 타자 소리는 단풍나무 빛을 들춘다. 오늘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빗소리 하나로 시월의 안쪽을 두드려보고 싶다.

 3 weeks ago
11
3 weeks ago
11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新 광수생각]진짜 불로소득을 묻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https://www.chosun.com/resizer/v2/MVRDCYLFGU2DOYLCGEZTCZRXME.jpg?auth=e7208408e32f3c86fca96d1cc26ab946aa0573ff3afc88149eaf47be452d2014&smart=true&width=4501&height=3001)
![[팔면봉]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여권 인사도 놀란 듯.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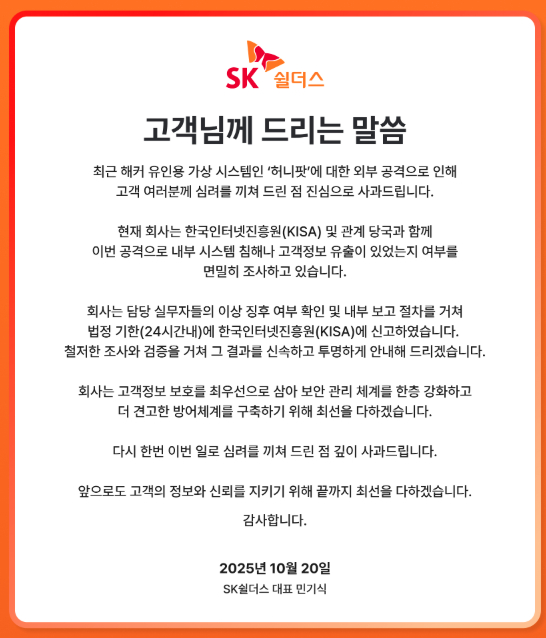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