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보호받지 못한 기술, 멈춰선 공정성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40429517.1.jpg)
새 정부는 ‘공정한 성장’을 국가 발전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술 역량’을 미래산업의 주축으로 삼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지속가능성은 혁신의 결실인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보상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을 때에나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 내 특허침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1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평균 65억원에 달한다. 양국 간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7분의 1에 그친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핵심 기술이 침해되더라도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기술 탈취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배상액이 산정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손해액 산정의 불명확한 기준과 피해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에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다. 디스커버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침해자의 회계자료, 매출 내역, 계약서 등 실질적인 손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특히 외부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의 부재는 곧 정당한 피해 보상의 부재로 직결되며, 이는 기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식재산 제도의 본질은 노력과 결실에 대한 법적 보호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입증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연구개발(R&D) 투자액은 물론 향후 수익 가능성까지 손해로 산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R&D 자체를 손해로 인정한 판례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여당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법, 하도급법 등 총 6개 법률을 통합하는 형태로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구상 중이다. 과거 유사한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산업계의 반발로 실질적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혁신에 과연 누가 미래를 걸 수 있는가?” ‘기술 주도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국가 전략의 두 축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는 실천적 해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5 hours ago
1
5 hours ago
1
![[만물상] ‘나홀로 어린이’ 비극](https://www.chosun.com/resizer/v2/M6FINZPXIZBZ5FGN2YOVU63EVM.png?auth=8ad495443d4f6a68b02277626f47b202f160ae8abfeddef12ec53e8b218af66a&smart=true&width=1958&height=1091)
![[비즈니스 인사이트] 실패와 좌절, 배신을 대하는 자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AA.41024311.1.jpg)
![[김동현의 다이내믹 인디아] 인도 내 韓流, 콘텐츠 넘어 소비재로](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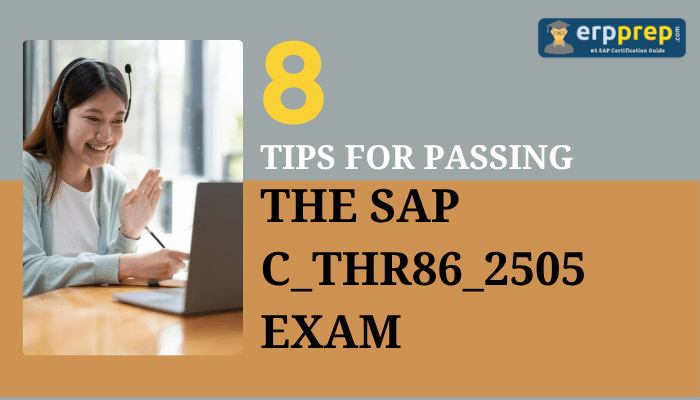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