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가리기 힘든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정책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감사원이 살펴보는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령 해석이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물고 늘어지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문서와 형식에 집착하게 된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감사 눈치가 보여 주저하게 된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서 나온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 때리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등은 보복성 정치 감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적폐’로 분류됐다. 공직사회에선 정부가 바뀐 뒤 문제가 될까 봐 미리 몸을 사리거나 책임 면피를 위해 대비를 하는 문화가 일상화됐다. 역대 정부마다 “열심히 일하다 접시 깨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낡은 규제의 혁파를 강조해도 공직사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감사원 감사는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감사가 순기능을 하려면 감사원이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 대신 헌법과 감사원법이 규정한 대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 새 정부부터 먼저 시행하면 어떨까.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공직사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공직사회가 무기력과 소극 행정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9 hours ago
2
9 hours ago
2


![[이런말저런글] 의원 꿔주기, 어법에는 맞지 않았다고요?](https://img6.yna.co.kr/etc/inner/KR/2025/07/10/AKR20250710101300546_01_i_P4.jpg)
![[올드&뉴] '어퓨굿맨' 박정훈의 진정한 해병정신](https://img9.yna.co.kr/etc/inner/KR/2025/07/10/AKR20250710078500546_01_i_P4.jpg)
![조지아의 한국인 ‘타마다''[공관에서 온 편지]](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팔면봉] 14일 장관 청문회부터 자료 제출·증인 채택 ‘뭉개기’ 극심.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https://www.chosun.com/resizer/v2/VCX6GHX7JMCPSYHQ4VYX32YX6U.jpg?auth=b70e6ca74812fd111da09b6985b3a6b6256cf1c8996e0717374ff35e9c2dc12a&smart=true&width=5540&height=3693)
![[사설] 폭염에도 쩔쩔매는 전력, 원전까지 배척하며 AI 한다니](https://www.chosun.com/resizer/v2/HY46FBV47RPBHAD4V4NRCJ7QWE.jpg?auth=9fd5cb44e5240fc9868c2c9906dbc14c83b8d72ef42c8c33c8f13c3676fc68f0&smart=true&width=2049&height=1221)
![[朝鮮칼럼] 한정된 나랏돈, 더 잘 써야 한다](https://www.chosun.com/resizer/v2/G22HA6OM6FC5TIIC7FXTBYUAVA.png?auth=04cfccfaccd25aa047d4d880b694c658e7e073fd260b7e78db2c2aa72af68a80&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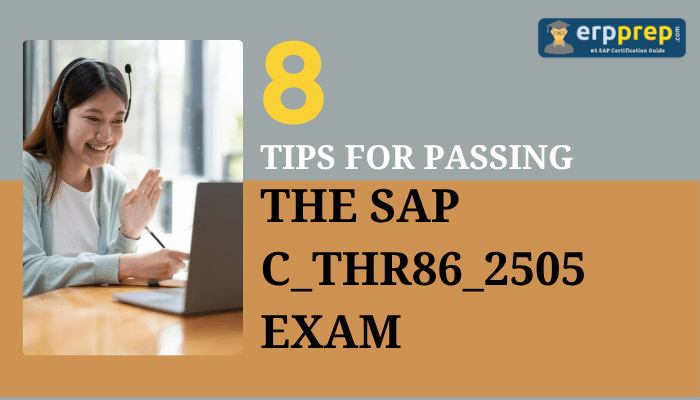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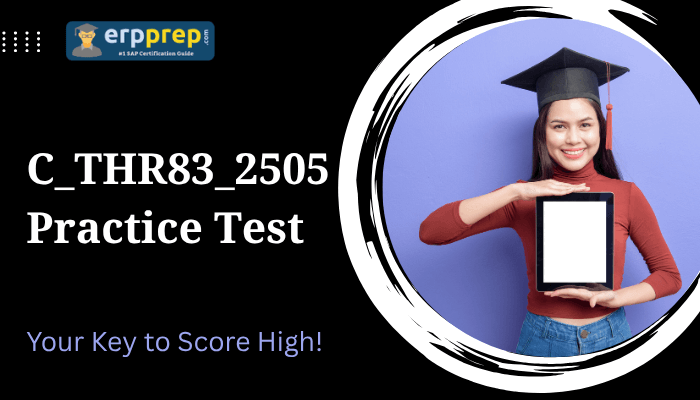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