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대학 교수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41명은 미국으로 향했고 나머지 15명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중국 등으로 떠났다. 과거 이공계 교수 중심으로 이동했으나 이젠 거의 모든 전공으로 확대됐다. 이직한 교수의 전공은 인문사회 28명, 자연과학 12명, 공학 12명, 예체능 3명, 의학 1명 등이다.
2000년대 초부터 국내 ‘토종 박사’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향상됐다. 대학들은 학술지 게재 실적으로 세계 교수를 평가하면서 스포츠 구단처럼 높은 급여와 연구비, 주택 보조금 등을 제시하며 ‘스타 교수’를 영입했다. 반면 국내 대학은 오랜 기간 박사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라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성과급 등을 역제안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여유는 사라졌다.
미래 교수를 꿈꾸는 대학원생은 계속 나오고 있을까. 올해 상반기 서울대 대학원생 1453명 중 386명(26.6%)만이 서울대에서 학부를 마쳤다. 이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도 결과는 비슷했다.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최상위권 대학 출신 졸업생이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것은 교수를 희망하는 학생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교수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아니다. 대기업, 창업, 로스쿨 등 다른 길이 기회도 많고 보상도 더 크다.교수들이 해외로 떠나고 교원 희망자마저 줄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해외 대학들은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변화에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일본 도쿄대뿐만 아니라 우한대 등 중국 지방대마저 급여, 연구비 등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 순위인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2025-2026’에선 칭화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18개 아시아 대학이 100위 안에 들었다. 한때 100위 안에 들던 서울대는 이제 133위로 밀려났다.
현실적으로 당장 교원 처우를 크게 높일 수 없다면 정부 지원 확대, 등록금 현실화만큼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대학도 자체 기금 확대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기금 532억 달러(약 73조 원)를 굴리며 예산 37%를 충당하고 있다. 대학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8 hours ago
2
8 hours ago
2


![[이런말저런글] 의원 꿔주기, 어법에는 맞지 않았다고요?](https://img6.yna.co.kr/etc/inner/KR/2025/07/10/AKR20250710101300546_01_i_P4.jpg)
![[올드&뉴] '어퓨굿맨' 박정훈의 진정한 해병정신](https://img9.yna.co.kr/etc/inner/KR/2025/07/10/AKR20250710078500546_01_i_P4.jpg)
![조지아의 한국인 ‘타마다''[공관에서 온 편지]](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팔면봉] 14일 장관 청문회부터 자료 제출·증인 채택 ‘뭉개기’ 극심.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https://www.chosun.com/resizer/v2/VCX6GHX7JMCPSYHQ4VYX32YX6U.jpg?auth=b70e6ca74812fd111da09b6985b3a6b6256cf1c8996e0717374ff35e9c2dc12a&smart=true&width=5540&height=3693)
![[사설] 폭염에도 쩔쩔매는 전력, 원전까지 배척하며 AI 한다니](https://www.chosun.com/resizer/v2/HY46FBV47RPBHAD4V4NRCJ7QWE.jpg?auth=9fd5cb44e5240fc9868c2c9906dbc14c83b8d72ef42c8c33c8f13c3676fc68f0&smart=true&width=2049&height=1221)
![[朝鮮칼럼] 한정된 나랏돈, 더 잘 써야 한다](https://www.chosun.com/resizer/v2/G22HA6OM6FC5TIIC7FXTBYUAVA.png?auth=04cfccfaccd25aa047d4d880b694c658e7e073fd260b7e78db2c2aa72af68a80&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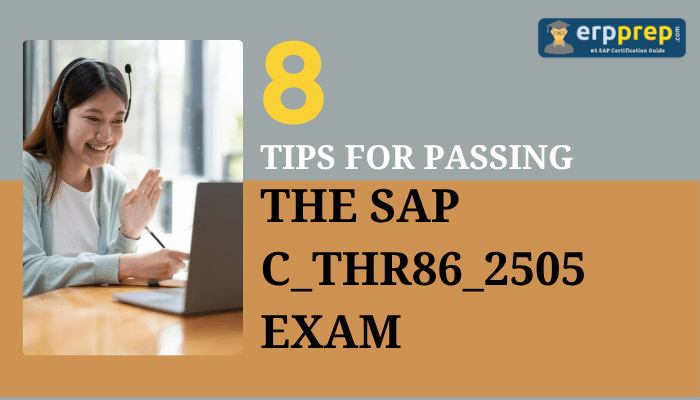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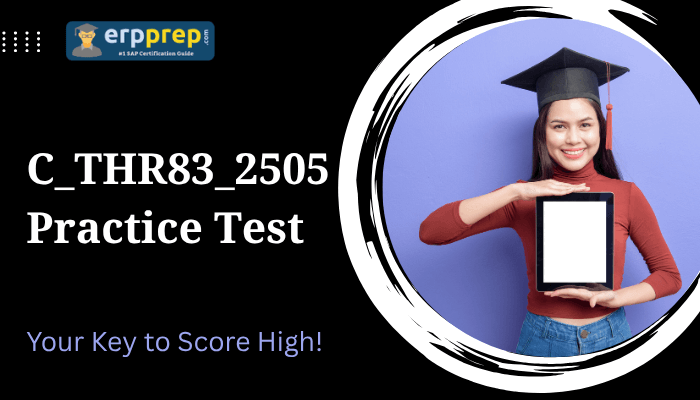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