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납득되지 않을 때 무심코 튀어나온다. 그런데 이 말,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진단처럼 느껴진다. 말과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제 선명하지 않다. 과거처럼 계층, 세대, 지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갈등은 너무 작고,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그 형태는 마치 미세플라스틱 같다. 바다에 퍼져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몸에 축적되지만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제 갈등은 어떤 한 방향의 '대립'이 아니라, 수많은 방향의 '단절'이다. 그 단절의 원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기술은 우리를 연결시키는가? 고립시키는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단절의 속도를 가속시켰다. 알고리즘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주지만, 그것은 곧 나만의 진실을 만들어낸다. 내가 보는 뉴스, 내가 듣는 목소리,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제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같은 현상 앞에서도 전혀 다른 윤리를 내세운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장생(長生). 세대의 시간은 더 이상 같지 않다'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 그런데 그만큼 세대 간의 시간차도 커졌다. 10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났고, 70대는 유선 전화를 경험했다. 20대는 당장의 불안과 싸우고, 60대는 미래의 안정을 말한다.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 다르다. 때로는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종교의 이념적 해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가?'
과거의 종교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떠받치던 기반이었다. 물론 그 권위는 종종 문제였지만, 최소한 어떤 '공통의 기준'은 존재했다. 지금은 다르다. 종교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고, 그 자리를 대체할 윤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각자가 믿는 '정의'는 점점 다르고, 더 강하게 주장된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합의는 목적이 아니라 구조다'
이처럼 갈등이 미세하게 파편화된 사회에서, 단순한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합의의 방식, 결단의 절차, 책임의 분배를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포용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결단적 합의'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때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반대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겠다는 방식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이제는 묻고 설계해야 한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가. 합의의 방식이 곧 사회의 품격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의 파편화된 갈등 앞에 서 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하고 싶고, 너무 많아서 피하고 싶은 그 갈등들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부수고 있다. 그 부서진 조각이, 어떤 아이에겐 생존의 질문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절망의 구조가 된다.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누구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

 1 week ago
3
1 week ago
3
![[세상만사] 폭염 불평등](https://img6.yna.co.kr/etc/inner/KR/2025/07/08/AKR20250708129700546_01_i_P4.jpg)
![[이런말저런글] 옷깃 + 소매 = 영수(O) = 우두머리(?)](https://img1.yna.co.kr/etc/inner/KR/2025/07/08/AKR20250708068400546_01_i_P4.jpg)
![[데스크칼럼]콜마그룹, 롯데 ‘형제의 난’ 반면교사 삼아야](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사설]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https://www.chosun.com/resizer/v2/MKVUDTJXWMTKR3S4JAQUU5CZBU.jpg?auth=4101d5f90a1a3990359806743875cc1a3c3402fe3b1a16ad606c59be068740cb&smart=true&width=1000&height=643)
![[팔면봉] 장관 후보자마다 언론 의혹 제기에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https://www.chosun.com/resizer/v2/XMQOY5X4YYP724OIIIQQE3575A.jpg?auth=6f79f9e5fb002e3b220cf950dc74356eee709f491c79200239187b8fa00f9991&smart=true&width=720&height=918)
![[사설] 알려진 것과 다른 복지장관 후보자 모습](https://www.chosun.com/resizer/v2/LXGPGLPN2PPKUBWOGI4MRDA3CA.jpg?auth=5b616a75e46693c1ec507d3754979a8934952c64480a29db00e4a0cc4ff34648&smart=true&width=2700&height=1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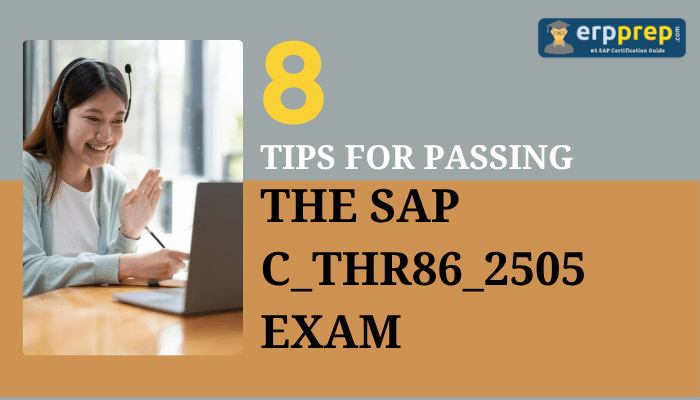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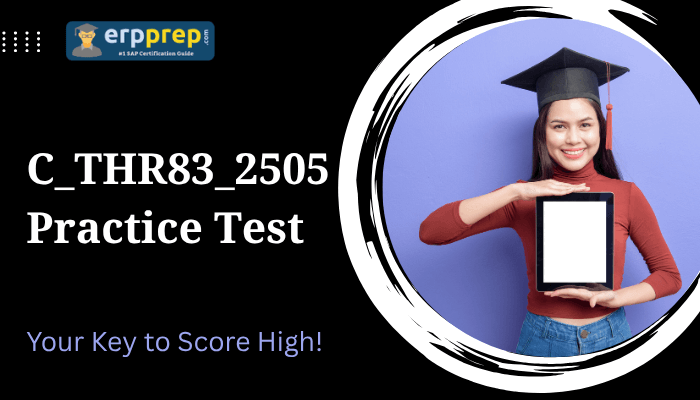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