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문제가 유언에서 말한 바 있다. ‘천하에 태어난 것들 중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죽는 것은 천지의 이치요, 만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애석해할 것이 아니다.’ 과거 현명한 제왕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다. 내가 병을 앓은 지 20일이 지났지만 근심할 일은 아니다. 나는 죽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있다. 문제의 말이 바로 나의 뜻이니라. 앞으로의 일은 태자가 맡아서 한 뒤에 보고하라.”
5월 29일, 병이 심해지자 왕건은 유언을 작성하게 했다. 글을 마쳤으나 왕건은 말이 없었다. 왕건이 죽은 줄 안 대신들이 통곡을 하자 왕건이 눈을 떴다. “이 무슨 소리인가?” 대신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성상께서 군신들을 버리고 떠나시려 하니 신들은 애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왕건이 웃으며 말했다. “뜬구름 같은 삶, 옛날부터 그러했느니라.”
이것이 왕건의 마지막 말이었다. 67세. 24세에 첫 출전을 한 이래 전장에서만 30여 년을 보냈다. 후백제를 점령한 뒤 평화의 시간은 7년 남짓이었을 뿐.신라 말 내정의 혼란으로 사방에서 군웅들이 활개 치는 난세가 찾아왔다. 중앙정부가 통치의 힘을 잃고 각자도생의 세상이 되자 힘 있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이는 궁예와 견훤이었다. 둘 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다. 나아가 궁예는 고구려를, 견훤은 백제를 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궁예는 자신을 신라 왕실의 버려진 자식이라 여겼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미신과 주술에 빠져들고 말았다. 궁예는 죄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신하들을 의심하며 폭정을 일삼다가 왕건에 의해 쫓겨났다.
견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장이었다. 정치력도 뛰어나 호족들을 포섭해 나가는 데도 앞서며 새 시대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권력을 놓고 집안 분쟁이 벌어졌고 견훤은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아버지도, 아들도 배신을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왕건은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는 상대를 멸살시키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고자 했다. 각지의 강자들과 혼인 동맹을 맺어 안심하고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들었다. 신라는 후백제에 완강히 저항했으나 고려와는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 만일 신라와도 싸워야 했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다.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뒤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밀려들었는데, 왕건은 이들도 한 가족이라며 모두 수용했다. 발해 유민들은 후일 거란과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다. 이처럼 왕건의 포용력은 수많은 목숨을 건지는 원동력이었다.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포용력을 지닌 후보는 누구일까? 하나 더. 이번에는 미신과 무속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신뢰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다.
이문영 역사작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2
1 day ago
2

![[이런말저런글] 선관위의 벽보 첩부 주의문 '주의'](https://img0.yna.co.kr/photo/cms/2024/04/02/02/PCM20240402000002990_P4.jpg)
![[기자수첩]선거는 전쟁이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5/2025052908510029865_1.jpg)
![[광화문]금융감독체계 개편, 굳이 지금 해야 한다면](http://thumb.mt.co.kr/21/2025/05/2025052916252479803_1.jpg)
![[기고] 경제 시스템을 리빌딩할 실용과 중용의 리더십을 기대하며](http://thumb.mt.co.kr/21/2025/05/2025052908133162296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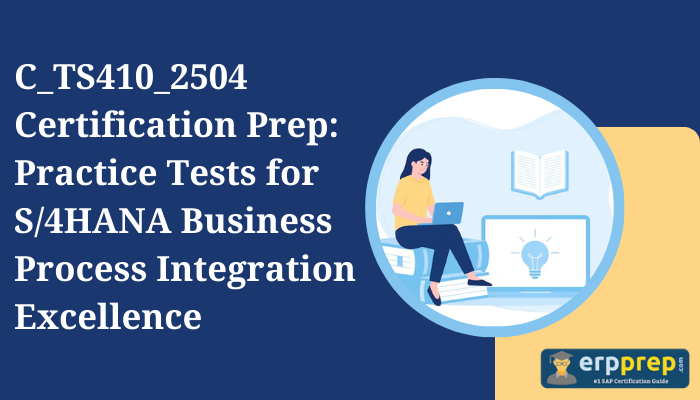


![[정용관 칼럼]‘반장 빼앗긴 애순이’와 ‘후보 교체 쿠데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1/131582360.1.png)
![[세상만사] 길잃은 치매노인 구하는 한 통의 문자](https://img3.yna.co.kr/etc/inner/KR/2025/05/09/AKR20250509107800546_01_i_P4.jpg)
![[사설] 보수의 품격 처참히 무너뜨린 국민의힘](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