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약 배송 금지'에 막힌 의약품 유통 혁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0325968.1.jpg)
“미국에선 제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직접 판매·배송하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모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국내 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대표의 말이다. 미국에서 디지털 기술은 환자 건강을 돕는 것은 물론 의약품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 해법이 되고 있다. 보험사 등 중간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약을 거래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선 이런 혁신이 막혀 있다. 의약품 분야에 DTC 모델을 구축하려면 약을 환자에게 배송해야 한다. 국내 약사법상 이는 불법이다.
미국에서 의약품 DTC 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일라이릴리다. 2023년 11월 비만약 ‘젭바운드’ 시판 허가를 받은 일라이릴리는 지난해 1월 환자가 직접 약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DTC 플랫폼 ‘릴리 다이렉트’를 열었다. 이곳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도 140만원 정도인 젭바운드 한 달분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올해 3월엔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온라인 약국 플랫폼 ‘노보케어’를 가동했다. 200만원에 육박하던 비만약 ‘위고비’ 한 달분 약값은 7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비만약뿐 아니다. 미국 화이자는 지난해 ‘화이자포올’을 열고 백신, 진단검사, 의약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는 항응고제 ‘엘리퀴스’를 직접 판매하는 ‘엘리퀴스360서포트’를 구축해 오는 9월 운영을 시작한다. 환자는 이곳에서 엘리퀴스를 싸게 살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DTC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것은 환자와 제약사 모두에 ‘윈윈’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토마스 쉬네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신약을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델은 제약사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약값을 낮추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선 DTC 혁명을 찾아볼 수 없다. 올초 한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 출시를 앞두고 한국에 DTC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포기했다. 당시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회사의 마케팅 총괄은 ‘왜 한국에선 환자에게 직접 약을 배송할 수 없는지’ 의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지만 약사들의 반대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대형 온라인 약국에 환자가 몰릴 것이란 약사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유통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는 동안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7 hours ago
2
7 hours ago
2
![[사설]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을](https://www.chosun.com/resizer/v2/ERVUWETRHXEKHRPJIF55LRUT7Q.jpg?auth=cfd7f975af1c18f02a27c19e216ee603bafe14e7e348caf9c67063b0e7ee5de5&smart=true&width=5472&height=3648)
![[김대중 칼럼] 이 정부의 ‘셰셰 전략’과 트럼프의 주한 미군 카드](https://www.chosun.com/resizer/v2/MTDKY6RBAZATDIRJEBLQCLSYA4.png?auth=2cc39f03c48e568211272eb3d09a0ed91cbe3c14ce8ff5e9caf6a5139fed2363&smart=true&width=1200&height=855)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2] 한겨울의 눈덩이 좌판](https://www.chosun.com/resizer/v2/COBL4EZEKVCA7E4FRINU2DJ64U.jpg?auth=addfd45833c901d86e5fedfacf7fa2e8a80eed8a7126eb0abb1449434e3173ba&smart=true&width=784&height=1136)
![[광화문.뷰] 맘다니와 강선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https://www.chosun.com/resizer/v2/TY2R6KRDXZGSFNQSMUXV3VMCXE.png?auth=5259882a7fbfd53329295a5a696dc7f11b4f016d5f2e14a6a50384fe1713d36e&smart=true&width=500&height=500)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86] AI와 기술 민족주의](https://www.chosun.com/resizer/v2/IVRVLBDOZBC5BJOKKI7DI6OYJE.png?auth=d4411789f07f57e5c4d2ea52deb45c95bcf8119c819f928623eac668451e2e0e&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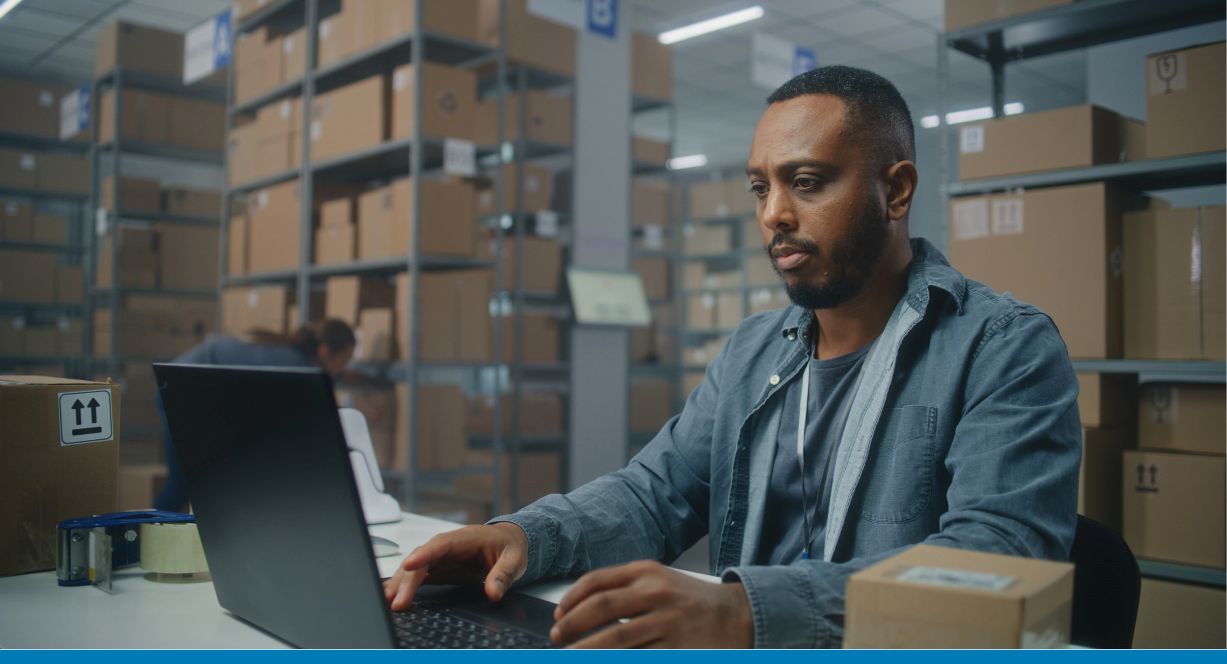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