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의 에이원CC 서코스 5번홀(파4)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최고 권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의 마지막 18번홀(파4)로 사용되는 이 홀에서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 남자골프의 미래로 평가받는 최승빈의 생애 첫 우승도 운명처럼 찾아왔다. 2023년 이 대회에서다. 단독 2위를 달리던 그는 세컨드샷을 태극기가 펄럭이는 핀 1.4m 거리에 붙인 뒤 버디로 마무리해 공동 선두에 올랐다. 그런데 전 홀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던 박준홍이 티샷 실수로 세 번째 샷 만에 그린에 공을 올렸고 4m 파퍼트를 놓치면서 순위가 뒤집혔다.
당시 2년 차 최승빈은 깜짝 우승과 함께 무명의 꼬리표를 떼어냈다. 갑작스러운 우승에 얼떨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그는 2년 전을 회상하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샷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며 “버디를 하고 챔피언조의 결과를 기다리는 장면이 코스에 갈 때마다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웃었다.
最古 대회 10년째 개최한 最高 코스

1996년 개장한 에이원CC는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난도 세팅과 빈틈없는 잔디 관리로 금세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 잡았다. 3개 코스로 이루어진 회원제 27홀 코스로 KPGA투어 레전드 중 한 명이자 설계가인 김학영 씨가 코스 설계를 맡았다. 크고 작은 구릉과 굴고 많고 빠른 그린, 초대형 연못과 비치 벙커 등이 잘 어우러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에이원CC는 KPGA투어 선수들이 인정한 명품 코스다. 지난 2022년엔 선수들이 뽑은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에이원CC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의 붙박이 코스로 자리 잡은 이유다. 지난 2016년 KPGA 선수권대회를 처음 개최한 에이원CC는 2018년 KPGA와 임대차 연장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것도 코스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대회 장소를 내주는 통 큰 결정을 하면서 에이원CC가 한국 남자골프의 든든한 후원자로 떠올랐다.
올해 대회 개막(6월 19일)을 2주가량 앞둔 지난달 6일. 대회 준비가 한창인 에이원CC를 찾았다. 주중 이른 아침임에도 클럽하우스가 회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경기 진행을 도운 심정화 캐디는 “대회 코스 세팅을 미리 경험하려는 회원들로 주중에도 예약이 꽉 찼다”며 “그린 스피드는 2.8m로 대회 땐 3m 초반대로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어웨이 둘러싼 호수 위협적


서코스 5번홀 티잉 구역에 오르니 이 홀이 왜 운명의 수레바퀴로 불리는지 고개가 끄덕여졌다. 화이트 티 기준 378m(블랙 티 401m)로 전장이 긴 파4홀인데 페어웨이 전체를 호수가 둘러싼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다. 특히 오른쪽으로 길게 비치 벙커가 조성돼 있어 페어웨이의 폭이 더 좁게 느껴진다.
2년 전 우승자인 최승빈은 이 홀의 공략법에 대해 “코스가 좁기 때문에 거리를 내는 것보다 탄도를 낮춰서 페어웨이나 러프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조언을 기억하며 신중히 티샷을 했지만 백돌이 특유의 슬라이스 샷이 나오면서 공은 오른쪽 비치 벙커로 향했다. 이를 지켜본 심 캐디는 “벙커에 빠지면 프로도 파를 지키기 어려운 홀”이라고 했다. 2년 전 박준홍도 티샷이 비치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보기를 적은 뒤 최승빈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벙커에서 남은 거리는 180m. 5번 아이언으로 힘껏 때려 탈출에는 성공했으나 거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린 앞 러프에서 세 번째 샷 만에 그린에 공을 올렸지만 핀까지 남은 거리는 20m에 달했고 결국 3퍼트로 더블보기를 적었다. 그린은 굴곡이 심한 2단으로 어프로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2퍼트 마무리도 쉽지 않다.

사실 에이원CC 하이라이트는 이어지는 서코스 6번홀(파3)이다. 대회 땐 17번홀로 쓰이는 홀인데 화이트 티 기준 전장이 무려 182m(블랙 티 195m)나 된다. 게다가 티잉 구역 바로 앞으로 흐르는 호수와 그린 앞 큰 벙커가 상당한 위압감을 준다.
거리만 놓고 보면 드라이버를 꺼내도 되지만 장고 끝에 3번 우드를 쥐었다. 하지만 티샷은 역시나 그린 앞 벙커로 향했다. 벙커에선 핀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덕이 높아 탈출 자체가 힘들다. 세 번의 시도 끝에 4온 2퍼트, 트리플보기(양파). 서코스 6번홀은 올해 대회에서도 나흘간 가장 적은 버디(27개)가 나온 홀로 기록됐다.
양산=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프로야구 창원전적] NC 10-9 두산](https://r.yna.co.kr/global/home/v01/img/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v=20230824_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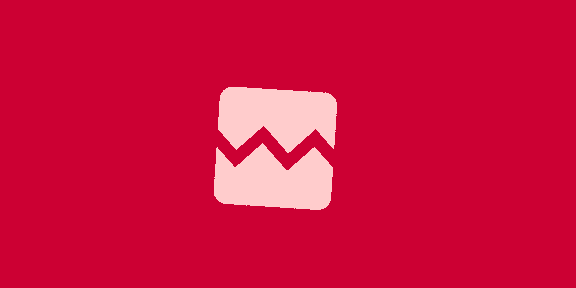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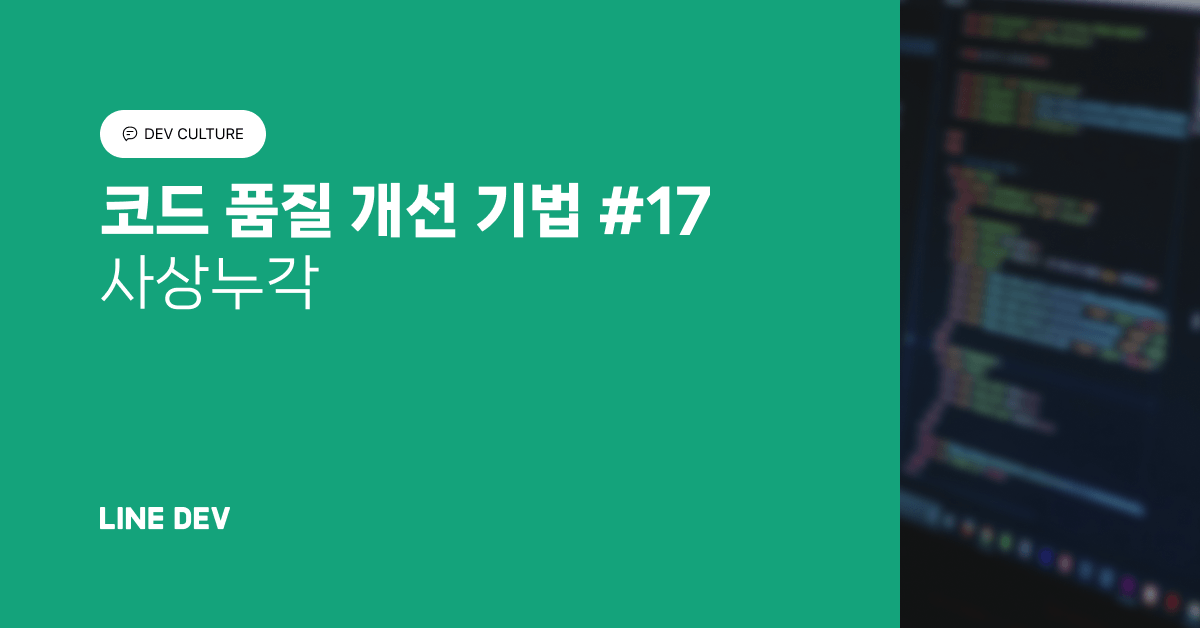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