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착각은 나의 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9648277.1.jpg)
동네 친구인 김은지 시인은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름하여 ‘손바닥 전시회’. 매수전 작가의 소복이 유화 수업에서 완성한 작은 그림 두 점을 책방 한쪽 벽에 걸어둔 것이 전부지만 그림 아래 작품 제목도 붙어 있고 방명록도 있다. 손바닥 전시 포스터에는 화가 김은지의 첫 번째 개인전 ‘지금부터 흐지부지될 때까지’라고 쓰여 있다. 장난처럼 시작된 전시회는 화가가 매일 같이 책방으로 출근하면서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됐다.
“제가 지금 전시 중인데 관람하시겠어요?”
“네? 어디서요?”
“여기서요.”
사람들이 그제야 책방 한쪽 벽에 걸린 그림 두 점을 발견하고는 십중팔구 웃음 짓는다. 부탁받은 손님들이 써두고 간 방명록을 읽는 친구의 뿌듯한 얼굴을 보는데 오늘 하루 내 몫의 행복이 친구 덕분에 생겨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전시회로 북적이는 책방을 나와 이웃 책방인 ‘책인감’으로 향했다. 신간 시집들이 벌써 입고돼 있다. 시집 두 권을 사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국화차를 내왔다. 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쟁반을 상상했는데, 자그마한 나무 쟁반이며 거름망을 끼운 유리 티폿과 찻잔부터 잔 받침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찻잔처럼 데워지는 듯했다.
“사장님,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특별히 이렇게 예쁜 다기에 차를 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그러자 친구가 진실을 말해줬다.
“국화차 시키면 원래 이렇게 나와.”
“그래도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야.”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도 착각한 나도 한바탕 폭소를 터트렸다.
내가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사는 힘이 생긴다. 내가 나를 대접하면 남이 날 홀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줄어든다. 조그만 선의에도 대접받고 있다는 착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고마워진다. 그러고 보면 대접받고 있다는 착각으로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사는 게 아닐까? 물론 어떤 착각은 사람을 병들게도 하겠지만, 친분이 있는 대상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착각은 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더불어 마음도 튼실해진다. 사월인데 일교차가 크다. 아침과 저녁의 표정을 생각한다. 얼마 만에 이런 날씨를 느껴보았는지. 한 5년 전의 봄 날씨 같다. 매화가 가니, 개나리가 가고, 진달래가 가니 벚꽃이 갔다. 그리고 라일락이 왔고 얼마 전엔 등나무에 보랏빛 꽃등이 켜졌다. 곧 벌떼들이 날아오리라.
권기만 시인의 ‘발’이란 시가 떠올랐다. 뱀은 몸이 날개고, 식물은 씨앗이 발이고, 벌에게는 날개가 발이라는 시. ‘같은 길을 다르게 걸을 뿐’이라는 말이 꽃향기에도 해당할까? 붉은 담장을 넘어오는 라일락 향기나 모기가 싫어하는 제라늄 향기도 저마다 이 삶을 여행하는 걸음걸이겠다.
자신이 처음 그린 유화 그림 두 점을 그 누구보다 대접해 주는 친구도, 누군가의 응대를 특별한 대접으로 착각하는 나도 행복 쪽으로 난 길을 걷는 중이다.
SNS에서 본 음식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낸다.
“이거 만들 줄 알아?”
해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대접받고 싶은 것이다. 남편이 내게만 특별히 다정했다는 착각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다.
“당연하지. 오늘 저녁에 해줄게.”
“정말? 고마워. 나도 오빠를 위해서 화원에서 몬스테라를 샀어.”
“나를 위해서? 난 몬스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한 일도 남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건 착각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1 month ago
12
1 month ago
12
![[세상만사] '사초(史草) 쓰는 자세'와 특검 수사](https://img3.yna.co.kr/etc/inner/KR/2025/06/16/AKR20250616076300546_03_i_P4.jpg)
![[기고]보험 수수료 개편과 신뢰구조](https://thumb.mt.co.kr/21/2025/06/2025061314303537736_1.jpg)
![[MT시평]양들의 침묵](http://thumb.mt.co.kr/21/2025/06/2025061513225854717_1.jpg)
!["행복하지 않다"는 젠지의 고민[생생확대경]](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기자수첩] 갤러그하는 대통령](http://thumb.mt.co.kr/21/2025/06/2025061309372057401_1.jpg)

![[천자칼럼] 소리 없이 강한 韓 기업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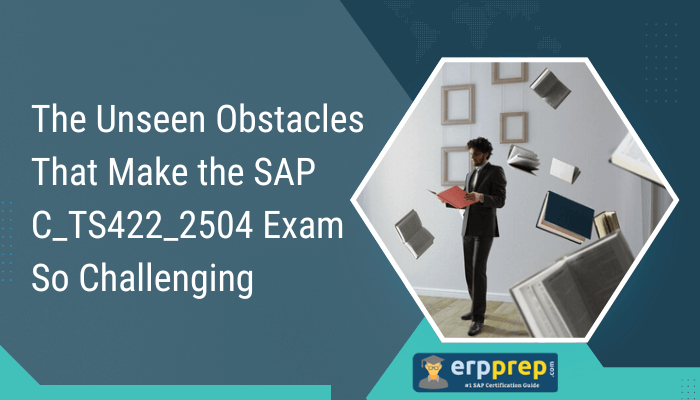

![[포토] 트리플에스 설린, '눈 뗄 수 없는 예쁨'](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3.40571444.1.jpg)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데이터 시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1c6020f803074b48885e5e159213de62_Z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