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뒷북치는 산업정책 그만 보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3097481.1.jpg)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릴수록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시간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동맹국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하면 상응하는 대가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완전 착각이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의 자생적 기술 개발 의지만 더 키운 꼴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미국의 오판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한·미 기술협력이 확대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동맹 관계와 기술 공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더구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다. 미국의 기준은 오로지 자국에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포함해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은 중국에서 모조리 폐쇄하겠다고 작정한 모양새다. 그것도 모자라 관세를 무기로 한국이 알아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선물 꾸러미를 크게 만들어 오라는 식이다. 한국이 미국에 산업을 다 갖다 바쳐 투자하면 이 땅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지, 정부는 그동안 무슨 전략적 사고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선행적 산업정책’은 사라졌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천명하면서 중국이 더 강한 산업정책으로 무장하기 시작할 때부터다. 지금의 중국은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뛰어넘는 ‘스텔스 이노베이션(stealth innovation)’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쏟아진 ‘대일 극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은 이제 ‘대중 극복’으로 간판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차이나 스피드’가 치고 들어와 ‘코리아 스피드’를 밀어냈다. 중국에서는 “오늘의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에서 밀리고, 스피드에서 밀리고, 가격에서 밀리면 게임 끝이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릴수록 한국에 반사이익이 클 것이라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힘의 경제학(power economics).’ 경제안보 시대다. 지정학적으로는 약육강식이요, 지경학적으로는 기술 전쟁이다. 경제는 ‘최선(best)’을 추구하지만, 안보는 ‘최악(worst)’을 대비한다. 상극이나 다름없는 경제와 안보의 최적 조합은 단지 경제 이익을 최대화(max)하거나 안보 위협을 최소화(min)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 이익을 최대화하거나(maxmin), 경제 이익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minmax) 솔루션을 찾는 고도의 함수다.
‘소버린 AI(인공지능)’를 두고 갑론을박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경제안보 시대에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한국이 제조업을 AI로 지켜내고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까지 높이려면 ‘산업 AI’가 최후의 승부처다. 시간이 없다. 글로벌 챔피언을 꿈꾸는 중국의 산업 AI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AI 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다. 누군가 이어받아 AI 투자에 나선다면 재정지원뿐 아니라 파격적 세제 지원, 아니 상속세 폐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혁명적 수준의 원샷 규제 개혁이 또 하나의 카드다. 산업 AI와 노동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철강의 탄소 배출이 많다고 포스코를 해외로 내몰 요량이 아니라면, 재생(RE)이든 탄소프리(CF)든 경쟁력 있는 미래 에너지 인프라는 필수다. 그것은 국가의 몫이다.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산업정책에서 철강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철강이 사라지면 AI로도 제조업을 지킬 수 없다. 경제도, 안보도 무너진 다음의 탄소중립이 무슨 소용인가?
AI에서 철강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 산업 경쟁을 벌이는 사이 한국 기업은 각자도생이었다. 정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국이 미·중 충돌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려면 ‘선행적 산업정책’ 말곤 답이 없다. 정부는 한국 산업이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기업과 머리를 맞대라. 뒷북치는 정부는 그만 보고 싶다.

 8 hours ago
3
8 hours ago
3
![[팔면봉] 국힘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선언.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https://www.chosun.com/resizer/v2/FZEDBFFWGRF47K4WMFLXAX4VBE.jpg?auth=dcda78644ff0ee11b021d6d6711eff28af4ebbfc9fe5ad9c2125af3417f14bdc&smart=true&width=3853&height=2513)
![[사설]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https://www.chosun.com/resizer/v2/DAX2JPRIXJL2SGGDJ6JZZHVYKU.jpg?auth=cfdbf869408a141aad4666c423dd06c1773093afb4a9bf53d8534acdbce95fa4&smart=true&width=600&height=441)
![[김대중 칼럼] 국힘, 없애야 할 것 세 가지](https://www.chosun.com/resizer/v2/MTDKY6RBAZATDIRJEBLQCLSYA4.png?auth=2cc39f03c48e568211272eb3d09a0ed91cbe3c14ce8ff5e9caf6a5139fed2363&smart=true&width=1200&height=855)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9] 불타는 창문](https://www.chosun.com/resizer/v2/QJIVRUY73NCKPBOWCAJ7WZZI3Q.jpg?auth=5fa7c58705f2577ff5c84a0aae23ea8bc6b287c20e8608582e8a25ccb2fe9ae7&smart=true&width=1882&height=1258)
![[태평로] 트럼프가 하룻밤에 3000억원을 태운 사연](https://www.chosun.com/resizer/v2/VCYHCGE3LVFGZAHNW7WMKYKR4M.png?auth=0bb8250e83740a3119d8e8360a04f5075781d12a49f105e068a3894c4bf41c5f&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지혁의 슬기로운 문학생활] [10] 진정한 휴가란](https://www.chosun.com/resizer/v2/XBKG35UKONELJK7LRC63LLGULY.png?auth=a2de907d2664a2f6b756e540a356540800d87aeefac0d6e6f8d34142e04f6722&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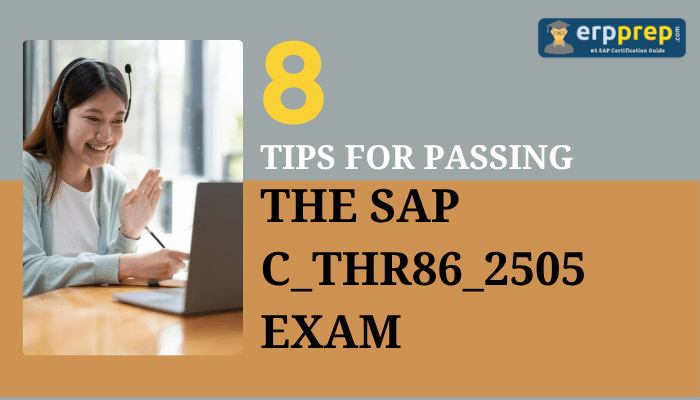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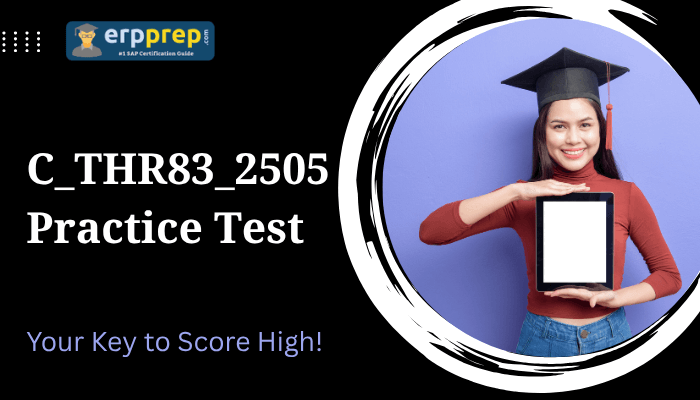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