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美 시장 티켓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14477123.1.jpg)
미국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는 “리카도는 죽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경제학 이론은 틀렸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의 피터”라며 총애하는 책사다.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장이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공짜 무역은 없다”며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책을 썼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들을 수탈해왔다”며 이 책을 “걸작”이라고 극찬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의 아성이 아니다. 거대한 자국 시장을 거의 무관세로 활짝 열었던 미국은 이제 없다. 자유무역을 해봤더니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에 팽배해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동맹국도 중국 못지않게 미국을 갈취했다는 생각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미국인 상당수도 이런 시각에 동조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먹혀든 배경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고율 관세를 물라고 위협한다. 아예 “관세를 내리려면 돈을 더 내라”고까지 한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미국 시장 입장권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트럼프의 압박에 직면한 각국의 처지는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나라가 버티기에 나서면 트럼프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한국의 기존 협상 전략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갔다.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 EU가 차례로 손을 들었다. 한국이 참고서로 삼은 일본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깎는 대신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 쌀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EU도 트럼프에게 막대한 선물을 안기면서 일본 수준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라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한국은 코너에 몰렸다. 이대로면 8월 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24%의 상호관세와 25%의 자동차 관세를 두들겨 맞는다. 이래선 일본, 유럽과 경쟁이 안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다.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주요국과 협상을 끝낸 미국의 압박은 더 세질 것이다. 우리가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든 싫든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를 늘려야 할 판이다. 당장 트럼프는 “우리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나라 중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경제적 득실만 따지면 계산은 간단하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2억4300만달러였다. 미국 요구대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가 풀려도 추가 수입액은 1년에 최대 1억7500만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1278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660억달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다른 농산물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품 안전은 검역 강화 등을 통해 풀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일 것이다. 내 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는 다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처럼 지지층 여론과 국익이 충돌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국익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하면 좋겠다. 이제 집권당이 된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 같은 소모적 논란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대미 투자의 경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돈을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미국이 원하는 조선, 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카드는 괜찮아 보인다.
안보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다. 안보는 통상 협상에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백악관이 우리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한 걸 간과하기는 힘들다.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다. 한국이 그에 걸맞은 신뢰를 미국에 줄 수 있다면 통상 협상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다. 안보와 경제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시대 아닌가.

 7 hours ago
1
7 hours ago
1
![[사설]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을](https://www.chosun.com/resizer/v2/ERVUWETRHXEKHRPJIF55LRUT7Q.jpg?auth=cfd7f975af1c18f02a27c19e216ee603bafe14e7e348caf9c67063b0e7ee5de5&smart=true&width=5472&height=3648)
![[김대중 칼럼] 이 정부의 ‘셰셰 전략’과 트럼프의 주한 미군 카드](https://www.chosun.com/resizer/v2/MTDKY6RBAZATDIRJEBLQCLSYA4.png?auth=2cc39f03c48e568211272eb3d09a0ed91cbe3c14ce8ff5e9caf6a5139fed2363&smart=true&width=1200&height=855)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2] 한겨울의 눈덩이 좌판](https://www.chosun.com/resizer/v2/COBL4EZEKVCA7E4FRINU2DJ64U.jpg?auth=addfd45833c901d86e5fedfacf7fa2e8a80eed8a7126eb0abb1449434e3173ba&smart=true&width=784&height=1136)
![[광화문.뷰] 맘다니와 강선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https://www.chosun.com/resizer/v2/TY2R6KRDXZGSFNQSMUXV3VMCXE.png?auth=5259882a7fbfd53329295a5a696dc7f11b4f016d5f2e14a6a50384fe1713d36e&smart=true&width=500&height=500)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86] AI와 기술 민족주의](https://www.chosun.com/resizer/v2/IVRVLBDOZBC5BJOKKI7DI6OYJE.png?auth=d4411789f07f57e5c4d2ea52deb45c95bcf8119c819f928623eac668451e2e0e&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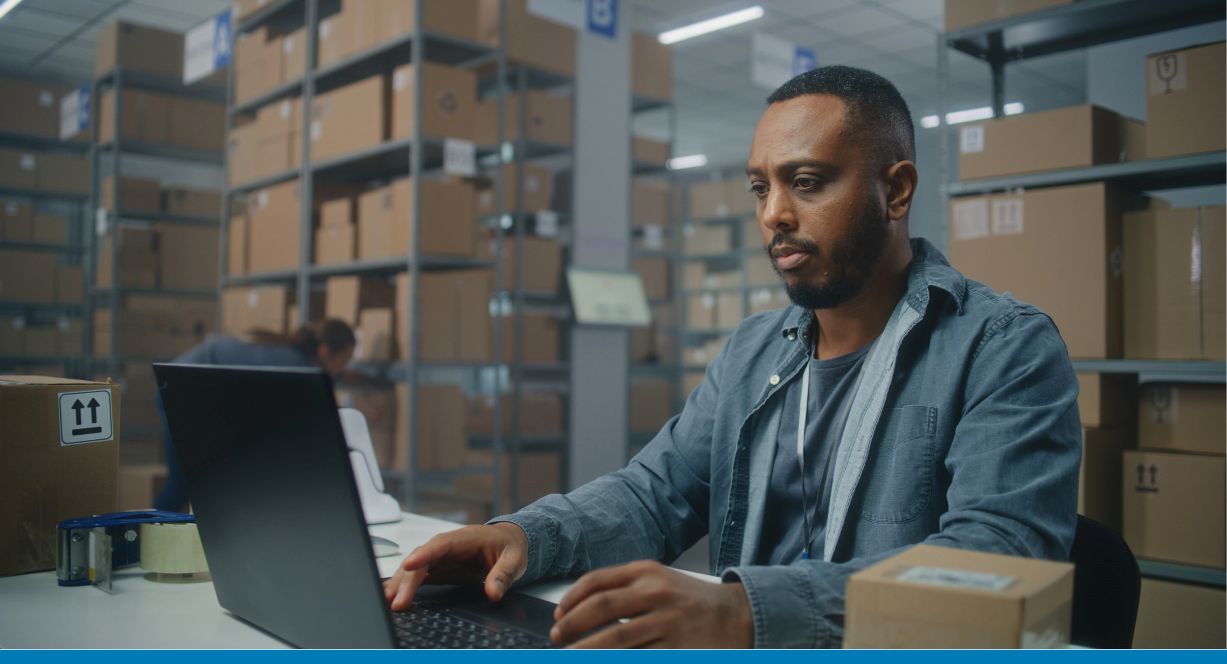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