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분야에서 민간과 구분된 인공지능(AI) 독자 모델을 개발에 집중한다면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AI 기업들의 군 데이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순차적으로 협력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 모두의연구소에서 열린 '제25-7차 국방 AI 혁신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방 AI 혁신 네트워크는 국방 데이터 혁신과 AI·디지털 전환(AX/DX)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간 AI 업체와 협업을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군(軍)이 독자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AI를 도입할 때 드는 물리적·시간적 비용과 국가가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국방 AI가 민간 기술 기반 위에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군이 AI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대신 민간 기업에서는 클라우드의 보안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AI 칩 활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AI 모델부터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수직 최적화 작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반도체 설계를 고민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토큰당 10~20배 비용이 들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칩 선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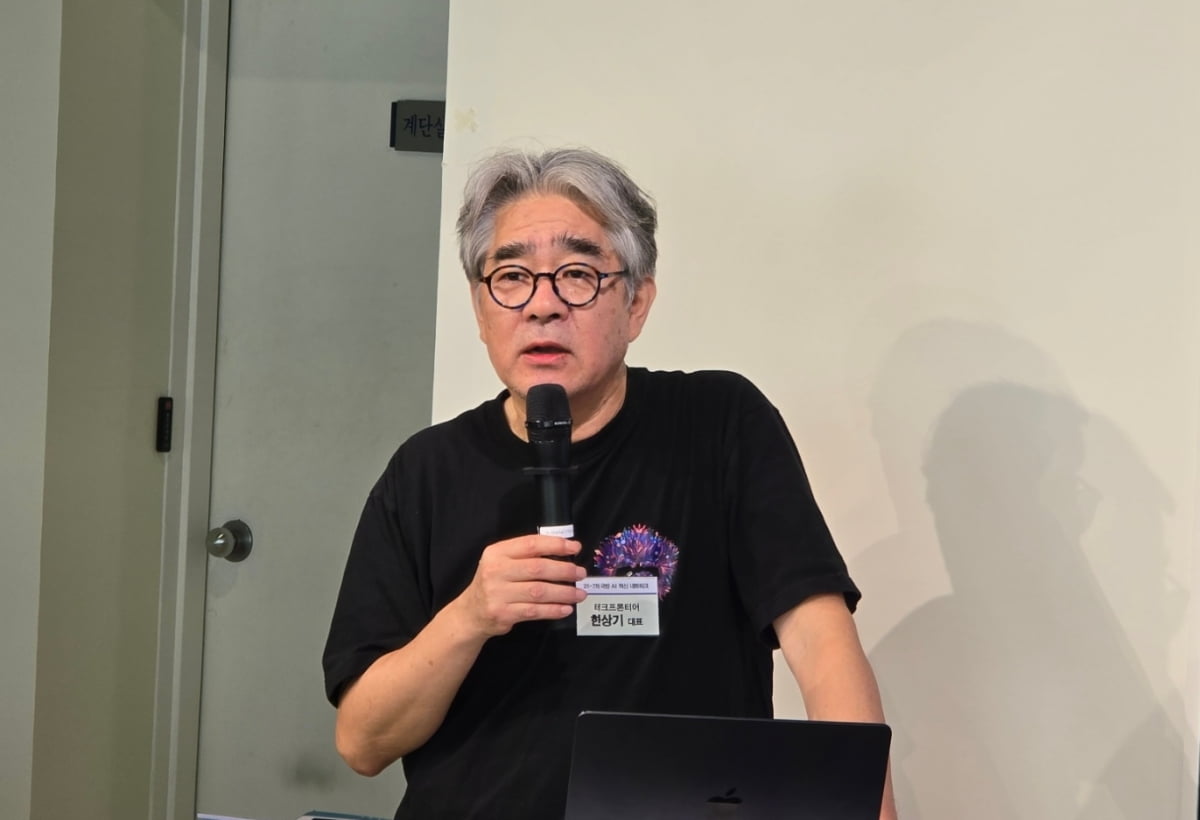
국방 소버린 AI가 갖춰지려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이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2017년부터 AI 모델의 기반이 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넘어서는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모델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초지능 연구소에 5년 간 1조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000억 원이 투자되는 셈인데,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이정도 투자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부터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AI '풀스택'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

 9 hours ago
1
9 hours ago
1



![[르포] 서울 한복판에서 체험하는 항공기 1등석...’에미레이트 항공 트레블스토어’](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8/20/d0647e5a48394a4a-thumbnail-960x540-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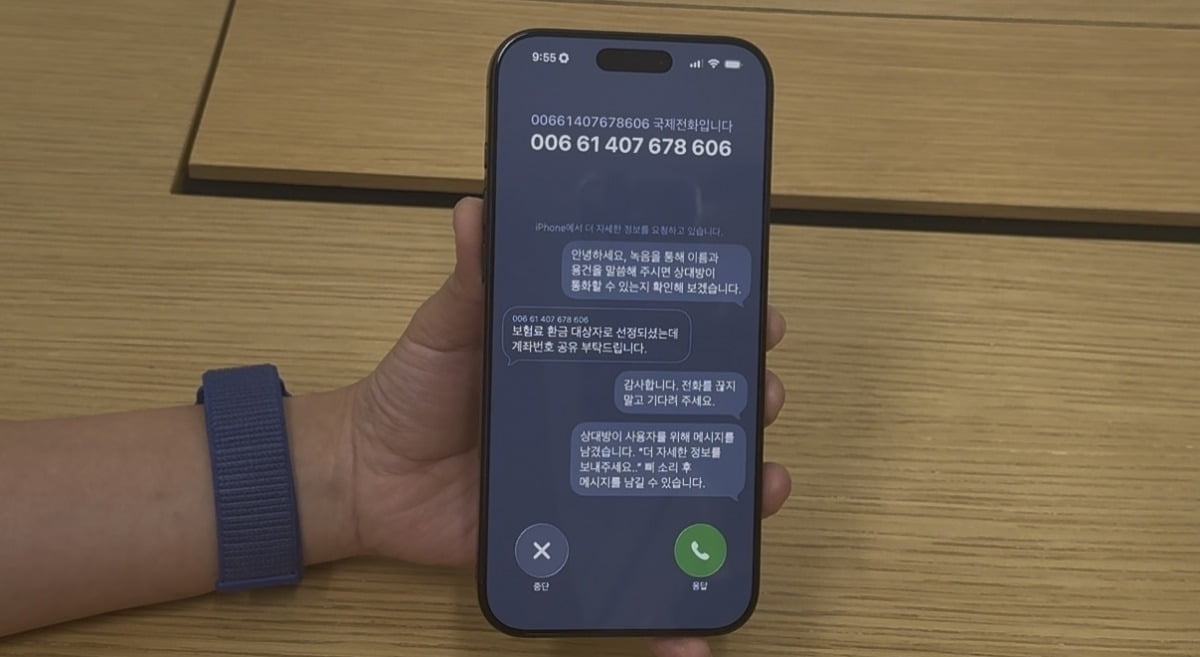
![[포토] 3년만에 한국 찾은 빌 게이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6df53fd255ad4f87980d24b3dae06597_P1.jpg)

![[포토] 한국 찾은 빌 게이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d0699ae9c45940f2baa18bf2d27a07a3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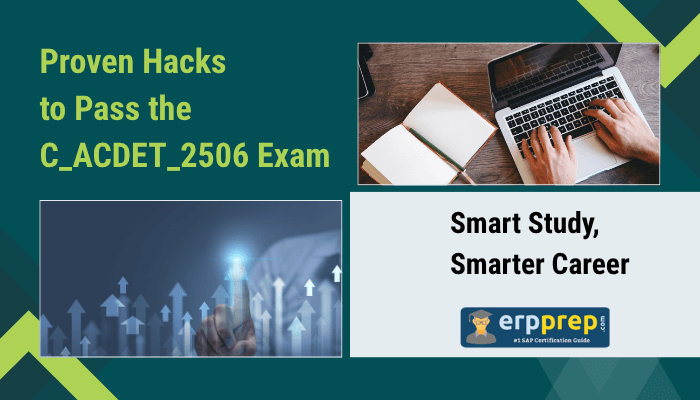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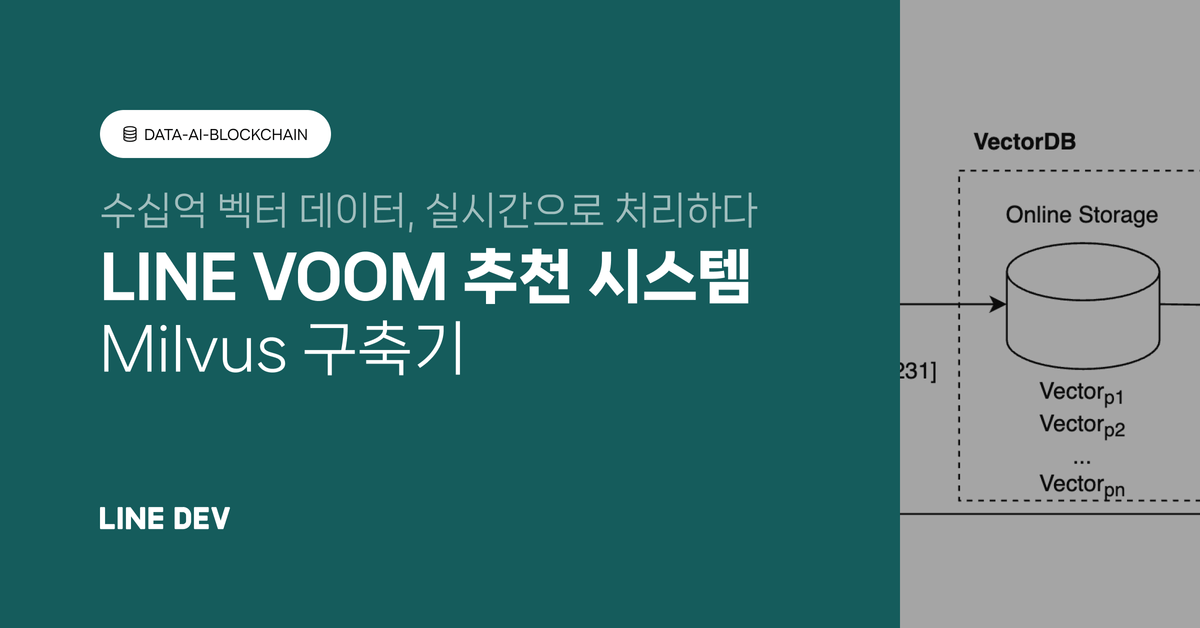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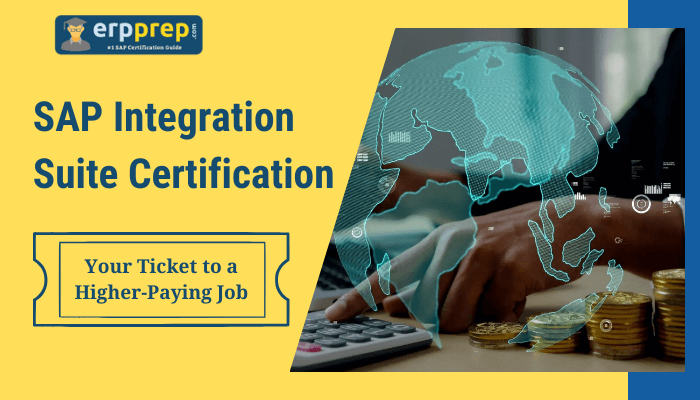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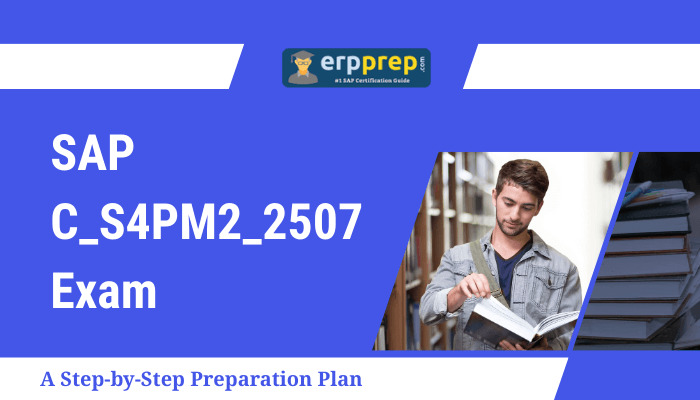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