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원, -238억원, -238억원…’. 2016년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만든 ‘뮤직카우’의 최근 3년 영업손실액이다. 2022년 4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투자 상품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인허가 없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뮤직카우는 보유한 대표 히트곡 저작권 자산 수익으로 근근이 버티며 미국 사업 확장을 노렸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국내에서 규제로 사업이 틀어막힌 사이 미국에선 수조원 규모의 유사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런 흐름을 지켜보며 미국 진출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규제 발묶여 2년간 영업 공백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의 미국법인 뮤직카우US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1호 음악 수익증권을 출시했다. 스타트업이 별도 상장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 대상 소액 공모를 허용한 ‘레귤레이션(Regulation) A+’ 제도를 활용했다. 뮤직카우는 팝스타 켈리 클라크슨의 히트곡 ‘미스터 노 잇 올(Mr. Know It All)’을 기초 자산으로 총 382주(약 1050만원어치)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전량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SEC 등록 절차를 거친 한국 최초 ‘음악 기반 디지털 증권’ 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국내에선 ‘증권성’ 시비 끝에 판매조차 막힌 상품이 미국에선 제도권 금융시장에 공식 편입된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뮤직카우는 창업 이후 몇 년간 음악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디지털 증권으로 쪼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해 4월부터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옥션’을 더는 진행할 수 없었고, 보유 저작권을 매각해 간신히 수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근근이 버텼다.
이후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뮤직카우는 다시 제도권 금융 내 ‘음악 수익증권’ 발행 허가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 소진이 컸다. 2023년 말 359억원에 달하던 현금성 자산은 올해 70억원대로 줄었다. 약 2년간의 영업 공백을 겪는 동안 미국에선 주크박스(JKBX) 등 비슷한 사업 모델을 등에 업은 후발주자가 시장을 선점했다.
◇“전화위복의 기회 살릴 것”
뮤직카우는 이번 미국 진출을 계기로 사업 모델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와 팬덤이 결합한 ‘문화금융’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 전까지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문화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 자산’ 금융화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음원 수익권이라는 무형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구조화한 국내 최초 사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향후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한류 지식재산권(IP)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반 판매, 공연 수익 등 흥행 성과에 기반해 수익을 창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창작 단계에서부터 모험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음악 저작권 시장과 맞물려 문화금융 모델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음악 저작권 시장 매출은 439억달러(약 60조원)로 2028년 534억달러(약 73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음악을 듣는 방식이 조회수에 따라 저작권 수익이 발생하는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뀌며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음악 저작권을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보는 흐름이 커지는 추세다.
▶레귤레이션 A+ 제도
미국 증권법에 따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소액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6 hours ago
1
6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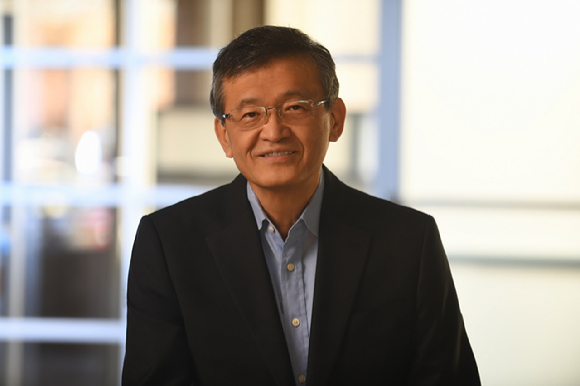


![넷마블, 2분기 실적 개선…RF·세븐나이츠 '쌍끌이 흥행' 통했다 [종합]](https://image.inews24.com/v1/5cf1855b6224f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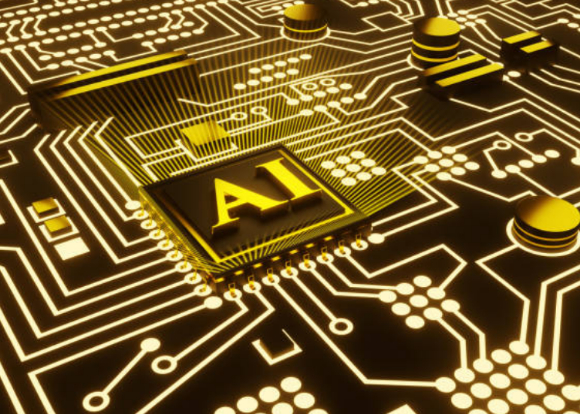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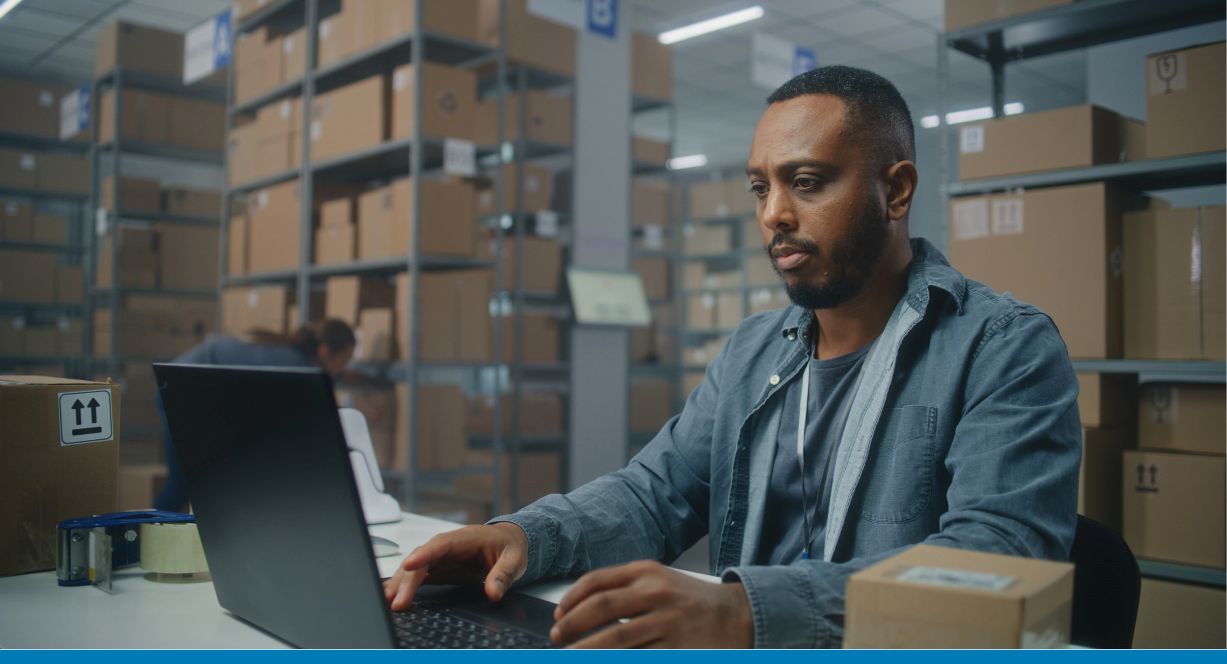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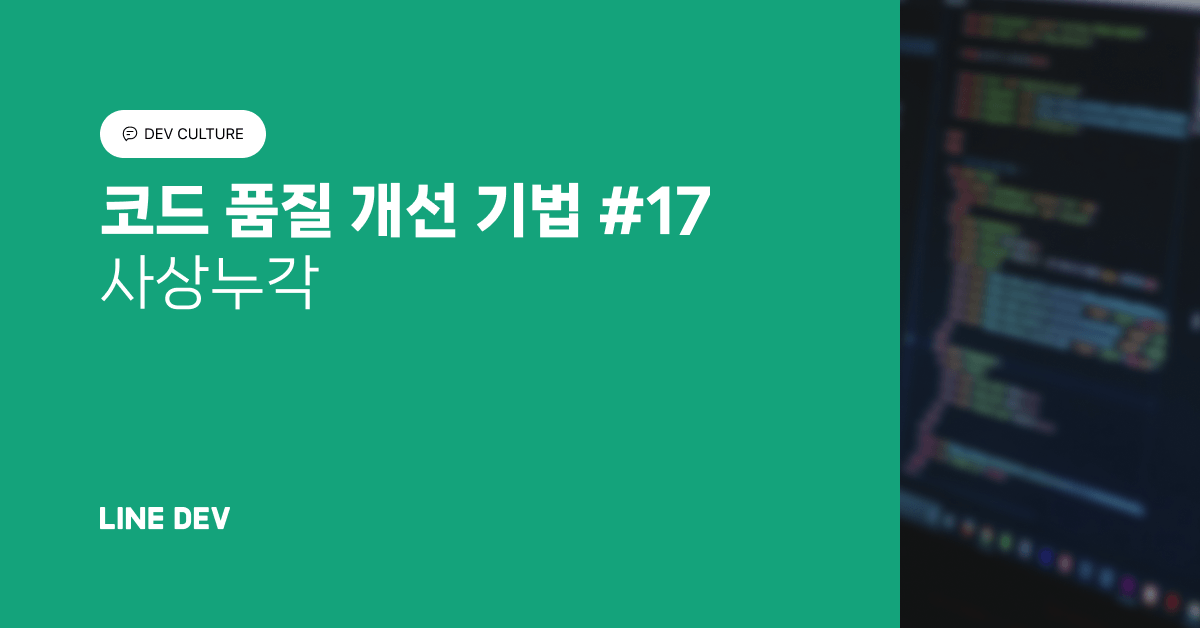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