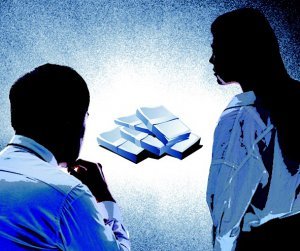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출을 끼고 땅을 산 뒤 건물을 짓고 되파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대출 심사역인 아내와 기업은행 사모임 5곳에서 만난 전현직 임직원이 대거 동원됐다. 대출 증빙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지만 아내와 동료들은 이를 묵인하고 돈을 내줬다. A 씨의 입행 동기인 대출심사센터장과 지점장들은 미분양 상가의 부당 대출을 줄줄이 승인해 줬고, 고위 임원은 미분양 난 건물에 아예 은행 점포를 입점시켰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접 빌리거나 건설사에 알선해준 부당 대출은 51건, 785억 원에 달한다. 이쯤 되면 국책은행이 아니라 ‘사금고’라 불러야 할 판이다. A 씨의 부정을 공모하거나 눈감아준 임직원들은 두둑한 대가를 챙겼다. A 씨에게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이 스무 명이 넘고, 일부 임직원은 배우자들이 A 씨 회사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은행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 불감증’ 수준이다.
▷더군다나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일부 직원들은 수백 개 문서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또 은행 조사 결과 부당 대출 규모가 240억 원이라고 공시했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3배 넘게 늘었다. 은행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셈이다.▷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얽힌 불법 대출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부당 대출이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 경영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억대 금품을 받은 뒤 수백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위법 행태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고객들이 이런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도 되나 싶다. 신뢰와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은행권의 탈선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8
1 month ago
8


![[기고]K건기식 미래 '홍삼'에 달렸다](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513514448676_1.jpg)
![백종원의 '골든타임'[우보세]](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514510180238_1.jpg)
![[기고]인공지능 시대의 도량형(度量衡) 이야기](https://thumb.mt.co.kr/21/2025/05/2025051513191631843_1.jpg)
![우주·남극연구 파트너 한·칠레[공관에서 온 편지]](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적국도 품는 '사업가' 트럼프의 실리외교 [기자수첩]](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511301518854_1.jpg)
![[투데이 窓]악(惡), 어디까지 겪어봤니?](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513194823512_1.jpg)
![[팔면봉]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尹 탈당 문제’ 매듭 못 짓는 국힘.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권지예의 이심전심]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필요할 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