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의료법에 발목잡힌 '직장 건강 주치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0325968.1.jpg)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내 부속병원이 의료법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헬스케어 자회사인 KB헬스케어의 최낙천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내 부속병원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만 설립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직원과 가족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내 부속병원을 둘 수 있다. 사내 부속병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222개에서 지난해 258개로 증가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KB 등이 운용하고 있다.
수는 늘고 있지만 허울뿐인 ‘의료 영리화’ 논쟁에 가로막혀 활용은 제한적이다. 부속병원이 세워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04년 복지부가 동일 계열 그룹사 직원은 원칙적으로 부속병원 진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룹 차원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부속병원이 체계적으로 직원 건강 상태를 관리하려면 그룹 내 의료 서비스 간 통합과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사에 설치된 부속병원을 계열사나 지사 직원들이 찾아 진료받는 길은 막혀 있다. 특정 지사에 설치된 부속병원 의사가 다른 지사 직원의 건강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불법이다. 지사 이동이 잦은 기업에선 의사가 오랜 기간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내 부속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이윤’이 아니라 ‘직원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과잉 진료 없이 ‘직장 주치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은 부속병원 의사를 통해 간단한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부속병원 의사가 직접 대학병원 등에 진료를 의뢰하면 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 ‘게이트키퍼’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은 직원의 질병 위험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부속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질병이 생기기 전 예방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은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일본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2017년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를 마련하면서다. 그동안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페이어’(비용 지불자) 문제를 풀 열쇠로도 거론되는 이유다.
직장 건강 주치의인 사내 부속병원을 옭아맨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같은 근거 없는 편견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1 month ago
11
1 month ago
11
![[부음] 김경웅(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씨 별세](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부고]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 조모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8/03/AKR20250803034800546_01_i_P4.jpg)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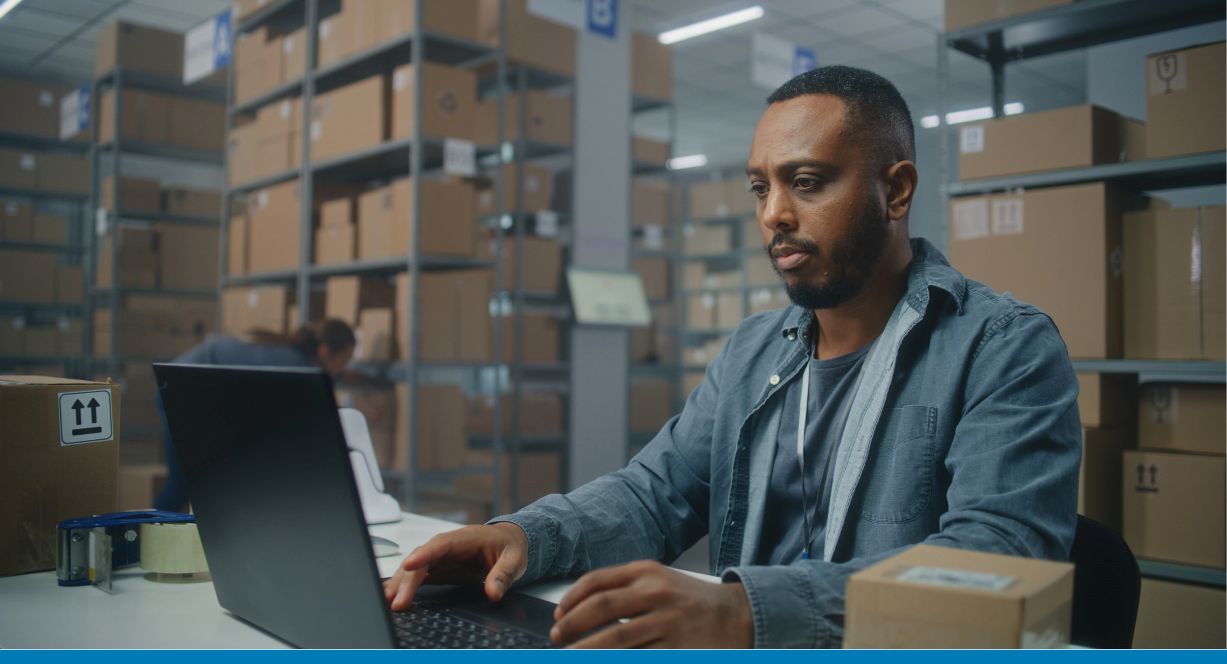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