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칼럼] 미·중 최후의 결전, '라스트 벨'이 울리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5383340.1.jpg)
자유진영의 맹주 미국, 원래는 트럼프처럼 돈을 세는 나라가 아니었다. 재정과 무역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도 기꺼이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줬다. 구소련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과 책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덫을 놓은 원유공급망 전쟁에 말려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1970년대 중·후반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갑자기 재정이 넉넉해진 소련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소강상태의 미소 냉전을 열전으로 바꿔놓았다. 1982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동맹국들에 소련의 천연가스 매입을 금지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 지원을 매개로 원유 증산을 관철시킨 것. 1980년 배럴당 38달러이던 유가가 1987년 11달러로 폭락하자 소련 외환보유액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터졌다. 국제 시장에 돈을 빌리러 나온 소련의 자금줄을 막아버린 것. 소련은 1992년 공식 해체돼 지도에서 사라졌다.
중국은 21세기 초까지 미국과 경제적 협력관계였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을 사주고 중국은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들였다. 중국 경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미국은 닷컴경제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1990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에 불과하던 중국 GDP가 2007년 30%까지 육박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를 일삼으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금융시스템 민낯이 드러나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8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대담한 도발을 한다. “달러 기축통화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마음 놓고 사주기도 어렵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저축국인 중국의 동행은 이렇게 끝나고 ‘G2 시대’로 명명된 미·중 패권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정권은 달라도 바이든의 공급망 전쟁,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며 목표는 소련 해체와 같은 중국 말살이다. 트럼프는 물가와 소비와 고용을 희생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후임자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폭주는 분명히 폭력적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 판단과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중국과 군사·경제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튼튼하고 달러 패권이 확고해야 한다. 트럼프 경제의 최종 목표는 제조업 부활과 중국 봉쇄다. 그동안 한국 일본 중국에 선선히 내줬던 제조업 패권을 거둬들이려 한다. 중국 일본에 비해 내수기반이 턱없이 취약한 우리로선 당장 눈앞의 관세율보다 훨씬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미국의 맹방 일본은 이번에 트럼프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일본은 참을 수 없는 수모들을 겪었다. 2차대전 때 핵 폭격을 받았고, 1985년엔 굴욕적 플라자 합의 서명을 강요받았다. 원자폭탄이야 진주만 습격으로 자초한 것이지만 엔화 강제 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는 요즘 자국우선주의 잣대로 봐도 지나친 것이었다. 그래도 일본은 참고 견딘다. 항상 미국에 머리를 조아린다. 아직은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한말 서세동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그러고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 중국 공산당처럼 전승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해 강제 분단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한국은 이제 경제·군사강국이 됐지만 거대한 국제질서 흐름에선 여전히 주변국 신세다. 미국은 대중 포위망에 일본 인도 호주 한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연대·포섭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그토록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푸틴을 좋아하고 젤렌스키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 협조 없이 중국 고립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중국 포위 열차에 한국의 승차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는 가능하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단 한 번의 전략적 판단 착오가 국가 명운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시기,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스트 벨’이 울리고 있다.

 21 hours ago
2
21 hours ago
2
![[데스크라인]당뇨, 예방에도 투자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1/news-p.v1.20250731.5b072223b1b1413da41bf37e32e2c0a1_P1.jpg)
![[부음] 박희현(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시부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ET톡] 광주 'AI 선도도시' 흔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9/news-p.v1.20250729.025cc50e186c43fd8d5ac132236c2503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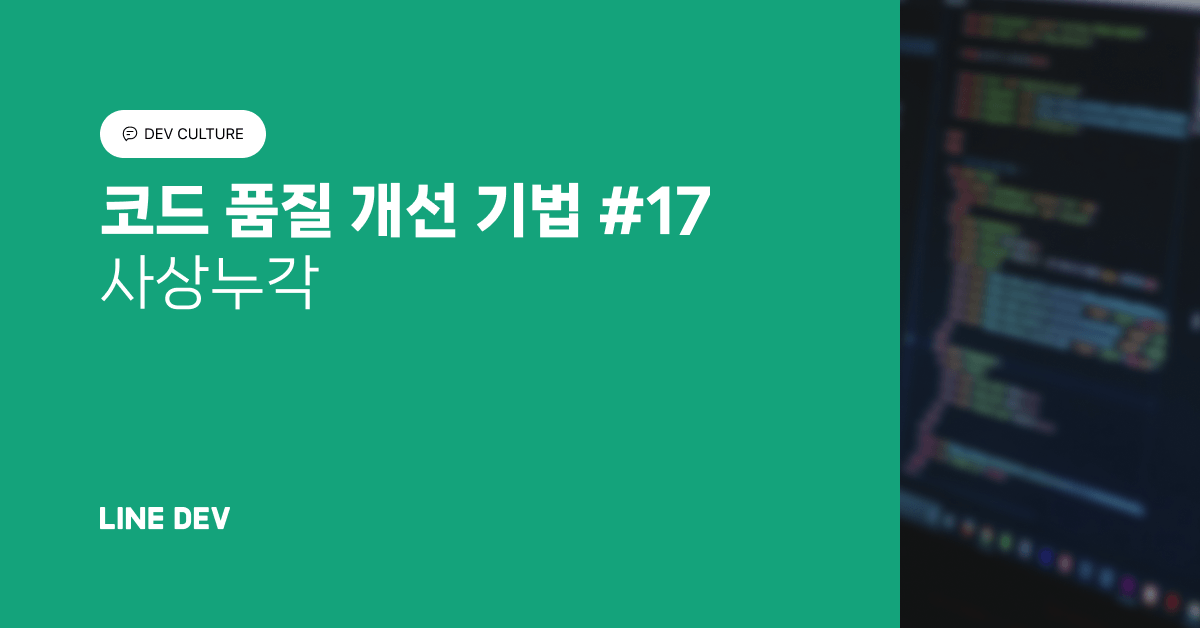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