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57〉 [AC협회장 주간록67] 모태펀드는 스타트업 생태계 '뿌리'이자 '버팀목'](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6/news-p.v1.20250516.e6c5e0e46ff445ad88bba0377665a5a4_P3.jpg)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 역동성이 맞물린 결과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모태펀드'가 있었다. 2005년 설립된 이래 모태펀드는 지금까지 총 31조7996억원 벤처투자를 유도하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자본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초창기 스타트업에 씨앗자금을 공급하고, 고위험 기술에 모험자본을 유입시키며, 벤처캐피털(VC) 업계 성장과 구조화를 이끈 실질적인 엔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모태펀드의 존속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률상 존속기한인 2035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통상적인 벤처펀드 운용기간(8년)을 감안할 때 2027년 이후 신규출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단기적 자금난을 넘어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한국 벤처투자 구조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벤처펀드에 참여하는 LP(출자자) 중 정부·정책기관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모태펀드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펀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펀드를 중심으로 구축된 수많은 자펀드 파급 경로가 끊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스타트업 자금 흐름 전체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 LP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자금 존재는 '선도 투자자'로서 기능을 한다. 민간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초기 단계, 딥테크, 지역 기반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영역은 여전히 모태펀드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자금만으로는 생태계 전반을 커버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공공적 투자 미션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더욱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흐름은 한국 스타트업에 국가적 산업 전략과 연계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투자 플랫폼을 접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미래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 해석상 모태펀드는 2035년까지 운영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시장 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중단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투자 생태계에 '계속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LP와 VC, 창업자 모두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이는 펀딩 위축과 도전정신 약화로 이어진다.
모태펀드는 단지 돈을 푸는 기금이 아니다. 산업 전략의 도구이자, 기술 주권의 방패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제는 존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략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후기술, 국방·우주, 바이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트랙 신설, 지방 AC 및 로컬펀드 연계 강화, ESG 기반의 장기 수익형 펀드 실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더 이상 모태펀드가 필요 없다”는 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이 위축되고, 모험자본이 신중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야말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다. 한국 스타트업의 다음 20년을 위해 모태펀드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한국 경제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1 month ago
10
1 month ago
10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부고] 김형우(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614365769233_1.jpg)
![[광화문] 쳇바퀴 도는 'K-자율주행'](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1373663582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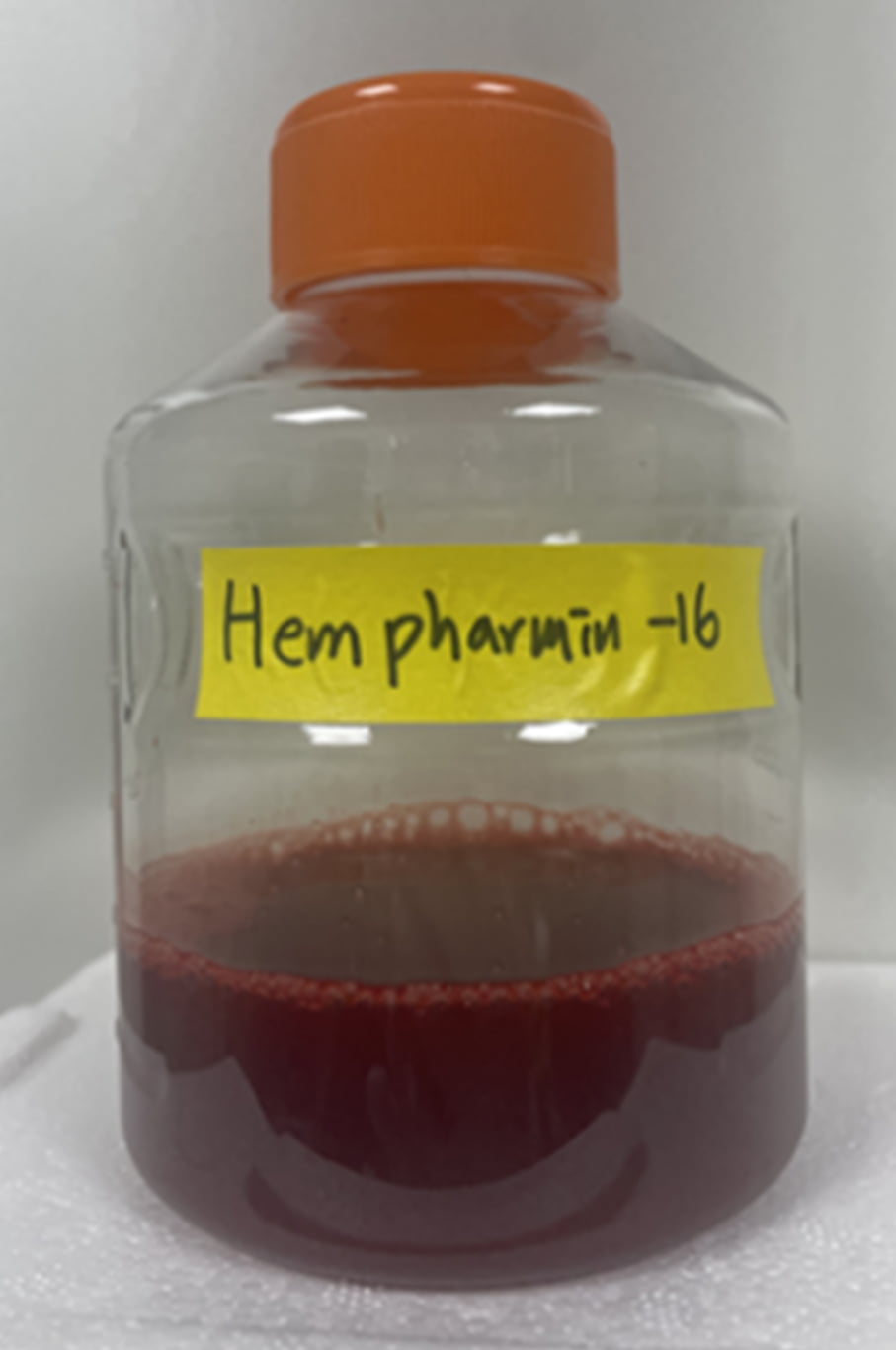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