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정치에서 중도(中道)가 실종되면 국가의 무게 중심이 흔들린다. 역사는 이를 여러 번 보여줬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의회는 존재했지만, 타협은 불가능했다. 진영 내 이른바 '열심당원'은 협상과 양보를 배신으로 간주했다. 지도자들은 국가 전체보다 진영 내 정서를 먼저 관리해야 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좌우파의 극한 대립 속에 중간 지대는 설 자리를 잃었다. 타협을 시도한 정치인은 양쪽에서 배제됐다.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는 당 지도부지만, 의사 결정의 무게추는 강성 당원 쪽으로 기울어 간다. 여야를 불문하고 당 지도부는 이들의 경고에 말을 바꾸기도 한다. 발언과 표결, 작은 제스처까지 실시간 평가되고 좌표가 찍힌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조직화된 당원 비위를 맞추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경선에서 먹히는 언어가 본선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행동의 준거를 당심(黨心)에서 찾는다.
이는 한국 정치만의 풍경이 아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 공화당 정치인들이 전국 여론보다 예비선거를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 반응에 더 민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도 비슷하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 투표가 지도부 선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내부 활동가를 의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 AfD와 프랑스 국민연합(RN) 등 극우정당도 세를 넓혀 왔지만, 연립 구성에 필요한 중도층의 '동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정당이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곡예를 반복한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누구는 민주주의의 심화, 즉 당원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반대 쪽에선 숙의와 절제가 밀려나면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징후라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중의 감정이 이성과 규범을 무력화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징후로 읽으려는 관점도 있다. 어느 게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서 공통점은 찾아볼 수 있다. 정치가 전체 유권자 대신 결집된 소수를 향할수록 언어는 거칠어지고,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현대 정치에서 열성 당원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당원은 정당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내부의 열기를 바깥으로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울림은 안에서만 맴돌게 될 뿐이다.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지지의 강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지지의 폭도 넓혀야 하는 것이다. 당심이 강경파의 요구에 잠식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확장의 길을 잃어버린다. 정치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승리하는 싸움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06시30분 송고





!["문송합니다" 했는데…"연봉 11억 드려요" 반전 일어났다 [테크로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273408.1.jpg)
![구글 "AI 악용 본격화...실시간 변신하는 악성코드 첫 발견" [AI브리핑]](https://image.inews24.com/v1/3ba4db97effa0d.jpg)
![[이런말저런글] 딱 좋은 그만큼만 '설밥'이 온다면…](https://img3.yna.co.kr/photo/cms/2019/09/06/29/PCM20190906000329990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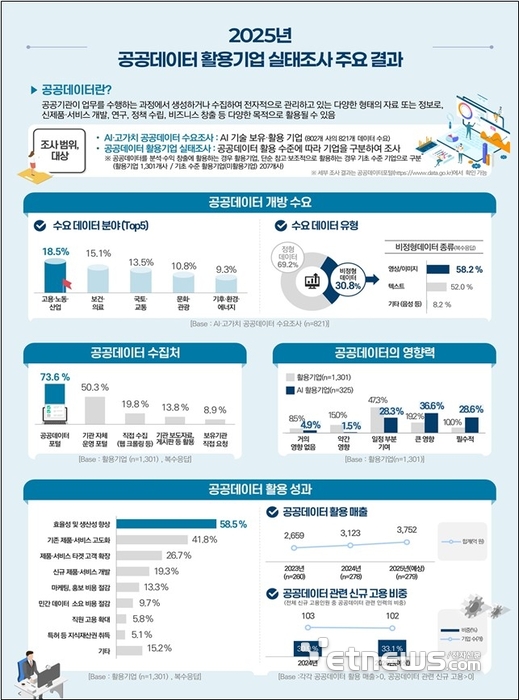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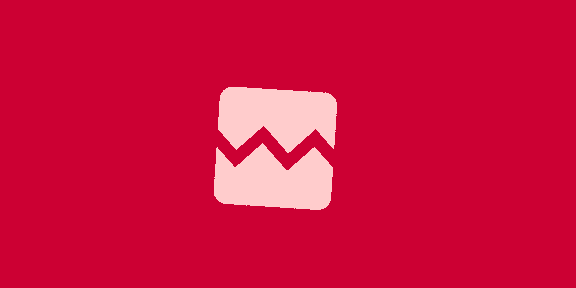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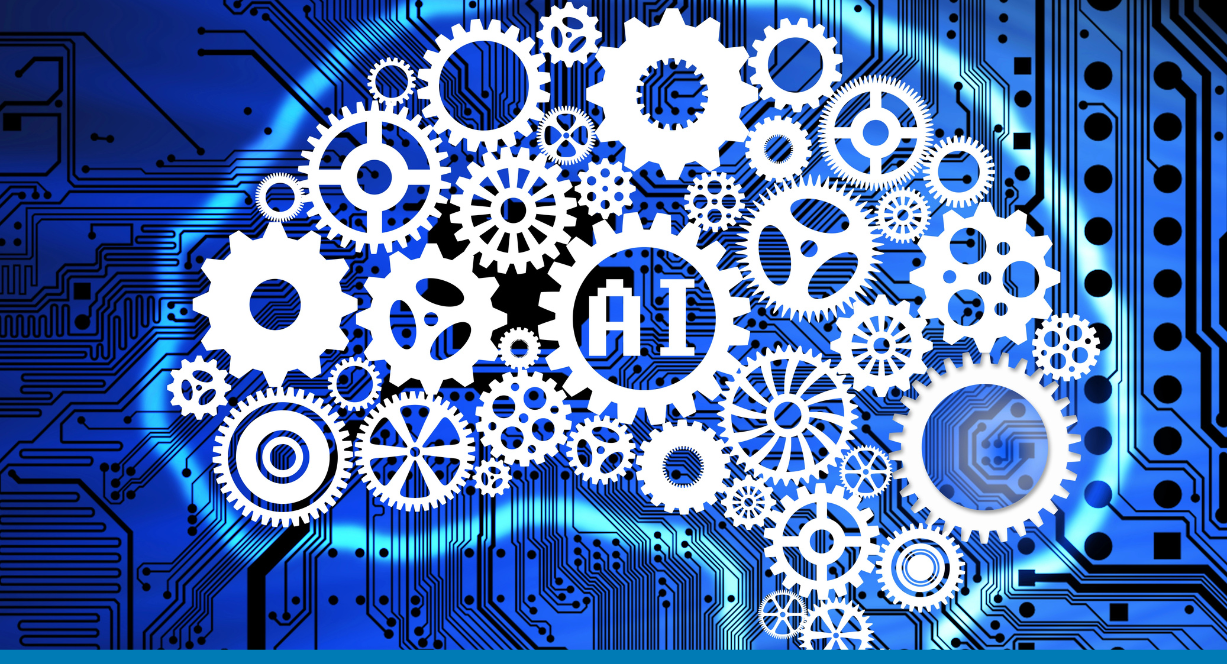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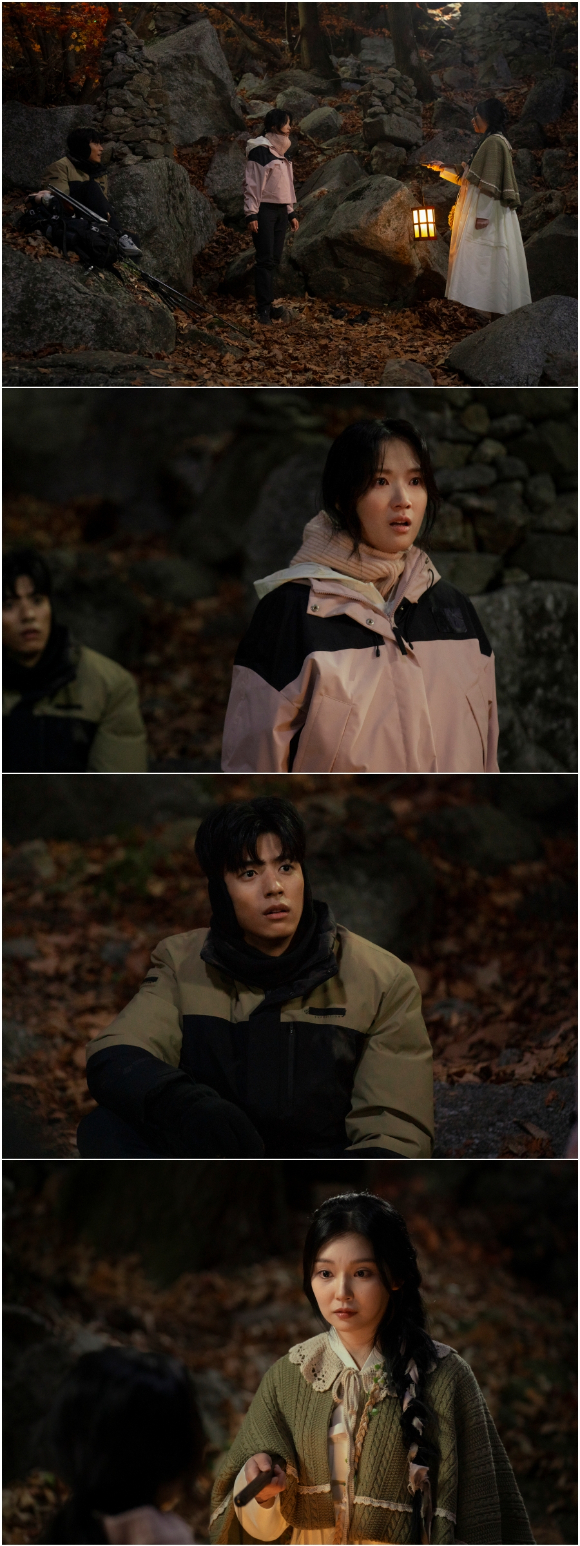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