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트럼프 관세 뒤엔 美 제조업 쇠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14477123.1.jpg)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 모레인의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이 2008년 겨울 문을 닫았다. 하루아침에 2만4000명이 실업자가 됐다. 공장이 다시 가동된 것은 그로부터 7년 뒤. 중국 유리 제조업체 푸야오글라스가 공장을 인수하면서다. 그렇지만 채용된 인력은 2000명뿐이었고, 임금은 GM 시절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의 배경이 된 모레인은 전통적으로 유리산업이 강했다. 2차대전 이후에는 가전산업, 1980~1990년대엔 자동차산업에 올라타며 호황을 누렸다. 모레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세계화였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자 저렴한 수입품이 미국에 밀려왔다. 미국 기업도 값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모레인뿐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다른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기성 정치권과 미국 주류 사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국이 제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 경제로 가고 있다거나, 고급 제조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실직자 문제도 재교육을 통해 다른 고임금 직종으로 옮기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현실은 달랐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주민 상당수가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삶은 피폐해졌고 일부는 마약에 빠졌다.
이들의 민심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핵심은 제조업 부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과거 미국에선 고학력이 아니어도 괜찮은 일자리를 잡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미국을 다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 수단이 관세다. 미국에 공장을 더 짓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가라는 요구를 순순히 따를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를 압박할 카드가 바로 관세다.
관세로 물가가 뛰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만 트럼프에겐 부차적 문제다.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서 “과연 값싼 텔레비전이 미국 공장보다 가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자 이익이 무슨 소용 있냐는 것이다.
마구잡이 관세로 미국 국채 값이 폭락하고 달러 위상이 흔들리고,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든 것은 트럼프의 패착이다. 고임금의 미국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없으면 중산층 재건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제조업 살리기는 미국의 국가 프로젝트로 계속될 것이다. 제조업 없이는 기술 패권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도 어렵다는 게 초당적 인식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관세 대신 보조금을 썼을 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정작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에선 정치권이 그 정도로 절박감을 느끼는지 의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하는 반도체산업에서 연구개발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작은 개혁조차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는 걸 보면 말이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게 현실이다. 경쟁력을 잃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 거대 시장을 지닌 미국은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 수도 없지 않나.

 1 month ago
14
1 month ago
14
![[팔면봉]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 징역 7년 8개월 확정된 이화영, 사면·복권 공개 주장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만델라의 녹색 유니폼처럼… 공동체 상처 치유하는 리더가 필요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BKBMWTY6VCGBGTMIWXBMUXERU.png?auth=2cd6ff90ea903056465a1fe0bdad9bdbfa6890b3fb18bd3b4250a362c3997da2&smart=true&width=500&height=500)
![[조용헌 살롱] [1497] 고성 화진포(花津浦)](https://www.chosun.com/resizer/v2/B7FJ6EYGEJDANM4AZSIJ2H7WKM.png?auth=6636bf691c88dacb12fa4ad1d7312b92733dee5192a0d28818de135e45d86208&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75] 그러거나 말거나](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67] 하와이](https://www.chosun.com/resizer/v2/5XHK7PZ56NHTTKH7COJFQ4M54Q.png?auth=664876bab5cee8d9c73896a7d01b64f27386130e62bef9ae4289fdb3837c803b&smart=true&width=500&height=500)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https://www.chosun.com/resizer/v2/ABRPIUOKSVRGYU6PLWJJU5Y6FA.jpg?auth=dd2a6ef93fef1179d6acc4779b24cdf130d1914736b569800b9022008ae9748f&smart=true&width=2200&height=1467)
![[사설] “사면 요구” 이화영, 정권에 청구서 내미는 듯](https://www.chosun.com/resizer/v2/PE4J5SR54FHKBIIE7GCUSS3NBE.jpg?auth=f8e1bd383636122b0253dcca1ab61ce59749cd95938e1e6b17a08c8944a22651&smart=true&width=1106&height=622)

![[천자칼럼] 소리 없이 강한 韓 기업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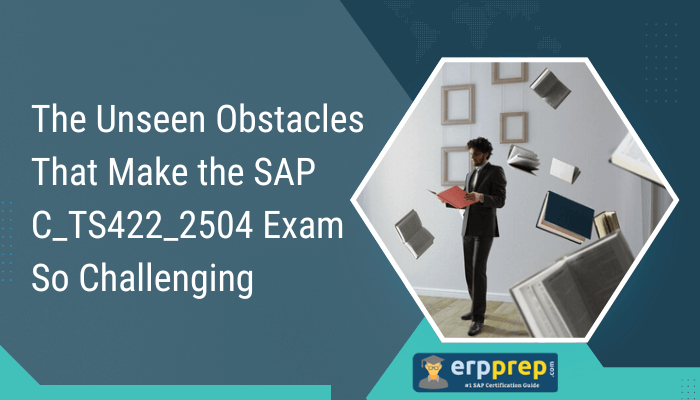

![[포토] 트리플에스 설린, '눈 뗄 수 없는 예쁨'](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3.40571444.1.jpg)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데이터 시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1c6020f803074b48885e5e159213de62_Z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