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하고 싶은 걸 하는 마음에 대하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9648277.1.jpg)
수련이 벙글고 복숭아가 익어가는 7월, 1학기 강의를 마친 나에게도 방학이 생겼다. 여유를 부릴 새도 없이 방학은 바쁘게 흘러간다. 뜨개질 모임도 가야 하고, 낭독회도 가야 하고, 유화 그리기도 멈출 수 없다. 무엇보다 박사 논문을 써야 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라 아직 졸업을 못 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졸업과 맞바꾼 값진 삶이었구나 싶다. 실은 정년을 앞두고 졸업 못한 제자가 걱정됐는지 지도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얼마 전에 읽은 글이 생각났다. 인터넷 검색 창에 내 이름을 검색했다가 발견한 지도교수님의 신문 기고 글이었다. 학교를 떠나며, 학부에서 가르친 제자 중 시인이 된 이들의 이름을 부른 자리에 내 이름이 끼어 있었다. 더 많은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며 쓰다듬은 자리도 보였다. 얼마나 많은 제자가 선생님의 그늘에 있다가 떠났을까.
“정년 기념 문집이나, 고별 강연 등 일체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장 앞에 오래 멈춰 섰다.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상담 시간이 끝나 버린 듯 섭섭한 마음이 들어, D에게 전화했다.
“우리 선생님하고 식사 자리라도 작게 마련할까?”
그렇게 이승하 선생님의 정년 축하 자리가 마련됐다. 시인이 된 제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자리다. 작은 마음들 덕분에 선생님 앞에서 20년 전의 학부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학부 시절 이승하 선생님은 과제를 제출하면 깨알 같은 글씨로 피드백을 써 돌려주셨다. 그 시절 선생님은 젊었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가끔 선생님이 어느 선배의 시가 프린트된 종이를 찢어버렸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지만, 실상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누군가의 시를 오래도록 칭찬한 기억이 생생하다. 전쟁에 관한 시였다. 구체적인 문장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감탄하며 동기의 시를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었다. 시라는 것에도 크기가 있구나 싶었다. ‘나도 작은 시 말고 큰 시를 써봐야지.’ 속말을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오랫동안 큰 시는 쓰지 못했다. 사는 동안 선배들은 나무같이 우람해졌고, 후배들은 여전히 송사리 떼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모임을 자주 했었다면 오늘 이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후배인 S시인은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차례 출판 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시집을 만들 거라고 한다. 나는 놀라 되물었다.
“거절했다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니까.”
“돈은?”
“퇴직금. 이거 하려고 그동안 일한 거야.”
“그럼 많이 팔아야겠네?”
“아니, 안 팔 건데?”
“야! 안 팔 건데 왜 만들어?”
자꾸만 왜냐고 따져 묻는 나를 진정시키며 S시인 옆에 있던 H시인이 말했다.
“누나! 이럴 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해.”
그 자리에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S의 말을 곱씹었다. 한 사람의 욕망이 향하는 곳에 그가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 말고 없다는 게 나는 몹시 낯설었나 보다. 하던 대로 하게 되는 삶 속에서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S의 투명함이 기분 좋게 나를 감쌌다. 지금껏 시인으로 살아오신 선생님은 퇴직 후 소설을 쓰겠다고 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마음은 이젠 끝이라는 마음보다 시작에 가까운 마음이라서 좋다. 선생님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주문한 떡 케이크에는 가장 상투적인 문장을 썼다. “선생님의 정년을 축하합니다.”

 1 month ago
10
1 month ago
10
![[부음] 김경웅(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씨 별세](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부고]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 조모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8/03/AKR20250803034800546_01_i_P4.jpg)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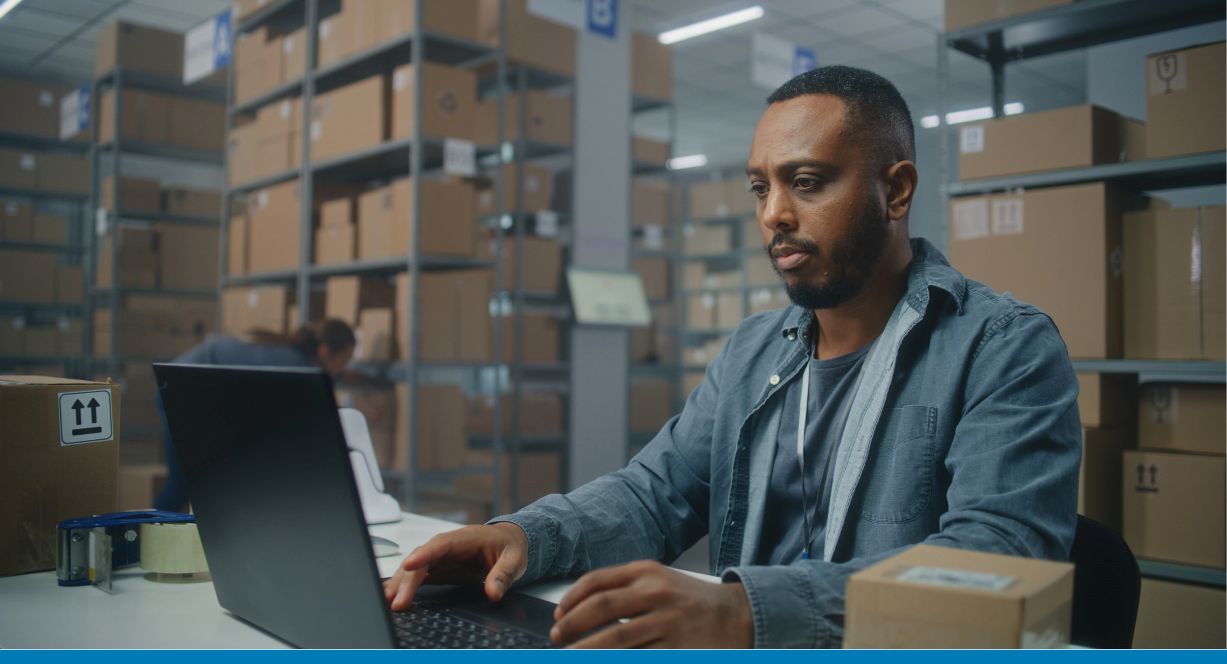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