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 칼럼] 새벽 3시 14분, 일하고 있는 사람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6042267.1.jpg)
‘3:14am gang.’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회사 xAI의 개발 총괄 그레그 양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전 3시14분이네, 친구들” 정도인데, 의도는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 보쇼”쯤 아닐까 싶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개중에는 수학 귀재인 AI 개발자들답게 3:14를 수학 원주율(파이, 3.14)에 빗대 ‘지금 파이 먹고 있어요’ 식의 중의적 유머로 받아친 답글도 더러 보였다.
이날 채팅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머스크였다. 이 상황이 흐뭇한 그는 ‘nice’라고 남겼다. 머스크는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많을 때는 휴일 없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직원들에게 ‘서지(surge)’라는 고강도 업무 미션으로 ‘하드코어’ 정신을 불어넣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xAI는 두 달 뒤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자랑하는 추론형 AI 모델 ‘그록3’를 내놨다.
그런 머스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업장이 있다. 베를린 인근의 테슬라 독일 공장으로, 병가율이 15%를 넘는다. 회사가 병가를 많이 낸 직원 중 의심 가는 이들의 집을 불시 방문해 ‘꾀병’ 여부를 조사한 적도 있다. 독일의 병가율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근로자 한 사람당 연간 병가 일수가 20일에 육박해 세계 챔피언급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3일 이내의 병가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며, 병명을 밝힐 의무도 없다. 독일에는 ‘병가 전문’ 사립 탐정들도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1년에 100일이나 병가를 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미국과 독일의 경제 현실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보자. 독일은 2023년과 2024년 -0.3%와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은 0.0%, 제로 성장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5%와 2.8%씩 성장했다. 트럭이 픽업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독일의 침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과 과도한 중국 의존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독일 재무장관이 지적하듯 ‘근로 의욕’과 ‘일의 양’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미국인의 연평균(2022년) 근로 시간은 1811시간이다. 독일은 134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봉급 생활자로 보면 미국인은 연간 1822시간, 독일인은 1295시간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독일인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 독일 내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 국민의 52%가 ‘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구태여 힘들여 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독일 공장에서 결근이 정규 근무 시간의 5% 미만인 직원들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해 1000유로(약 160만원)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병가율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반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에는 초과근로수당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미 빨리 달리고 있는데도 더 달리라며 당근으로 세제 혜택까지 제시하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이다.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목표다. 그런데 실제 쥐고 흔드는 정책들을 보면 이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주 4.5일 근무제는 워라밸을 지향하는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이 유독 워라밸에 민감하겠는가. 열심히 일해봐야 무능한 고참들이 한참 더 많이 가져가는데, 휴식이라도 보장받아야겠다는 보상 심리도 적잖다. 해가 바뀌면 연봉이 ‘따박따박’ 오르는 연공급제가 아니라 개인 성과에 따른 직무성과급제로 바뀌어야 모두 다 더 뛸 것이다.
기업 투자 위축의 부작용을 낳게 될 ‘주주 충실 의무’, 노조의 기만 살려줄 ‘노란봉투법’, 청년 취업의 장애물이 될 법적 정년 연장. 근로·투자 의욕, 생산성, 잠재성장률로 이어지는 경제 체력을 훼손시킬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대전제는 인센티브가 철철 넘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길을 갈 것인가, 독일의 길을 갈 것인가.

 1 month ago
11
1 month ago
11
![[부음] 김경웅(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씨 별세](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부고]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 조모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8/03/AKR20250803034800546_01_i_P4.jpg)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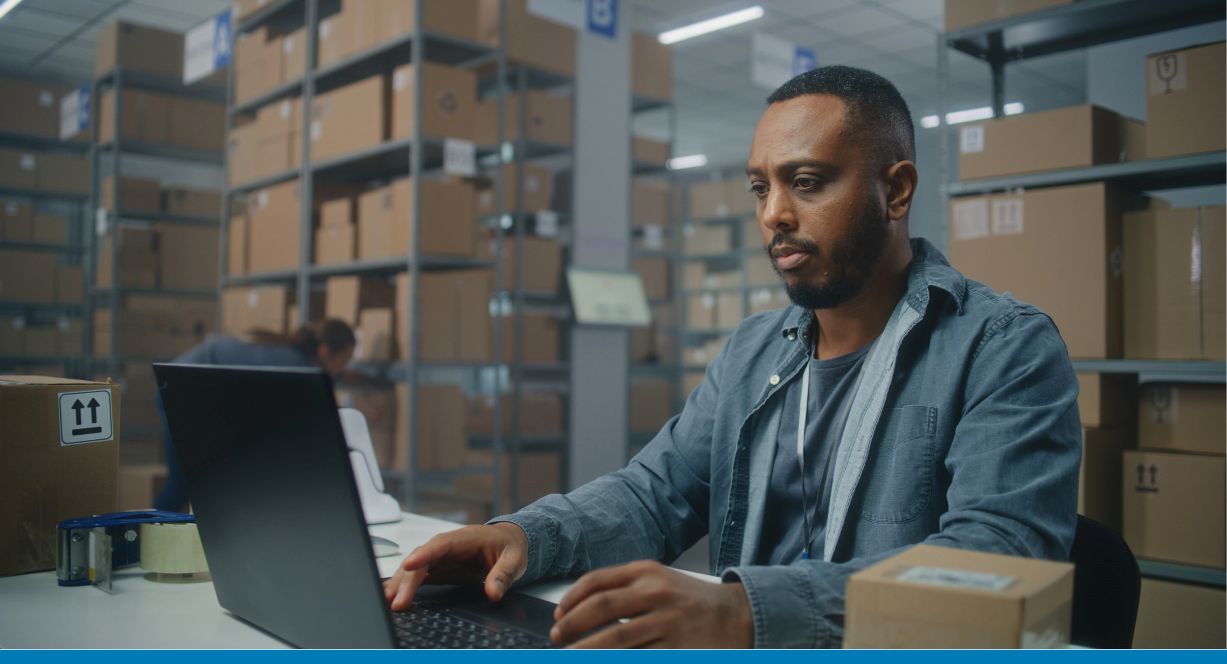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