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형제가 있어 더 따뜻한 삶](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9624396.1.jpg)
“둘째를 낳을까 말까.” 많은 부모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치솟는 주거비, 천문학적 교육비, 맞벌이의 피로, 불안정한 미래. 현실적 제약은 부모의 선택지를 점점 좁혀 외동아이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다. 하지만 과연 외동이 아이에게 최선일까?
부모는 외동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쏟는다. 장난감, 반려동물, 조기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등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워줘도 ‘형제자매’가 주는 삶의 정서적 기반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형제는 아이의 첫 공동체이자 함께 자라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평생의 동반자다.
필자도 첫째만 낳기로 결혼 전 아내와 다짐했지만, 이웃 가정의 외동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둘째를 낳았고 그 결정은 두 아이에게 축복으로 남았다. 이 나이가 돼 서넛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싶다.
형제는 아이에게 있어 첫 번째 타자(他者)다. 함께 웃고, 다투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과정은 공감, 인내, 갈등 조정, 책임감 같은 인간관계의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 부모가 아무리 헌신해도 혼자 자라는 아이는 자기중심적 세계에 머물기 쉽다. 형제는 아이를 ‘나’에서 ‘우리’로 이끄는 작은 사회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는 정서적 회복력도 크다. 인생의 고비에서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고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된다. 그 반대편에는 고립된 외동의 불안이 있다. 특히 부모와 절대적 관계로만 자란 아이는 상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마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출산율 반등에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설득은 사라졌다. 월 몇십만원 현금 지급이 아이 한 명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을까? 출산은 돈의 유인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믿음이고 공동체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대중문화가 조성하는 ‘아이 혐오’의 정서다.
아이는 축복이라는 메시지 대신 부부싸움, 육아 스트레스, 아동학대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소비된다. 아이는 점점 짐이 되고, 가족은 소모적 관계로 그려진다. 출산은 고통의 시작이며 육아는 희생의 연속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출산율 반등의 출발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인식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사회가 기뻐하고 아이 키우는 가족을 존중하고 부모가 외롭지 않은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단지 돈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었다. 다자녀가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사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의 본질이다.
또한 우리는 ‘아이 한 명이 전부인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는 경쟁력이 아니라 정서와 관계의 균형을 배운다. 부모도 한 아이에게 쏟는 과잉 기대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를 회복한다.
가족은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전 생애 공동체다. 유아기에는 정서적 안전망, 청소년기에는 가치 형성의 근거지, 성인이 돼서는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된다. 형제가 있는 가정은 아이의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함께 감싸는 평생의 울타리가 된다.
당신이 둘째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국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온도를 바꾸는 결정일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가족은 삶에서 행복의 근원이다.
형제가 있는 삶은 조금 더 시끄럽고, 더 피곤하지만 훨씬 더 따뜻하다

 10 hours ago
1
10 hours ago
1
![[사설]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대학 하나 만들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SPFUTJZGBVFH5HV37JTWPOD56E.jpg?auth=f55cd90b7c7b4e4926865d080440a6f101e5aaa441736a53dfda3d435394aed3&smart=true&width=3821&height=5000)
![[팔면봉] 이 대통령, 美 국무장관 방한 취소되자 위성락을 워싱턴 급파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안철수 혁신위‘ 국힘이 정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https://www.chosun.com/resizer/v2/2VXHXV4HLXRZDCLYNPM7S6XUPU.jpg?auth=a778ebec3f69e8ccc01714ad1b4b9a06c2324b6d8ec4a242381d757a2c4472a2&smart=true&width=3752&height=2477)
![[朝鮮칼럼] 국힘은 李 대통령 인사 보고 ‘윤석열 실패’ 연구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AZ6XFZO3IFDC3LSYXBMUKKEP2I.png?auth=044854116aedf9f2b58c5b207c49de0fc9dcf77947e6c84499375888abb85dad&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78] 옛 사진](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특파원 리포트] 네 번째 주불 대사를 기다리며](https://www.chosun.com/resizer/v2/W2734L2OWVBGBM3VEMQHRASRKA.png?auth=aac65ac3351ace55588236364ec672c869c21c9ee09e5fe9aa4cf6391124432e&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70] 아메리카당](https://www.chosun.com/resizer/v2/JV25CG5WKJE4BBOM2CU5N2TID4.jpg?auth=ef24254d08fc21f5b6106b94581a277fa2004e2c7b4e3b4569eb16ea808223af&smart=true&width=375&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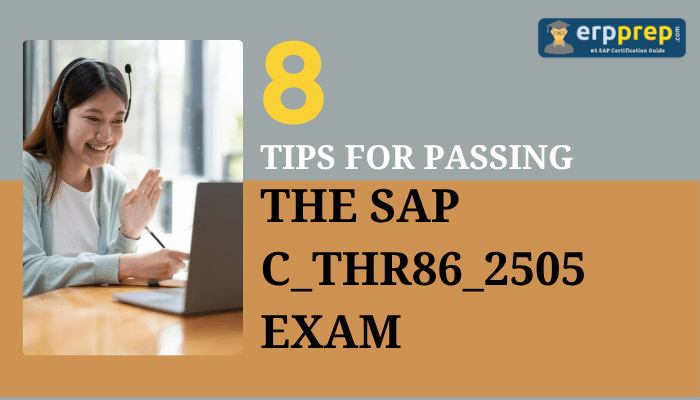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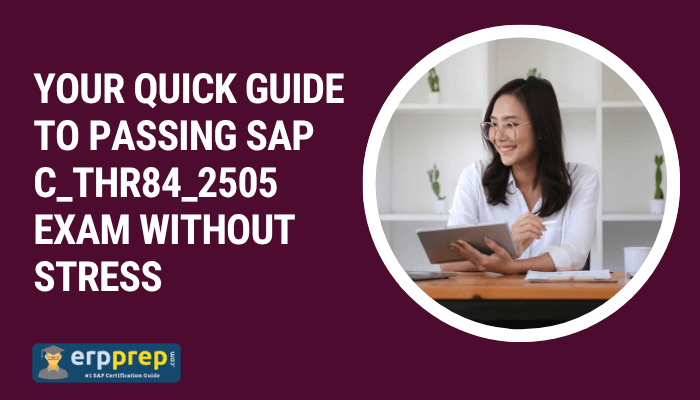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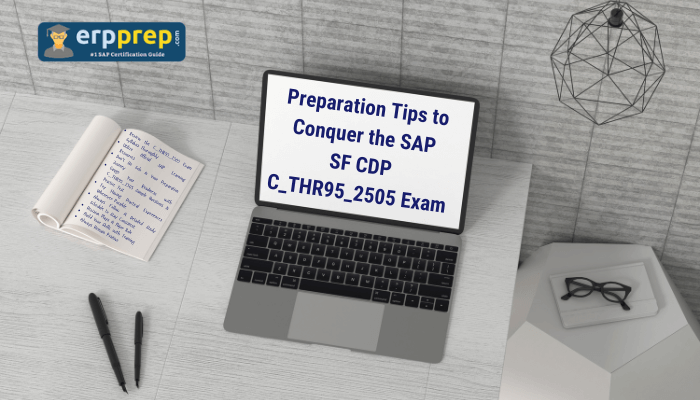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