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양발잡이 대통령을 기대하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4994511.1.jpg)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세 번째 회의가 인공지능(AI) 산업정책을 의제로 30일 열렸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처럼, AI는 신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이다. 대통령실에 AI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와 LG의 AI 전문가를 각각 수석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는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 노동이나 자본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이 효과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기술의 확산이 기업과 산업, 나아가 국가 생산성으로 전환되려면 인력 재배치가 원활해야 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는 노동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2024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경직돼 있다. 인력 조정과 직무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고, 재교육 체계도 체계적이지 않다면 기술 도입의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는 신호는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람 생명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물을 만큼 분명한 어조다. 그러나 대통령은 왼발만으로 국가를 이끌 수 없다. 산업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왼발이 있다면,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오른발도 함께 내디뎌야 한다. 산업계가 진정성 있는 동업자의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산업 전환기의 고통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양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는 이 균형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덴마크의 유연성(flexible)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가 대표적이다. 해고와 고용은 유연하게 하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가까이 끌어올려 고용 충격을 최소화했다. 네덜란드는 유연계약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방향의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설계다. AI 기술을 산업에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양발이 모두 작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직무 전환 지원과 재교육 투자 확대 등을 패키지로 설계하고, 정부가 이직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능동적 노동시장 정책(ALMP)을 강화해야 한다. IMF의 2025년 보고서 ‘Transforming the Futur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에서도 한국의 AI가 세계적 선도 수준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해야만 AI의 경제적 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AI는 분명히 미래다.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의 유연성과 사회의 포용성이 함께할 때 AI는 진짜 ‘먹거리’가 된다. 대통령이 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왼발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위한 단단한 오른발도 함께 내디디길 기대한다. 지금은 양발잡이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다.

 21 hours ago
1
21 hours ago
1
![[데스크라인]당뇨, 예방에도 투자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1/news-p.v1.20250731.5b072223b1b1413da41bf37e32e2c0a1_P1.jpg)
![[부음] 박희현(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시부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ET톡] 광주 'AI 선도도시' 흔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9/news-p.v1.20250729.025cc50e186c43fd8d5ac132236c2503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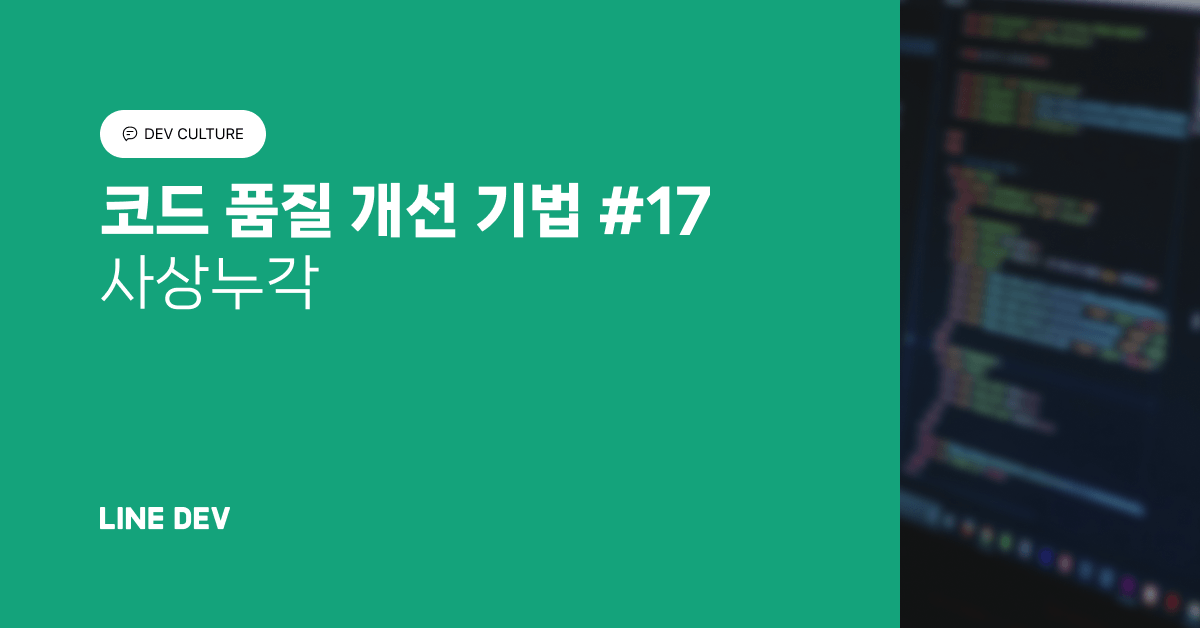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