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획본부장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획본부장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기업을 창업한 이들 나이는 대부분 놀라울 만큼 젊었다. 샘 알트먼(오픈AI), 젠슨 황(엔비디아), 데미스 허사비스(딥마인드) 모두 30세 안팎에 전 세계 기술 흐름을 바꿨다. 젊은 나이에도 창의성과 과감한 도전을 허용하고 이를 전폭 지원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역시 AI 3대 강국을 지향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일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신진연구자들은 최신 기술에 민감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 이들은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 전반에서 미래를 이끌 잠재력을 갖췄다. 미국은 'CAREER 프로그램'을 통해 조교수급 연구자에게 장기 연구비와 체계적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박사학위 취득 15년 내 연구자에게 독창적인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며 과감한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는 여전히 경력 중심 위계질서와 시니어 주도 구조가 견고하다. 연구비 배분, 과제 선정, 성과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신진연구자는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쉽게 꽃피지 못한다. 결국 신진연구자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혁신은 점점 멀어진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실패를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수반하며, 신진연구자에게는 빠르게 실패하고 학습하는 경험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지원이다. 원천기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특히 파괴적 혁신일수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성과 중심 연구 지원은 진정한 혁신을 가로막는다.
셋째, 융합형 연구 환경이다. 신진연구자들은 자기 분야 이해는 높지만 타 분야 경험은 부족하다. AI 시대에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산업 연계가 모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물리·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연구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주역 신진연구사업'은 의미 있는 실험이자,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이 사업은 단순 연구비 지원을 넘어 멘토링, 교육, 자율성 보장 등 신진연구자 성장을 위한 종합적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기존 하향식(톱다운) 구조를 넘어서는 혁신적 접근이다.
실제로 확장형 인공신체 체화를 위한 신경가소성 기반 제어 인터페이스, 양자 광집적회로 구현을 위한 실리콘 스핀-컬러센터 제어 플랫폼 등 선정 과제들을 보면, 단순 기술 개선을 넘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전정신이 돋보인다. 기존 기술 연장선이 아닌, 미래 산업 기반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연구자 주도형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계하며,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는 창의성·자율성을 핵심 철학으로 삼는 진정한 신진연구자 육성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AI·양자·첨단바이오 등에서 기술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 기술들은 머지않아 산업·사회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육성하는 신진연구자는 10년 후 대한민국 기술 미래를 이끌 중견 연구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기관들이 더 과감하게, 더 체계적으로 신진연구자 육성에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앞에 AI 3대 강국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획본부장 hwlee@etri.re.kr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1 month ago
8
1 month ago
8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부고] 김형우(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614365769233_1.jpg)
![[광화문] 쳇바퀴 도는 'K-자율주행'](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1373663582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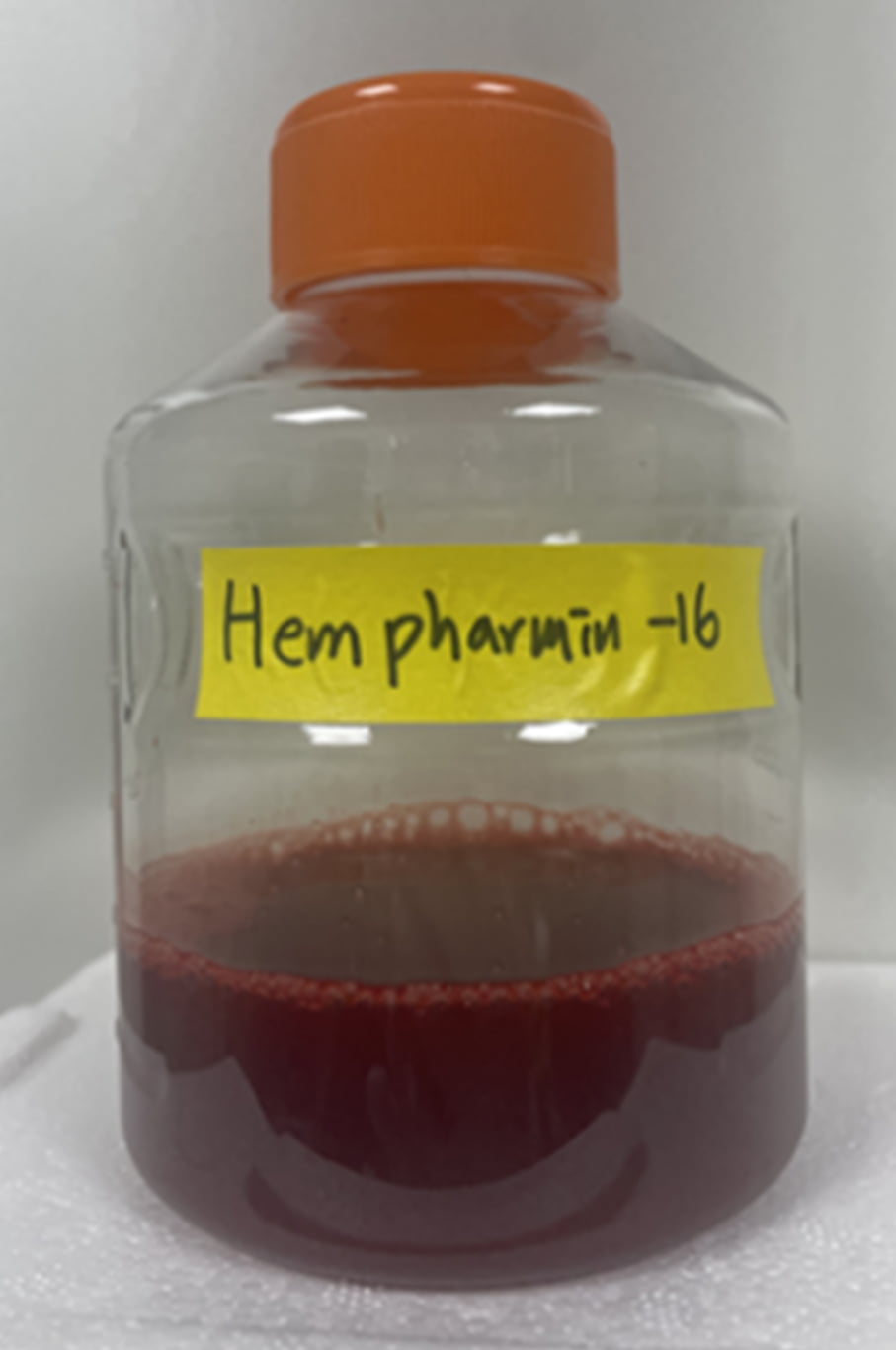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