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한경 단독 보도다(7월 1일자 A1, 3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인당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번 조치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주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인다.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다. 강남권 등에서는 10억~20억원 이주비가 일반적인데, 이를 6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정상적인 이주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철거,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주비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2017년 8·2 대책에서 이주비를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제한했다. 당시에도 집값의 60~70%까지 대출되던 이주비가 절반 이하로 줄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번 6·27 대책은 ‘규제 끝판왕’으로 불린 8·2 대책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이주비 봉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존 수준의 이주비를 유지하려면 강남권에선 수조원이 필요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은 한남2구역, 개포주공6·7단지 등 53곳, 총 4만83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이 지연되면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서울의 공급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서울의 핵심 공급원인 정비사업을 막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주비 규제의 탄력적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일률적인 대출 제한 대신 주택 가격, 지역 여건, 사업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1 month ago
5
1 month ago
5
![[부음] 김경웅(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씨 별세](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부고]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 조모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8/03/AKR20250803034800546_01_i_P4.jpg)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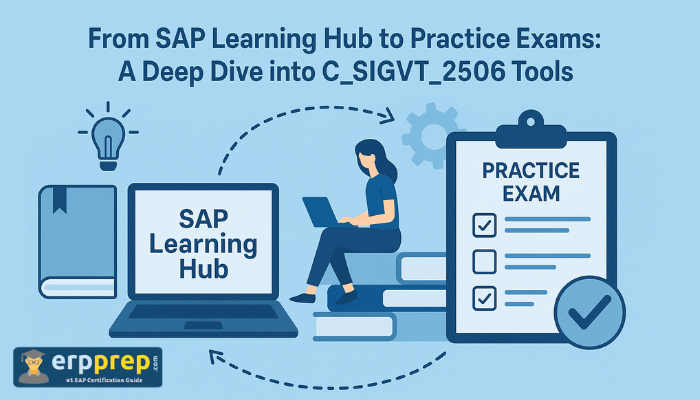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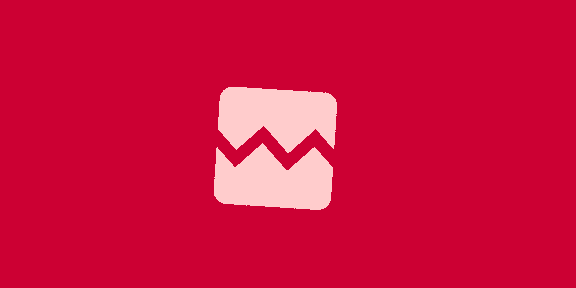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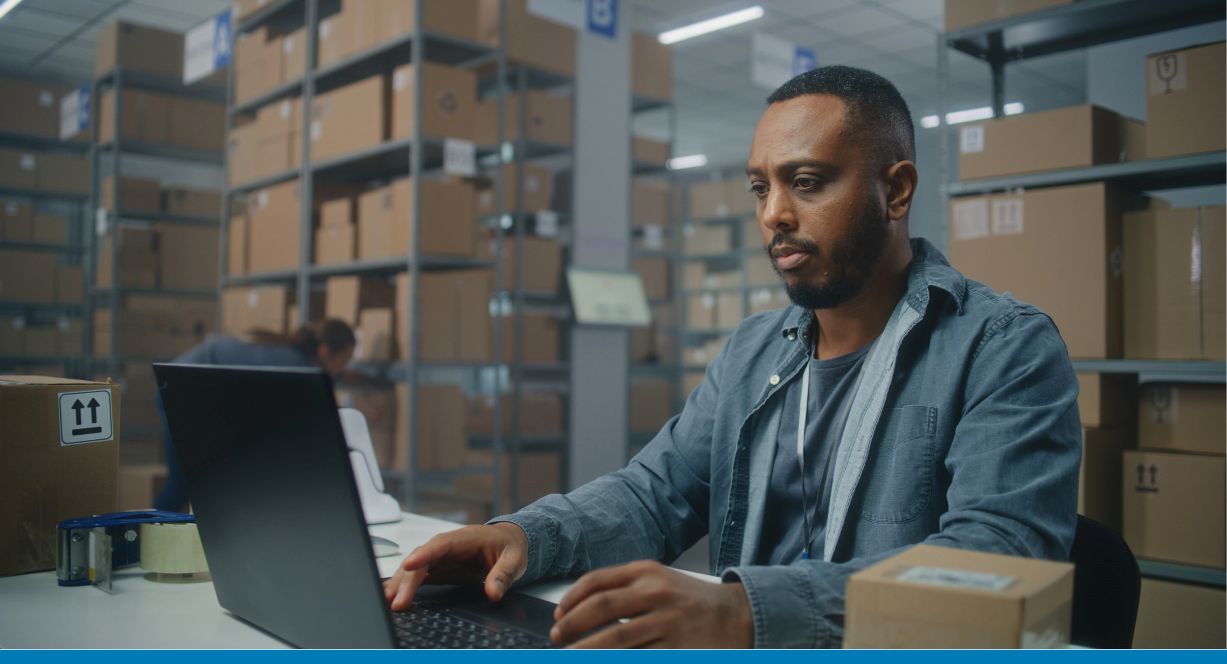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