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백화점 출점 때 유통기업이 지역 상권에 내는 상생자금을 상인회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빼먹는 비리가 허다하다는 한경 보도다. 상생자금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대형 점포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금 출연 관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12년 이후 생겨났다. 점포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인들의 정서를 의식해 압박하니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 10여 년 전 개장한 타임빌라스 수원점은 수십 개에 달하는 지역 상인회에 5년간 총 180억원을 줬고, 작년 초 개점한 스타필드 수원점도 2027년까지 110억원을 내야 한다.
상생자금은 시장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등에 쓰이는 게 정석이지만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상인회가 아무런 감시 감독 없이 빼먹는 일이 다반사다.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형 매장이 개점하는 곳마다 비리와 지역 상인들 간 분쟁 소식이 끊임없다.
유통산업 선진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앞세워 입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부작용과 폐해는 누누이 지적돼 왔다. 대형 매장과 중소 매장의 공존을 위한다며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공생은커녕 공멸에 가깝다. 쿠팡 배민 특혜법이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저가 플랫폼 지원법으로 작동 중인 모양새다. 규제를 비켜 간 코스트코, 이케아 같은 외국 대형사와 다이소, 식자재마트 같은 틈새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 논란도 거세다.
‘대형마트를 눌러야 골목상권이 산다’는 일차원적 생각은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지역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여타 상권보다 3.1% 높다는 분석(산업연구원)도 나와 있다. 그래도 국회는 더 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대형마트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더 센 규제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유통산업을 후퇴시키고 비리를 양산하는 법안은 강화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하다.

 4 weeks ago
9
4 weeks ago
9
![[5분 칼럼]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IHEARY4MWFN5JDXS5YMFRZBREA.jpg?auth=521605aac0288a64a48c04d473b274c06bec7a9fe97fd37393a6514b6f4f5368&smart=true&width=500&height=241)
![한우, 식탁을 넘어 삶과 환경을 잇다[기고]](http://thumb.mt.co.kr/21/2025/09/2025090117551124167_1.jpg)
![[광화문]한국어의 세계화](http://thumb.mt.co.kr/21/2025/09/2025090313090437222_1.jpg)
![[기고]약으로 배 채우는 노인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기고]화재·폭발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를](https://thumb.mt.co.kr/21/2025/09/2025090310423694592_1.jpg)
![[기자수첩]'모험자본 공급' 임무의 의미](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2915540334256_1.jpg)
![[투데이 窓]AI에 경계·저항해야 하는 이유](http://thumb.mt.co.kr/21/2025/09/2025090216071136633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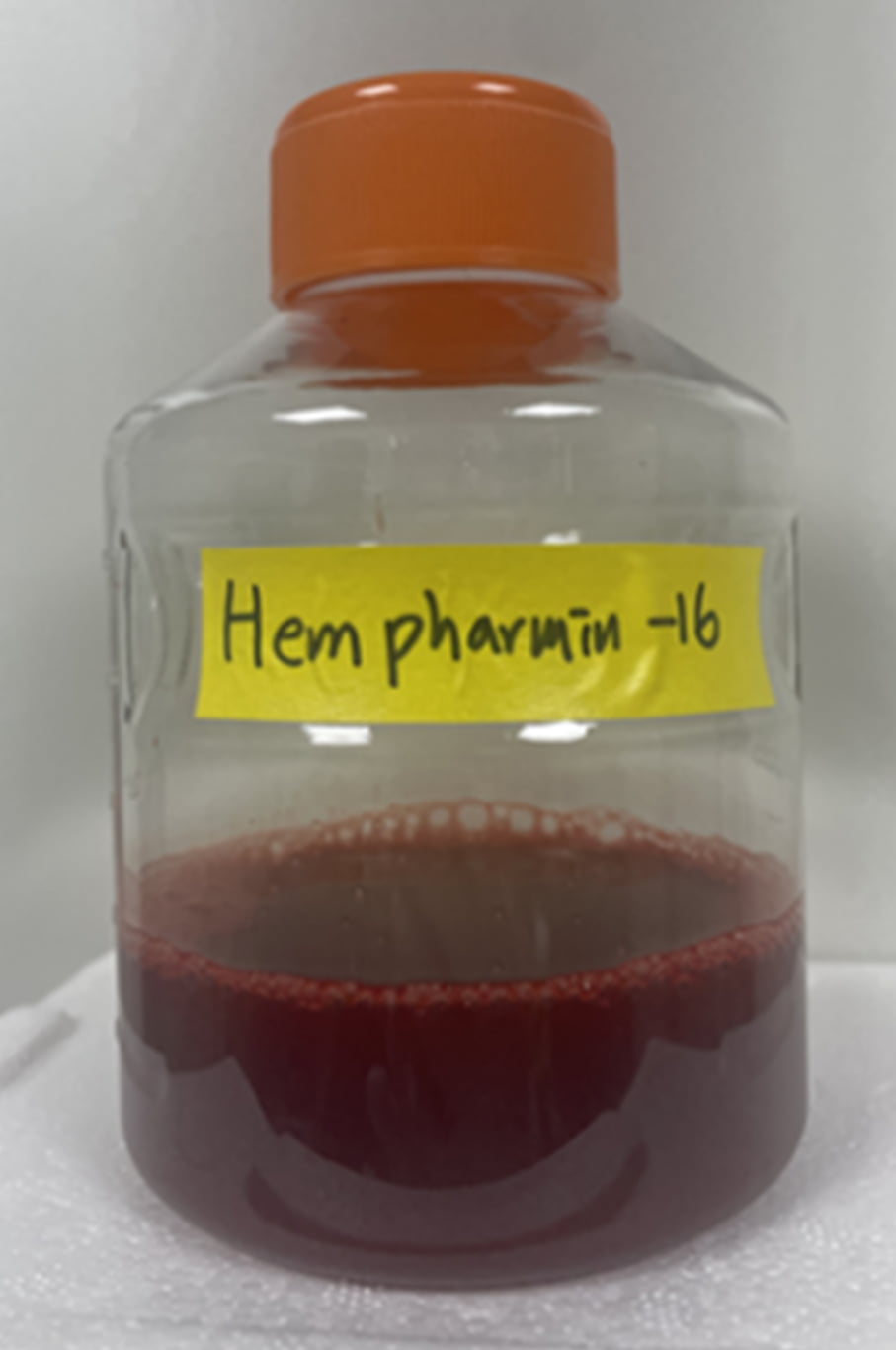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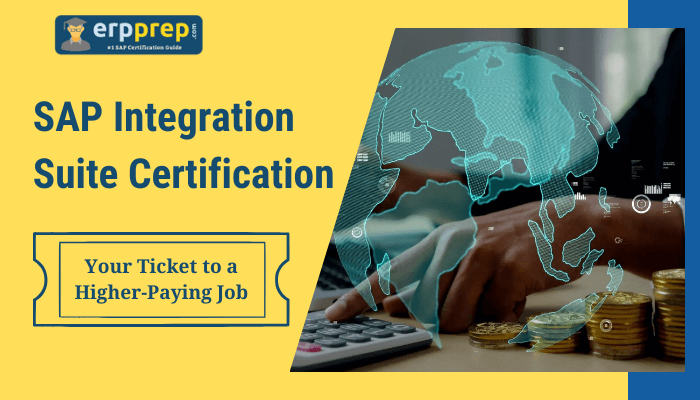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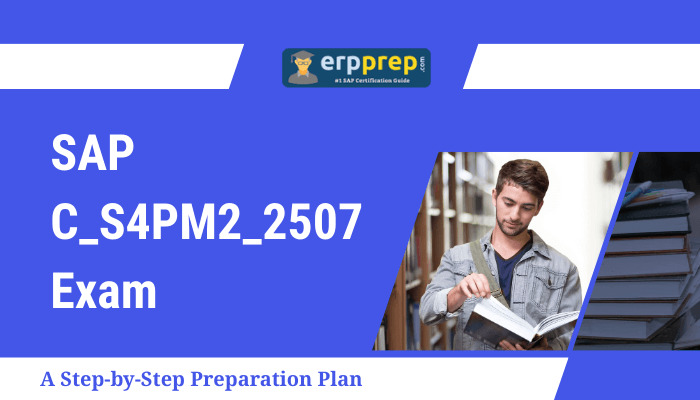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