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코드의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확대하는 것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산재 사고가 많은 기업 경영자는 기관투자가의 반대로 연임이나 의사결정을 제약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를 ESG 등급에 반영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입찰 제한 기준이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한 이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후진적인 산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산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이라는 불명확한 공공입찰 규정은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를 배제해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재는 민간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제 경북 청도에서는 열차 사고로 코레일과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2020년부터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 사망자가 155명에 달한다. 같은 논리라면 공공기관 수장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산재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에서는 1860여 명의 사상자가 발행해 법 시행 첫해보다 오히려 12% 늘었다. 처벌 강화만으로 산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 구조상 건설·제조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제재만 앞세운다면 기업 부담만 키우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다.

 18 hours ago
3
18 hours ago
3
![[이런말저런글] 어떻냬는 어떻냐고 해, 말 줄임의 감각](https://img8.yna.co.kr/etc/inner/KR/2025/08/20/AKR20250820056400546_01_i_P4.jpg)
![[광화문]새로운 세계 질서 '힘의 논리' 그 끝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1908341756302_1.jpg)
![[우보세] 전공의 돌아와도 전공의 없는 '당직'](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014534430903_1.jpg)
![''우리말''과 ''한국어'' 사이[정덕현의 끄덕끄덕]](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 [기자수첩]](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009124256727_1.jpg)
![[기고] 온플법, 통상마찰 넘을 해법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1815173288246_1.jpg)
![[MT시평]옆집 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1318255917288_1.jpg)
![[투데이 窓]쇠녹가루, 아연이 희귀금속으로 변신 중](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006224193902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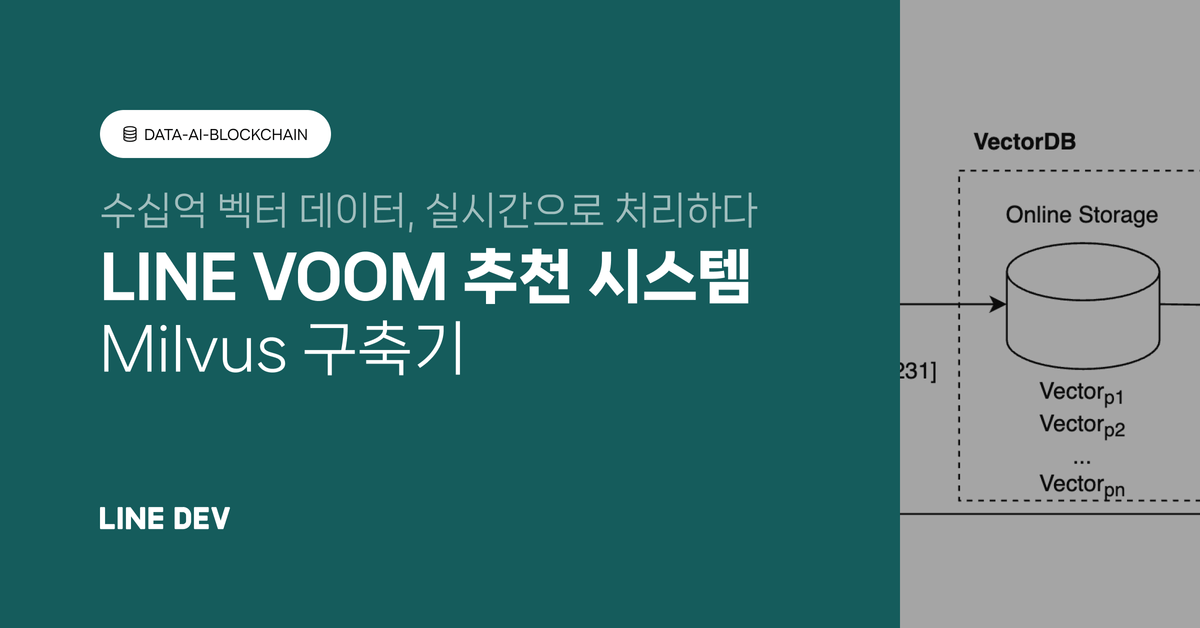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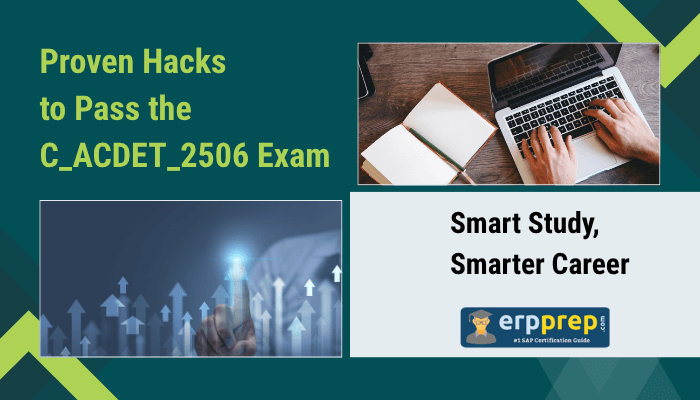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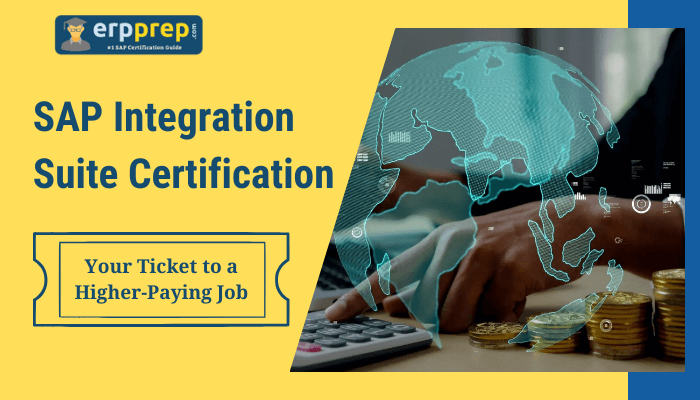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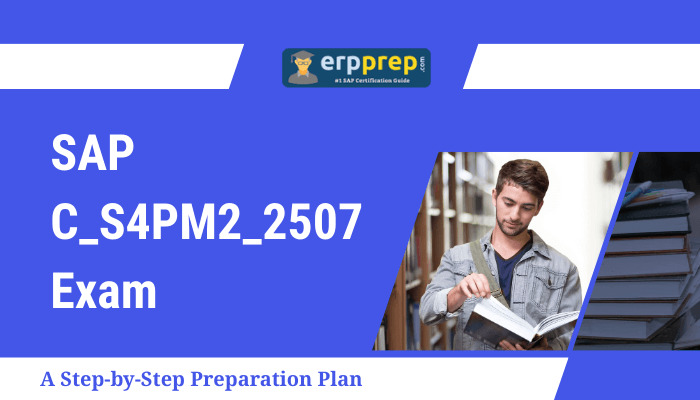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