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관세 정책을 급선회했다.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물론 마냥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는 그간 미국과의 무역 때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50배나 높은 10%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된 25%의 품목 관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대선을 53일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까지 협상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경기 중 작전타임을 갖게 된 격이다. 이 기간에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긍정적인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통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대미 투자 등을 엮은 패키지 딜과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은 3개월간 협상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관세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변화에 비춰볼 때 자국의 이익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국가별로 상당한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이다. 게다가 우리는 대통령 궐위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특수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협상을 매듭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시나리오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집결하는 ‘팀 코리아’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말처럼 “줄의 선두에 서 있다”고 한 일본의 대미 협상 추이를 파악하는 데도 정보력을 집중해야 한다.

 1 week ago
1
1 week ago
1
![[인사] 국립중앙의료원](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인&아웃] 美中 기술패권 전쟁](https://r.yna.co.kr/global/home/v01/img/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v=20230824_1025)
![[기고]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중장년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707044029711_1.jpg)
![[기자수첩]대선이 다가오니](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611085935901_1.jpg)
![[MT시평]1인 기획사, 왜 과세상 논란인가?](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4534248905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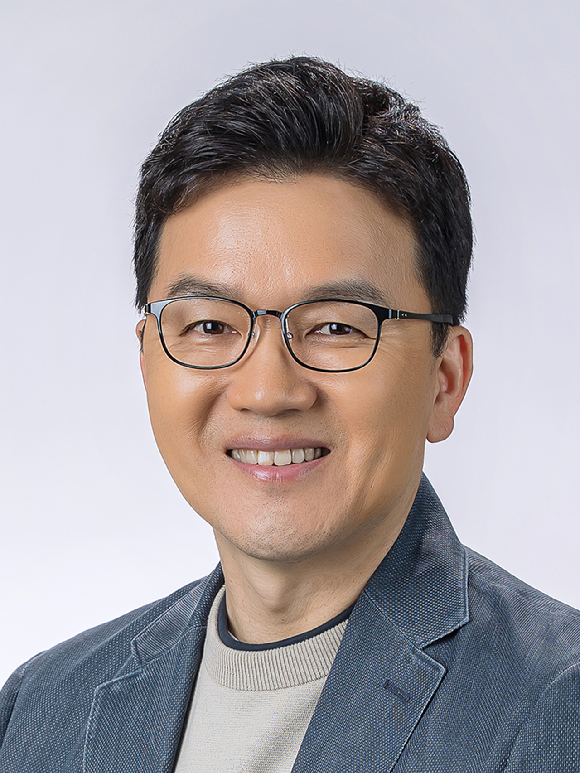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