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8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1차 시장과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2차 시장 간 간극이 지나치게 큰 게 문제다. 2차 시장 근로자는 1차 시장 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하다.
정부는 2차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동일한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원청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동일가치 노동인지를 측정하는 자체가 어려워 원칙을 강제하면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숙련도가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만 줄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앞으로 3년 내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엔 최저임금, 퇴직금 등은 적용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 및 휴일 수당, 유급 휴가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장에도 대기업과 같은 근로기준 잣대를 의무화하면 인건비 상승은 피할 수 없고 이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개혁의 출발선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노동 개혁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일단 입사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호봉제로 인해 매년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체계를 연공급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1 month ago
7
1 month ago
7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부고] 김형우(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614365769233_1.jpg)
![[광화문] 쳇바퀴 도는 'K-자율주행'](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1373663582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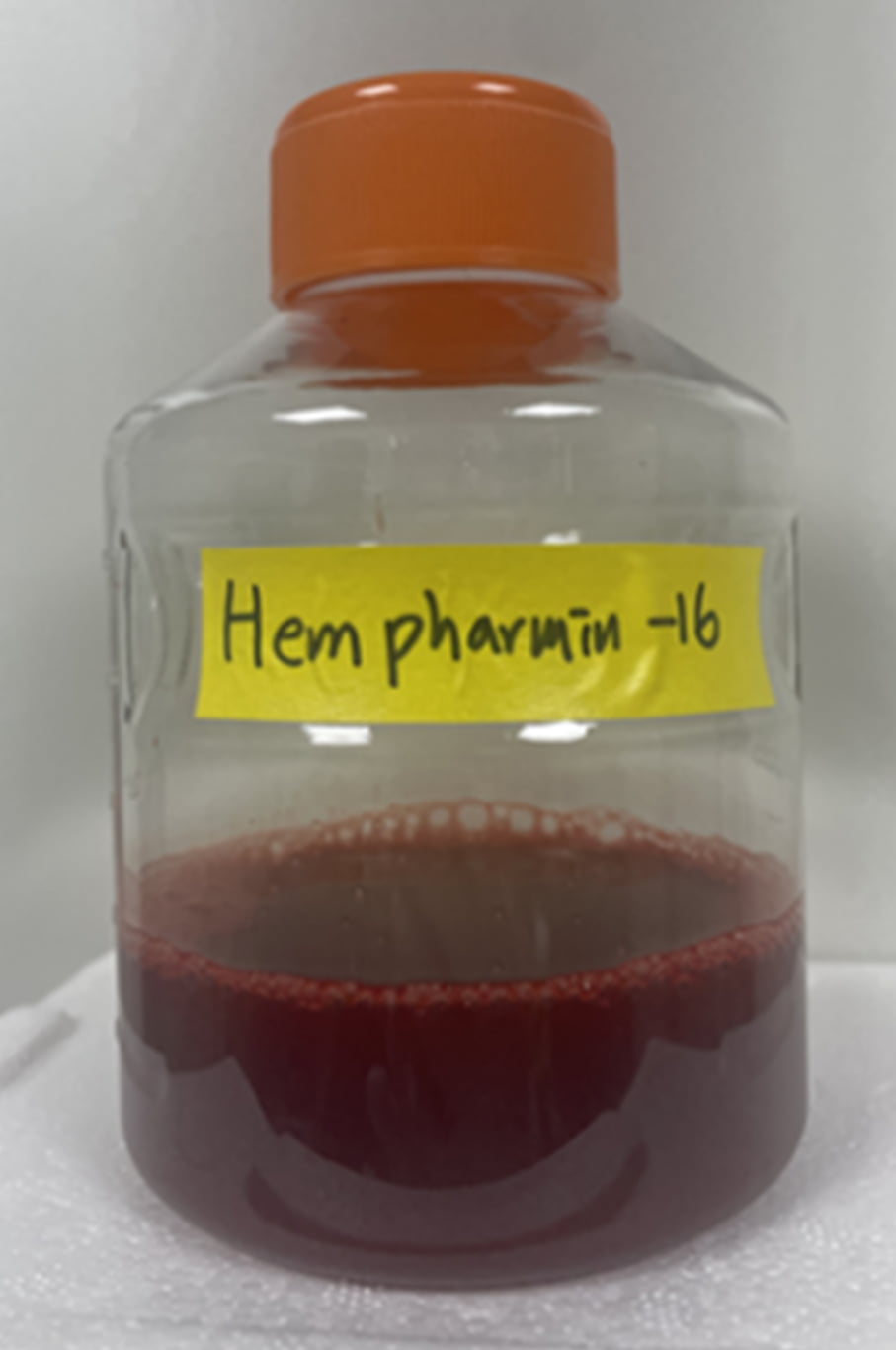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