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이 성과를 내려면 사업 전반에 걸쳐 혁신·도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나눠먹기식 연구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 과제를 제대로 평가해 늘려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는 국가R&D 투자가 늘고 있지만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국가R&D 투자 대비 성과는 참담하다. 예산 규모는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조8000억원,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늘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2023년 기준 OECD 발표)다. 하지만 국가R&D를 통해 미국·일본·유럽에 모두 출원한 삼극특허 비율은 전체 출원 건수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가 드물다는 의미다. 우수 논문 지표로 쓰이는 HCR(상위 1% 고인용 논문 연구자)의 국가별 순위도 17위에 머물렀다. 국가R&D 투자 규모가 작은 호주(5위)와 싱가포르(13위)에도 뒤졌다.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해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놀라울 만큼 성과가 적다”는, 우리로선 무척 낯 뜨거운 기사를 실었다. 다양성 미흡과 폐쇄적인 문화, 정부 규제와 연구 연속성 부족, 기업과 대학 간 선순환 고리 취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목표 수준을 낮게 잡아 연구 성공률을 높이는 관행이 퍼진 것도 사실이다.
미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R&D 역할이 중요하다. 떨어지고 있는 성장동력을 견인하려면 기업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첨단 기술 과제를 국가R&D 사업이 맡아 성과를 내는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R&D 현장의 의욕을 북돋아 혁신·도전성을 갖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과제 선정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month ago
10
1 month ago
10
![[기자수첩] 갤러그하는 대통령](http://thumb.mt.co.kr/21/2025/06/2025061309372057401_1.jpg)
![[팔면봉]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 징역 7년 8개월 확정된 이화영, 사면·복권 공개 주장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만델라의 녹색 유니폼처럼… 공동체 상처 치유하는 리더가 필요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BKBMWTY6VCGBGTMIWXBMUXERU.png?auth=2cd6ff90ea903056465a1fe0bdad9bdbfa6890b3fb18bd3b4250a362c3997da2&smart=true&width=500&height=500)
![[조용헌 살롱] [1497] 고성 화진포(花津浦)](https://www.chosun.com/resizer/v2/B7FJ6EYGEJDANM4AZSIJ2H7WKM.png?auth=6636bf691c88dacb12fa4ad1d7312b92733dee5192a0d28818de135e45d86208&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75] 그러거나 말거나](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67] 하와이](https://www.chosun.com/resizer/v2/5XHK7PZ56NHTTKH7COJFQ4M54Q.png?auth=664876bab5cee8d9c73896a7d01b64f27386130e62bef9ae4289fdb3837c803b&smart=true&width=500&height=500)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https://www.chosun.com/resizer/v2/ABRPIUOKSVRGYU6PLWJJU5Y6FA.jpg?auth=dd2a6ef93fef1179d6acc4779b24cdf130d1914736b569800b9022008ae9748f&smart=true&width=2200&height=1467)

![[천자칼럼] 소리 없이 강한 韓 기업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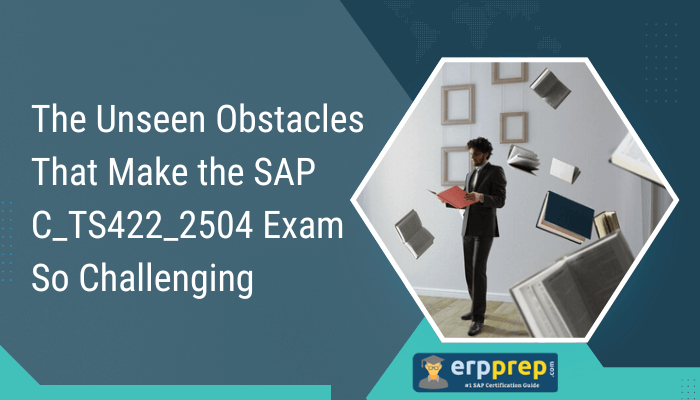

![[포토] 트리플에스 설린, '눈 뗄 수 없는 예쁨'](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3.40571444.1.jpg)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데이터 시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1c6020f803074b48885e5e159213de62_Z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