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항의 소소한 통찰] '마스가(MASGA)' 효과와 브랜드 성공 공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35978665.1.jpg)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일단락됐다.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며 빨간 모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카메라로 잡아달라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정부 인사로서 아주 이례적인 요구였다. 그 모자에는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정권의 구호이자 브랜드가 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에 조선의 ‘shipbuilding’을 살짝 첨가했다. 마가의 강력함에 착안해 마스가가 나왔고, 미국 측 인사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공감케 하는 효과가 있었다.
마가는 1981년부터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이후 공화당과 보수층에 불멸의 영웅처럼 자리잡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원조다. 1980년 레이건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며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이란 선거구호를 들고나왔다. 레이건에 뿌리를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가’는 브랜드 성공 공식을 아주 잘 따른 것이다.
성공 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익숙한 것’에 기반을 뒀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는 부정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거부부터 한다. ‘마가’는 레이건이 사용한 구호로 공화당 지지층에는 익숙했다.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진부하게 볼 수 있다. 예전 익숙한 것에 살짝 변형을 가하는 게 두 번째 성공 요인이었다. 확 줄여 압축의 미(美)를 발휘했다. 발음이 훨씬 쉽고, 집단이 구호로 외치는 맛이 있었다. 모자를 비롯해 티셔츠, 머그잔 등의 굿즈 상품들이 나왔다. 외침 이상의 시각 노출이 세 번째 포인트였다. 마스가는 한국이 트럼프 정권에 발맞추려 노력하고, 함께한다는 의지를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표현했다.
협상에서 누군가가 “관세가 15%로 귀결되는 데 마스가가 미친 영향은 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기업에서는 특정 상품을 구입한 이유로 가격이 30%, 품질이 20%, 기업을 신뢰해서가 10% 식으로 숫자로 말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숫자로 마스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에 직간접으로 참석한 미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해야 할 텐데 가능하겠는가.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몇%가 마스가 몫이라고 뽑아내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
기업에서는 매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마스가를 두고는 “마스가 모자를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숫자로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
역사 유산에 기초해 현재에 맞게 변형한 카피를 포함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선보이려고 노력하라. 이는 정부, 기업 등 여러 곳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실행하기 전에 예측 지표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짓은 하지 말자. 정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억지로 숫자로 만들려고 힘을 빼지도 말자.

 1 month ago
9
1 month ago
9
![시대의 얼굴[정덕현의 끄덕끄덕]](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614365769233_1.jpg)
![[광화문] 쳇바퀴 도는 'K-자율주행'](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1373663582_1.jpg)
![[우보세]한화 이글스와 코스피 랠리의 공통점](https://thumb.mt.co.kr/21/2025/09/2025091714545014769_1.jpg)
![[기고]통상의 바다에서](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3581229102_1.jpg)
![[투데이 窓]늙어도 늙지 못하는 우리의 초상](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618022187220_1.jpg)
![[MT시평]지방세법상 본점의 의미](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416180824082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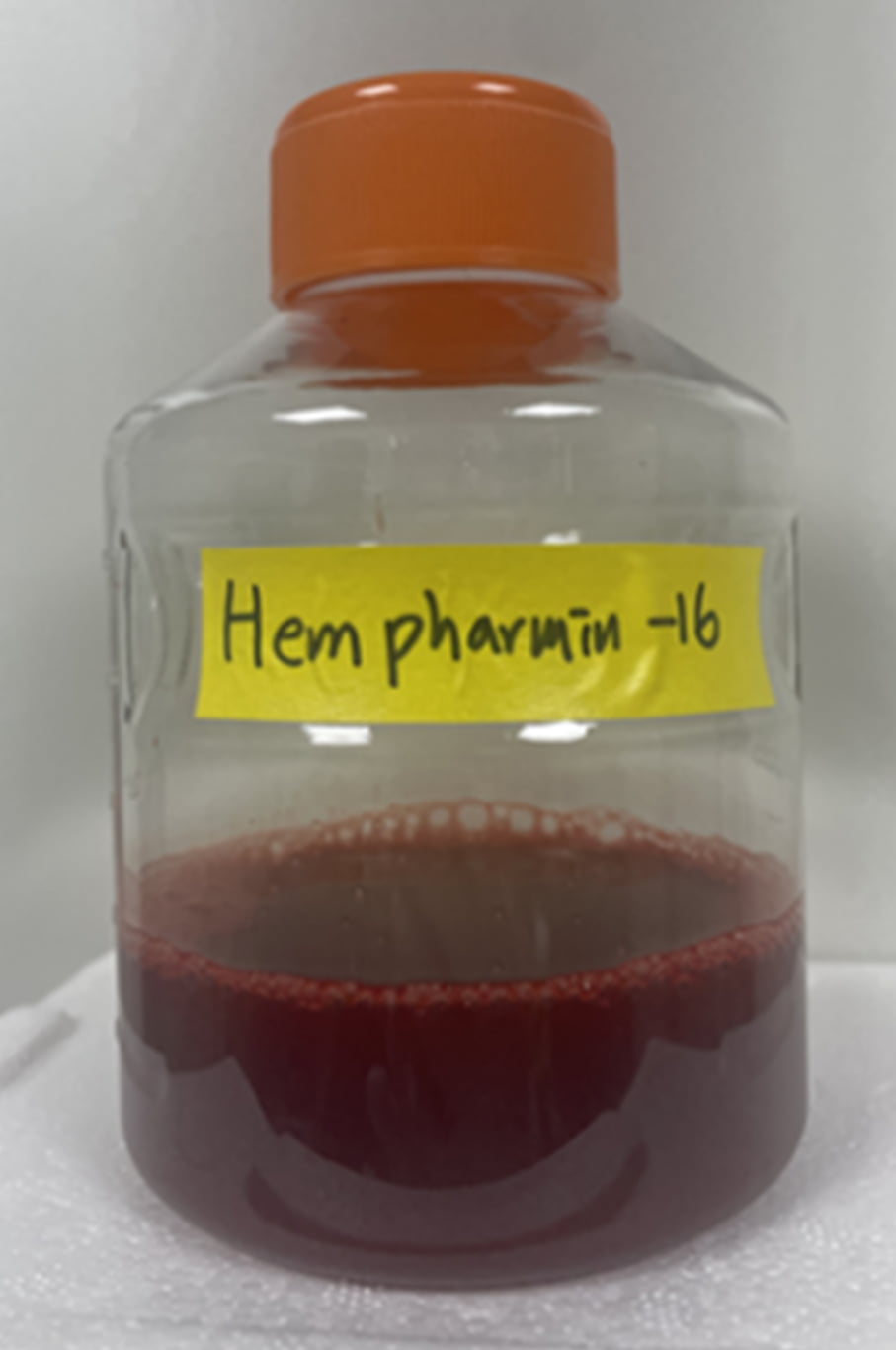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