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중복상장 묘수를 찾아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37246112.1.jpg)
한국 증시는 중복 상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유망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를 거듭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일궈냈다. 21세기에는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한국식 지주회사 체제가 유행해 모회사·자회사 중복 상장을 양산했다.
과거엔 중복 상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여겼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의 호재로 인식되는 일도 많았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다간 자칫 짱돌을 맞는다. 중복 상장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고질적 병폐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희생을 감내하던 소액주주들은 들고일어나고 있다. 중복 상장을 둘러싼 현실과 이상이 뒤엉키고 있다.
무차별 자회사 상장 차단
중복 상장을 놓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모회사 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배력 훼손 없이 외부 자금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모회사 소액주주는 유망한 비상장 자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한다. 무엇보다 모회사와 자회사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더블카운팅)되는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
중복 상장이 한국에서만 과하게 많은 게 사실이다. IBK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상장사의 타 상장사 지분 가치를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은 18.4%(작년 11월 기준)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중복 상장의 불편한 진실은 2022년 불거졌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잇따른 상장으로 카카오 주주들도 분노했다.
요즘 중복 상장 논란은 과거와 달리 ‘쪼개기 상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적분할이 아니라 인수합병(M&A) 기업이나 신설 법인을 상장하는 사례도 무차별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순식간에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처럼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국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은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 자회사로 거느린다. 자금이 필요하면 모회사 증자로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인적분할을 통한 수평적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돼도 복수 의결권 등을 통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지만 한국에선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도 감당해야 한다.
한국 증시 밸류업 과정에서 중복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갑자기 미국처럼 될 수는 없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모두 다른 만큼 중복 상장을 획일적 기준으로 막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가 모·자회사의 사업 중복, 더블카운팅 수준 등을 따진 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기업도 주주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복 상장 혼선이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1 month ago
12
1 month ago
12
![[팔면봉]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 징역 7년 8개월 확정된 이화영, 사면·복권 공개 주장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만델라의 녹색 유니폼처럼… 공동체 상처 치유하는 리더가 필요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BKBMWTY6VCGBGTMIWXBMUXERU.png?auth=2cd6ff90ea903056465a1fe0bdad9bdbfa6890b3fb18bd3b4250a362c3997da2&smart=true&width=500&height=500)
![[조용헌 살롱] [1497] 고성 화진포(花津浦)](https://www.chosun.com/resizer/v2/B7FJ6EYGEJDANM4AZSIJ2H7WKM.png?auth=6636bf691c88dacb12fa4ad1d7312b92733dee5192a0d28818de135e45d86208&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75] 그러거나 말거나](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67] 하와이](https://www.chosun.com/resizer/v2/5XHK7PZ56NHTTKH7COJFQ4M54Q.png?auth=664876bab5cee8d9c73896a7d01b64f27386130e62bef9ae4289fdb3837c803b&smart=true&width=500&height=500)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https://www.chosun.com/resizer/v2/ABRPIUOKSVRGYU6PLWJJU5Y6FA.jpg?auth=dd2a6ef93fef1179d6acc4779b24cdf130d1914736b569800b9022008ae9748f&smart=true&width=2200&height=1467)
![[사설] “사면 요구” 이화영, 정권에 청구서 내미는 듯](https://www.chosun.com/resizer/v2/PE4J5SR54FHKBIIE7GCUSS3NBE.jpg?auth=f8e1bd383636122b0253dcca1ab61ce59749cd95938e1e6b17a08c8944a22651&smart=true&width=1106&height=622)

![[천자칼럼] 소리 없이 강한 韓 기업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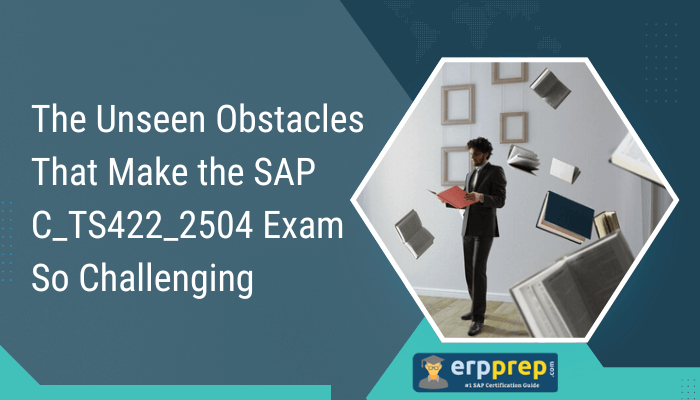

![[포토] 트리플에스 설린, '눈 뗄 수 없는 예쁨'](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3.40571444.1.jpg)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데이터 시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1c6020f803074b48885e5e159213de62_Z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