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K뷰티서 배우는 바이오 육성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2801025.1.jpg)
국내에 화장품법이 도입된 건 불과 25년 전이다. 이전에 화장품산업은 줄곧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적용 대상이었다. 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다.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종·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허가를 일일이 얻어야 했다.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면서 국내 화장품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기업 자율에 맡긴 화장품 산업
2000년 시행된 화장품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자율 책임’이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종·품목별 허가제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의 원료를 사용해 자율적으로 화장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아모레퍼시픽이 세계 처음으로 쿠션팩트를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화장품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또 한 번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식약처가 허가하는 원료만 사용할 수 있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는 원료만 빼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브랜드숍이 등장하며 화장품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12년 첫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흑자폭을 키웠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55억달러(약 7조5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 미국에 이어 수출액 세계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미국을 넘어서며 2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뷰티’는 이제 글로벌 유행어가 됐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화장품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일궜다”고 자평했다.
바이오도 규제 사슬 풀어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규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하며 일일이 허가받아야 한다. 심지어 의약품 가격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는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달 신약 임상시험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같은 달 혁신 치료제에 대해 기존 10~12개월 걸리던 승인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 제약·바이오는 올해 상반기에만 기술수출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중국에도 뒤처진 지 오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약·바이오에서 우선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예컨대 생명윤리법상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만 허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일부 금지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신약 임상시험 절차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
규제의 사슬만 풀어준다면 국내 제약·바이오도 화장품처럼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K뷰티의 영광을 K바이오에서 재현할 때다

 10 hours ago
1
10 hours ago
1
![[사설]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대학 하나 만들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SPFUTJZGBVFH5HV37JTWPOD56E.jpg?auth=f55cd90b7c7b4e4926865d080440a6f101e5aaa441736a53dfda3d435394aed3&smart=true&width=3821&height=5000)
![[팔면봉] 이 대통령, 美 국무장관 방한 취소되자 위성락을 워싱턴 급파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안철수 혁신위‘ 국힘이 정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https://www.chosun.com/resizer/v2/2VXHXV4HLXRZDCLYNPM7S6XUPU.jpg?auth=a778ebec3f69e8ccc01714ad1b4b9a06c2324b6d8ec4a242381d757a2c4472a2&smart=true&width=3752&height=2477)
![[朝鮮칼럼] 국힘은 李 대통령 인사 보고 ‘윤석열 실패’ 연구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AZ6XFZO3IFDC3LSYXBMUKKEP2I.png?auth=044854116aedf9f2b58c5b207c49de0fc9dcf77947e6c84499375888abb85dad&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78] 옛 사진](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특파원 리포트] 네 번째 주불 대사를 기다리며](https://www.chosun.com/resizer/v2/W2734L2OWVBGBM3VEMQHRASRKA.png?auth=aac65ac3351ace55588236364ec672c869c21c9ee09e5fe9aa4cf6391124432e&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70] 아메리카당](https://www.chosun.com/resizer/v2/JV25CG5WKJE4BBOM2CU5N2TID4.jpg?auth=ef24254d08fc21f5b6106b94581a277fa2004e2c7b4e3b4569eb16ea808223af&smart=true&width=375&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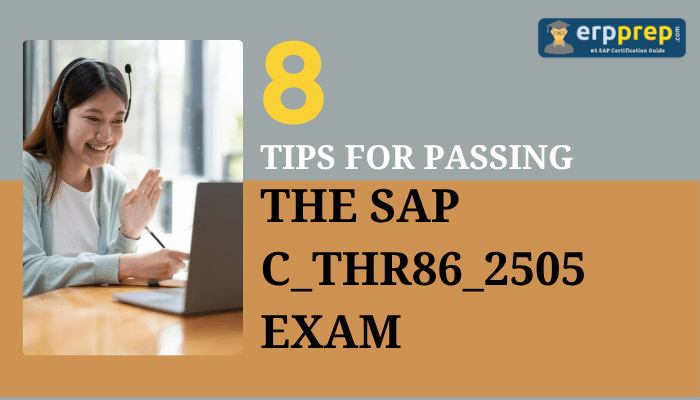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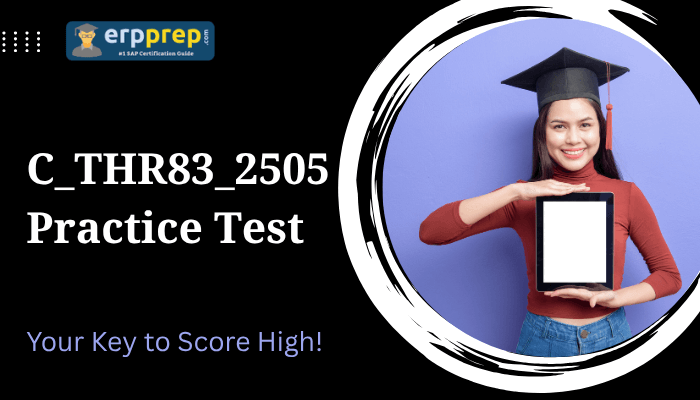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