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전장의 승부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팔란티어등 다양한 AI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AI 조직 체계는 과연 적절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AI센터를 설립했지만, 이것만으로 AI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에 역부족이다. 미국이 구축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AI 조직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최고디지털·인공지능책임자실(CDAO)을 설립해 국방부 전체의 AI 역량을 통합 조율하고 있다. CDAO는 국방부장관 직속 기관으로서 600개가 넘는 AI 프로젝트를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로 관리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CDAO는 각 군과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AI 개발로 인한 중복 투자와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검증된 AI 기술을 전군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첫째는 검증된 AI 기술을 전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확산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AI 개발과 도입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셋째는 AI 사용 원칙과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Jupiter라는 AI 개발 공통 플랫폼과 Advana라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국방부 전체가 함께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 빠른 구매 제도를 통해 AI 기술을 부대 현장에 적용하는 속도를 크게 높였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적보다 먼저 미래를 발명한다'는 철학으로 10~15년 후 미래 전장을 지배할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의 딥러닝을 뛰어넘는 3세대 AI와 설명 가능한 AI(XAI) 개발에 집중하며, 20억달러 규모의 AI Next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AI 혁신을 이끌고 있다. DARPA의 6개 기술 사무소는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AI를 응용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보혁신사무소(I2O)가 AI 연구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생물기술사무소는 AI-생명공학 융합 연구를, 전략기술사무소는 물리적 전장에서의 AI 응용을 담당하는 전략적 분업 구조다.
미군은 각 군별로도 전장 환경에 특화된 AI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 AI통합센터(AI2C)는 복잡한 지상전 환경에서 상황 인식 AI와 자율 지상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공군 자율역량팀(ACT3)은 고속 공중전을 위한 충성 비행부대와 예측 정비 AI를 연구한다. 이미 자율무인비행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는 단계이다. 해군 AI응용연구센터(NCARAI)는 해양 특수 환경에서의 상황 인식과 자율 수중 차량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실제 전장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 모델을 참고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직속의 인공지능 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국방부 전체의 AI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ADD의 국방AI센터는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연구진이 근무하는 독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육해공군 각군에도 특화된 AI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AI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이고, 군사 분야에서의 AI 격차는 곧 전력 격차로 직결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국방 AI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AI 2대 강국인 중국이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AI강군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기 때문이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2016kimkj@gmail.com

 1 month ago
10
1 month ago
10
![[부음] 김경웅(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씨 별세](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부고]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 조모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8/03/AKR20250803034800546_01_i_P4.jpg)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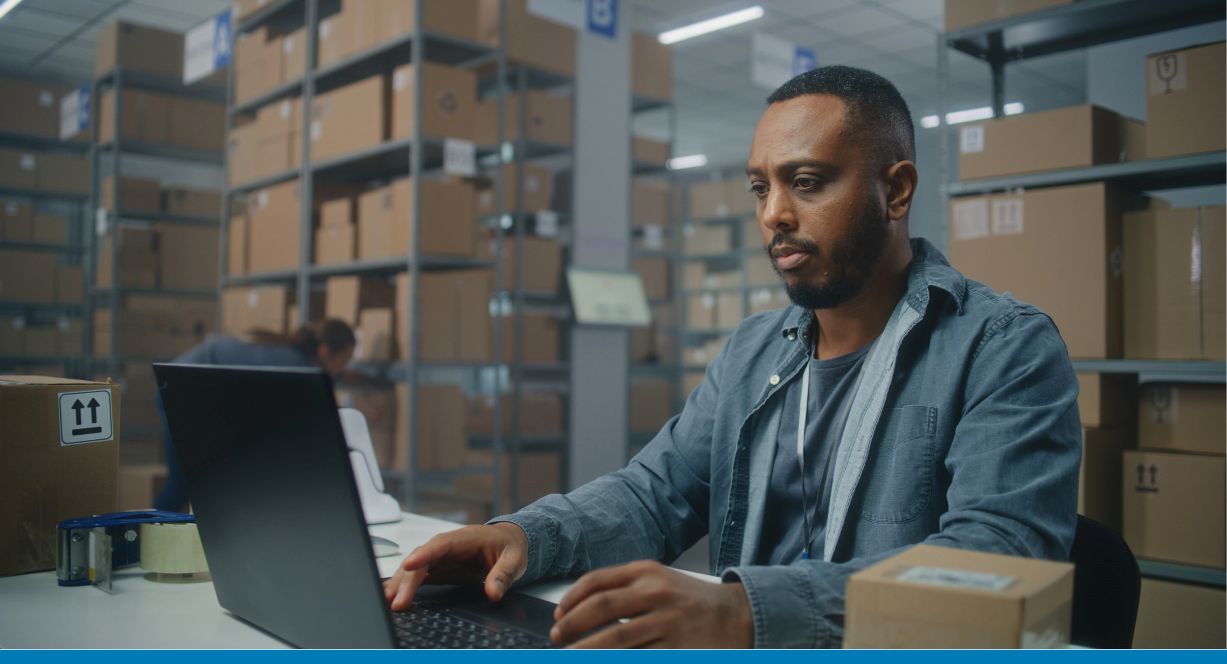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