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했을 때 업계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였다. 이름을 바꾸고 유료방송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정치적 대립 속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표류했다. 기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과 숙의, 정책 반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0/rcv.YNA.20260120.PYH202601200500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연합뉴스]방미통위 출범은 이런 배경 아래에 이뤄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을 재정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보다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합의제 기구에 참여하는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면 최소한 기존 조직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정파적 공방으로 인해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 현안은 쌓여가는데 책임 있는 결정은 내리지 않는 구조가 되풀이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일도 없다.
방미통위의 초반 3개월이 실망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국회 몫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해가 바뀌도록 전체회의마저 열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케이블TV와 콘텐츠 업계 1위 사업자가 맞붙었다. 단순 사업자 간 갈등이 아닌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방미통위가 '방통위 시즌2'가 아닌 '오리지널 방미통위'로 불리길 바란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합의제 기구라는 특성은 책임 회피의 명분이 아니다. 유료방송의 구조적 전환기에 방미통위가 공전하는 기구로 남을지, 혼란의 컨트롤타워가 될지는 초기 행보에 달렸다. '이번엔 다를까'에 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22 hours ago
3
22 hours ago
3
![[부음] 이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씨 모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공항서비스 1위'의 대역사와 안전·보안 [이호진의 공항칼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239975.1.jpg)
![[5분 칼럼] 쌀값 급등 반년, ‘먹사니즘’은 어디로 갔나](https://www.chosun.com/resizer/v2/ZL63CSKZAZBUPOQ4BOZTI7SLQ4.png?auth=d867c3f0e40b8902fed63d32fef8636396cc9cf1498dc1e2df7529e0e9ca3b3f&smart=true&width=500&height=500)
![20년 용산 개발의 꿈, 성패 가를 첫걸음[민서홍의 도시건축]](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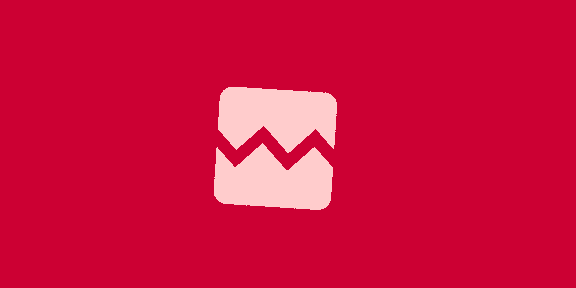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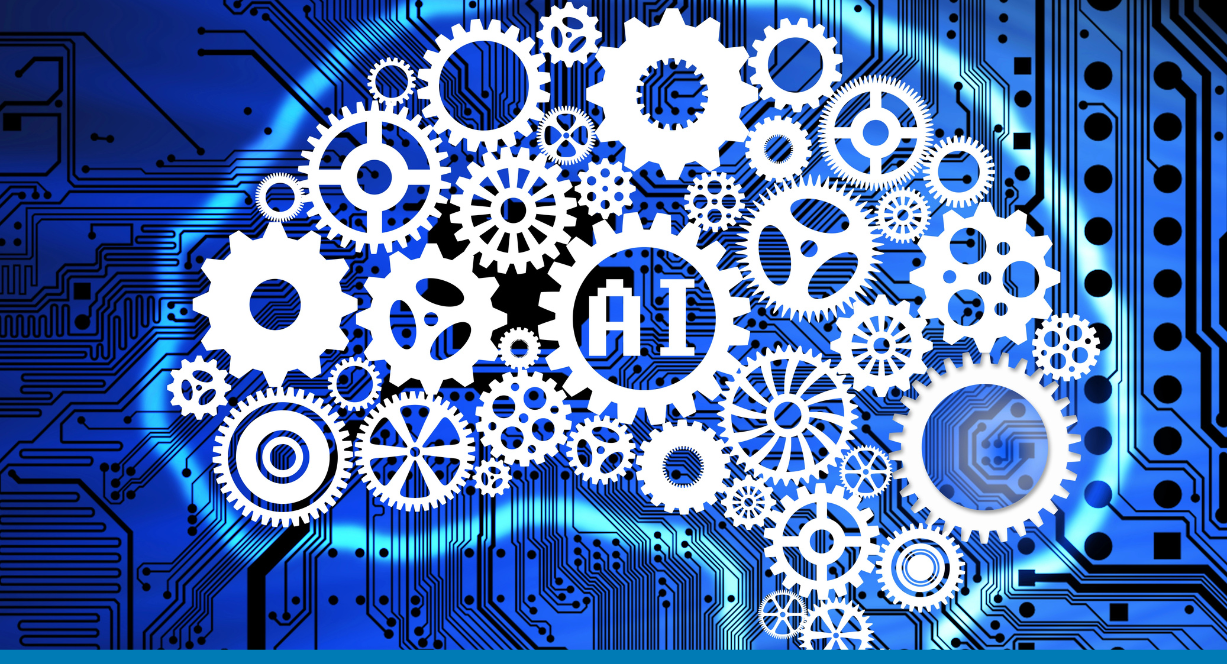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