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욕망의 시대, 멈춤의 미학](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41069730.1.jpg)
베네치아의 외교관 카사노바는 끝없는 욕망의 상징이다. 한 여성과 가까워지자마자 그 관계를 위해 쏟은 노력을 미련 없이 버리고 곧 또 다른 대상에게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관계의 완성보다 추구 자체에 집착하는 인간 욕망의 본질을 보여준다. 시시포스가 산꼭대기까지 굴려 올린 바위를 다시 굴려 떨어뜨리듯 욕망은 반복적으로 대상을 바꿀 뿐 빈번히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다. 더 넓은 집, 높은 연봉, 더 큰 인정. “여기까지만”이라고 다짐해도 욕망은 늘 한발 더 나아간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결핍에 직면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라고 부른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처럼 채워도 갈증이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자주 비교한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도 펜트하우스를 부러워하고, 억대 연봉자도 동료의 보수에 박탈감을 느낀다. 소셜미디어 속 여행 사진과 성공담은 우리 눈높이를 계속 끌어올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은 줄고 박탈감은 커진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면 곧 시들고 새로운 욕망으로 대체된다”고 했다. 그 순환 속에서 행복은 순간에 불과하고 공허는 오래 남는다. 성취의 정점에 서도 완전한 만족은 어렵고 “이 정도면 됐다”는 확신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이 모두 부정적이진 않다. 역사적으로 욕망은 개척과 도전의 동력이기도 했다. 거친 바다를 넘어 신대륙과 무역로를 개척한 바이킹의 항해, 세 대륙을 잇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오스만제국의 확장 등 인류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욕망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경제 성장과 소비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고 행복의 문턱을 계속 높인다. 한국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9위로 경제력에 비해 낮다.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인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할 때 더 오래 행복감이 유지된다. 셋째,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SNS 등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더 많이 가졌는데도 더 불행해지는 역설에 빠진다. 바우만이 말한 ‘액체 사회’처럼 기준과 목표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대라면 더 그렇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 세 가지를 떠올려보라.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걸을 때 욕망의 쳇바퀴를 멈추고 행복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비교의 시대에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9 hours ago
1
9 hours ago
1
![[MT시평]옆집 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1318255917288_1.jpg)
![[투데이 窓]쇠녹가루, 아연이 희귀금속으로 변신 중](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006224193902_1.jpg)
![[팔면봉] 용산 정책실장, 중대재해법 사례 들며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 문제 생기면 개정.”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원전 수출 큰 기회 열릴 수도, 정치적 논란 없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L27R7GUYN5KPXM7ESCJJ4QRVVI.jpg?auth=fcf5797d04ea7bdb4e2c0374b564bb036393cdfd933d8c43c6fb4658d4f9412d&smart=true&width=4768&height=3428)
![[사설]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https://www.chosun.com/resizer/v2/L4QEXVGQ7VICXN6YKDCABXMASI.jpg?auth=dd3362e56ba416c164782779505d5dcbdc3939efee83cd592352bb5c9d2b3419&smart=true&width=4000&height=2667)
![[사설] 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https://www.chosun.com/resizer/v2/FJSHC7BSWVGPVH7XJ4JJHVDYCE.jpg?auth=5f79b1cdd8f82b4d7cc8d5d8b771c5927758b2ee82835e7618417e13782db16d&smart=true&width=5068&height=2794)
![[김창균 칼럼] 文 왕따시킨 김정은·트럼프 커플, 李도 제물 될라](https://www.chosun.com/resizer/v2/447LYIWT45BQFBNOS2UQLH4JWE.png?auth=fd184644812b2733d3674ada1c48010cac07cf45dc54e705b17fec04f1dd11dc&smart=true&width=1200&height=855)
![[경제포커스] 4만7000원 봉투가 코뿔소 되기까지](https://www.chosun.com/resizer/v2/TS5LLJDP6ZHWZCZCFA6IXJF7QE.png?auth=990f5636c5448d011be0d72e063d002fde705a53c79d7062f8d8e3dbd718f0cc&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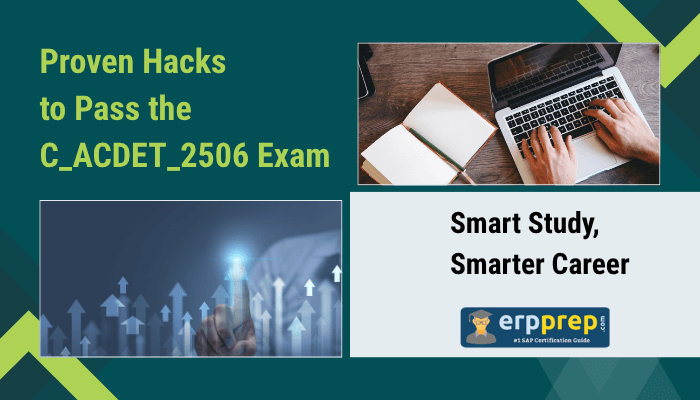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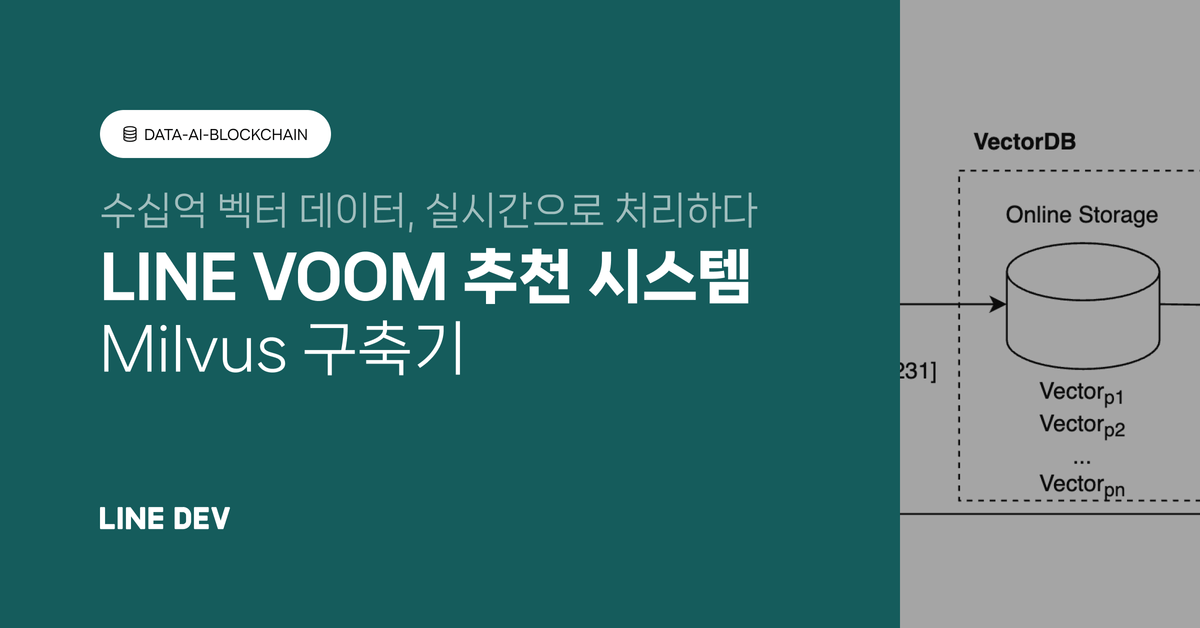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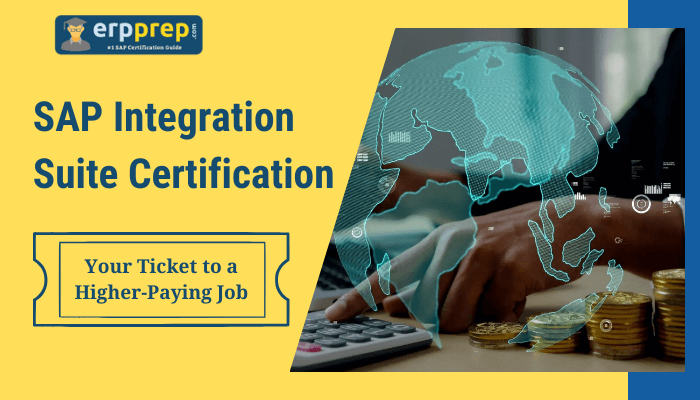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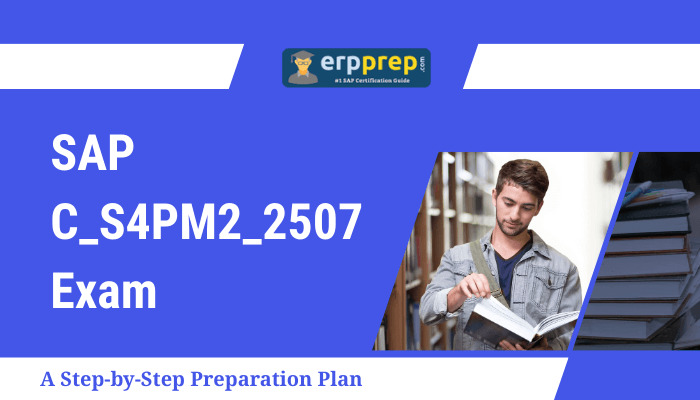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