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디자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037849.1.jpg)
철학자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말했다. 낡은 질서를 깨뜨려야 새로운 사유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무엇으로 할까. 디자인은 질문으로 한다.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이 공간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 “왜 우리는 미래를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마주할까”… 디자인은 이 ‘왜’를 던지며 시작된다. 그리고 함께 묻고, 설계하고, 바꿔나간다. 디자인은 사회와 미래를 다듬는 공공의 언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도시를 실험실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공공디자인 플랫폼으로 전환해 계단 높이, 글씨 크기, 동선 흐름 같은 일상의 디테일을 디자인한다. 이것은 단지 보기 좋음이 아니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다. 디자인은 약자를 배려하는 감성 기술이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 민주주의의 도구다.
디자인은 이제 도시를 벗어나 국경을 넘는 전략 언어가 됐다.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 감소, 문화다양성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디자인은 감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아 해법을 제시한다. 서울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들과 협력하며 디자인 외교의 거점 도시로 성장 중이다.
기술 발전도 디자인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를 그리고 사용자경험을 설계한다. 그러나 ‘왜’를 묻고, 감정을 읽고, 맥락을 해석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 디자이너의 몫이다. 디자인은 기술 중심 설계를 넘어 사람 중심 감성 설계로 나아간다.
차세대 디자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청년 디자이너와 기술 창업자들이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와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은 디자인창업센터, 디자인랩, 공공디자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세대, 세계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실험하고 있다. 디자인은 혼자 하는 창작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공공의 설계다.
세계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 핀란드는 정책 초안 단계부터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싱가포르는 디자인을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여도를 두 배로 늘렸다. 이제 한국도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디자인은 더 이상 산업이나 문화의 부속 개념이 아니다. 복지, 도시, 기술, 외교, 환경을 연결하는 국가의 전략 언어다. 그동안 디자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합해 미래를 설계할 중앙의 조율 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디자인위원회는 단순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부처 간 정책을 엮고 국가 전략을 디자인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디자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그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이 디자인을 삶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weeks ago
9
4 weeks ago
9
![[기고]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311264699304_1.jpg)
![[기자수첩]수사통제 외치는 검찰이 민망한 이유](https://thumb.mt.co.kr/21/2025/08/2025080210040612132_1.jpg)
![[우보세] 국민의힘이 부활하려면](http://thumb.mt.co.kr/21/2025/08/2025080114581667417_1.jpg)
![[사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https://www.chosun.com/resizer/v2/I6EKNPRKAAQA2JD5V6E4ZCNGTU.jpg?auth=0d650c9a1cbe40d75d28dd318b58af9207609810996968c6541e0f55a93b9a94&smart=true&width=3300&height=2200)
![[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https://www.chosun.com/resizer/v2/UAYT2TL4URFYJFXLG6B3RIGDXU.jpg?auth=75b7fec4d5e173ecf2c53b5ab6c7d01726b06ad119fa016278627ae497274f0e&smart=true&width=5583&height=3523)
![[사설] “수정” “강행” 엇박자,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https://www.chosun.com/resizer/v2/T4AXH4WEV64K5PAE7TNFUCBPOA.jpg?auth=f84f7d3c4425e08151c405f18477e140da8a1ecb2f5f05f059ab7b7bc70cbf27&smart=true&width=3180&height=2137)
![[朝鮮칼럼] 한미 동맹, 시야는 넓게 방향 전환은 유연하게](https://www.chosun.com/resizer/v2/PDX6RBPB3BAR3AILMJ6X3OE4UI.jpg?auth=772c03b98e8afb5f69c14ae0d73842aefd3bdc2d05c231961a95e039d104ce08&smart=true&width=3194&height=4791)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74] 힙합도 ‘메이드 인 차이나’](https://www.chosun.com/resizer/v2/6ROHNTZLEFF3HCS7O46ZABPHBA.jpg?auth=8a58465920a4ebad819dcc489cea70bebdfc6804dafa3083fa82b3cd60914f78&smart=true&width=340&height=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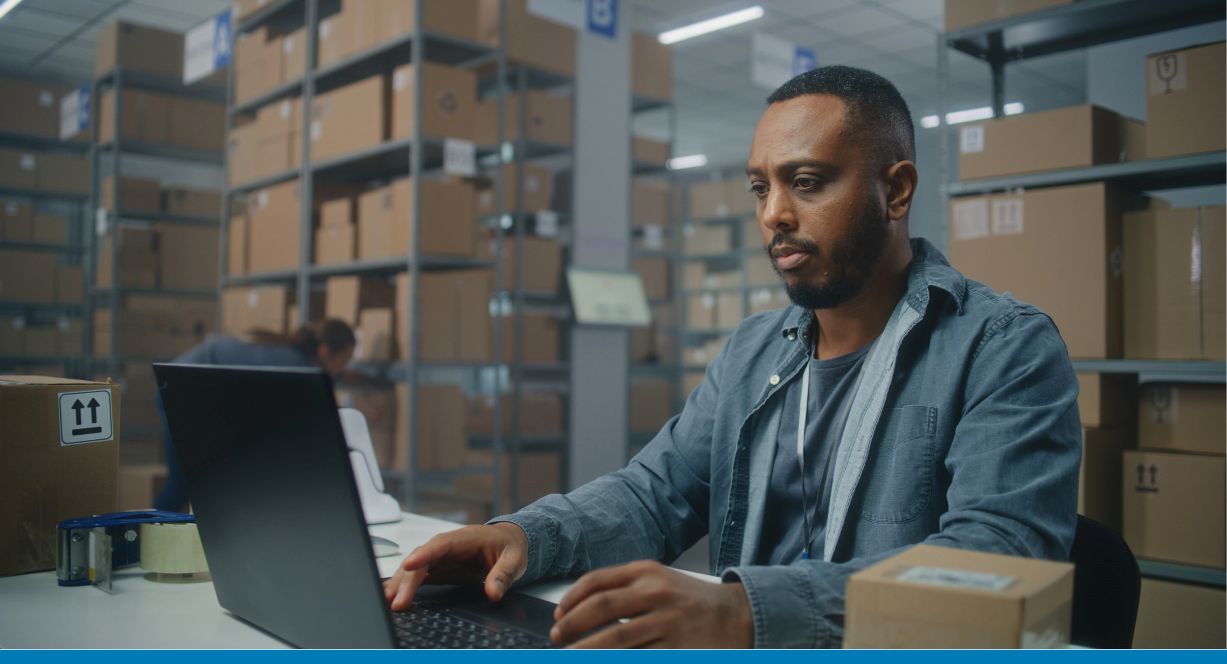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