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대학들은 투자업계의 ‘큰손’이다. 하버드대(약 532억달러), 예일대(414억달러), 프린스턴대(341억달러) 등은 수십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원래 이들의 자산 배분은 주식 60%, 채권 40%가 보통이었다. 1985년 월가 출신 데이비드 스웬슨이 예일대 기금 운용을 맡으면서 판이 바뀌었다. 그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대체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 20년간 연평균 13%대 이익을 거뒀다. 다른 대학들이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예일 모델’은 미국 대학 기금 운용의 표준이 됐다.
![[천자칼럼] 비트코인 투자 시작한 하버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AA.41370106.1.jpg)
하지만 이 모델도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헤지·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등 대체투자는 수수료 등 운용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엇보다 빠른 유동화가 어려워 자산 가치가 급변할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상당수 국부펀드에 못 미쳤다. 증시가 호황이던 지난해에도 평균 11.2%에 그쳐 주식 70%·채권 30% 포트폴리오(약 14%)보다 낮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4월 ‘예일 모델의 종말’을 예견한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이 약점이 더 부각됐다. 트럼프는 연방 보조금을 무기로 대학의 진보 색채 지우기에 나섰다. 수십조원을 굴리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지만, 보조금 삭감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웠다. 기금 자산 대부분이 대체투자에 묶여 있어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 등 상당수 대학이 교내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부와 타협했다. 아이비리그의 대표 격인 하버드대만이 아직 22억달러 보조금 동결에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하버드대가 최근 1억20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미국 대학 기금의 첫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다. 하버드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이지만, 기금의 80%가 대체투자에 들어가 있어 자산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투자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과도 부합한다. 암호화폐가 기금 수익률 저하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하버드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1 month ago
8
1 month ago
8
![[부음] 김호문(KBS창원총국 제작부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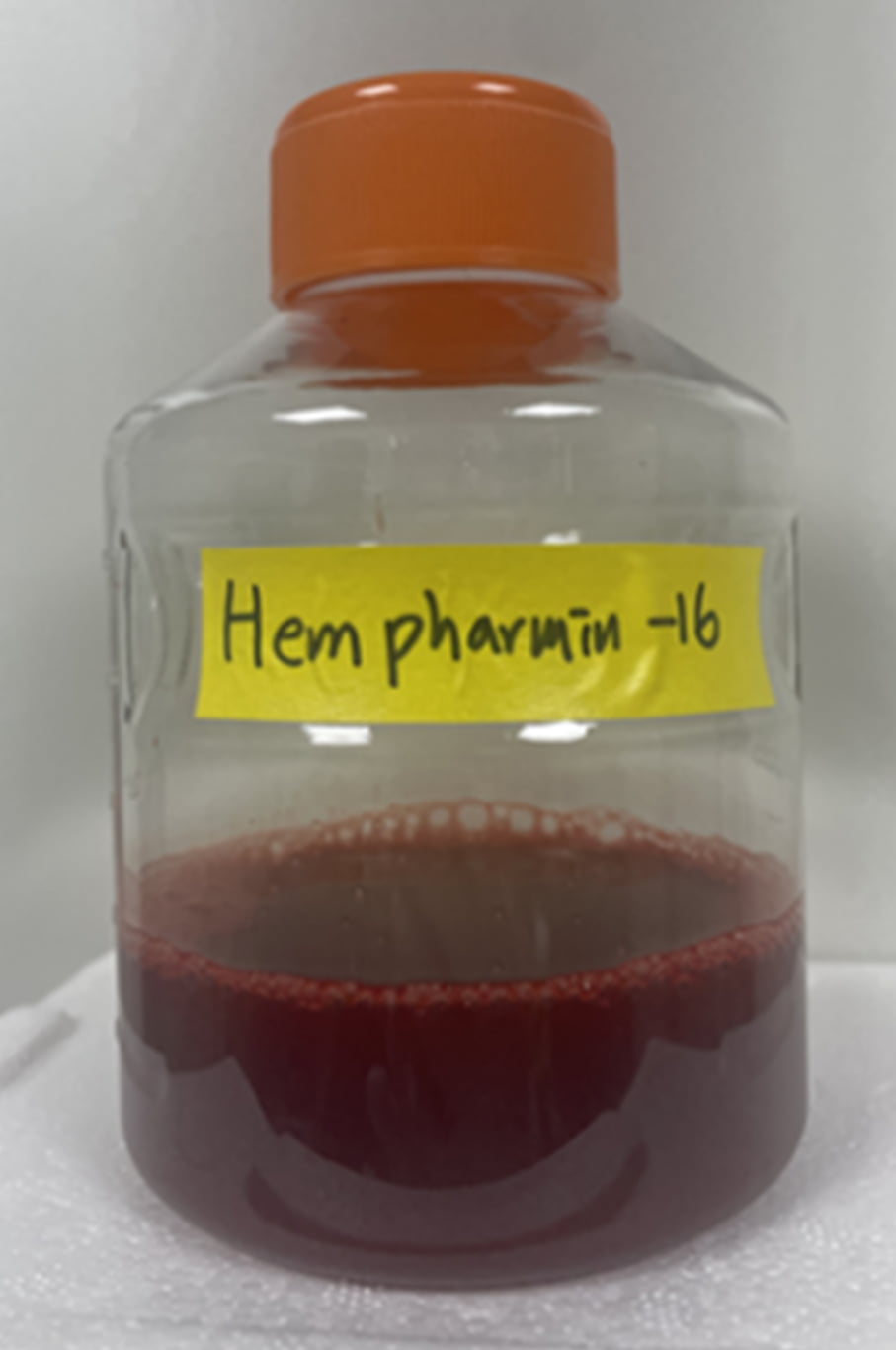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