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가 잡히지 않아
개인 용달을 불렀다
고개를 내민 기사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짐은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바로 짐입니다
읽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시다. 용달을 모는 기사는 짐을 찾는데 그 짐이 다름 아닌 ‘나’라는 아이러니! 짐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웃음이 난다. 쉽고 간결한 시인데 웃음 끝에 묘한 여운이 남는다. 용달차에 실려 흘러가는 ‘누군가의 모르는 하루’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일까? 화자는 어느 곳에 얌전히 내려지려나? 도착지는 집인가 약속 장소인가, 그것도 아니면 가고 싶은 어느 곳일까? 아무튼 도착이 아닌 배송이 될 화자의 처지를 헤아리다 보니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다. 덜컹덜컹 실려 가고 실려 오는 하루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어느 때 ‘짐’이란 말을 쓸까. 필자는 많아도 너무 많은 집 안 서재의 책들을 말할 때 ‘짐’이란 단어를 쓴다. “아, 책은 정말 짐이야. 버릴 수도 없고.” 지인이 무언가를 광적으로 수집할 때 참견도 한다. “그거 언젠가는 다 짐이 될 텐데.” 짐은 무엇이기에 사람을 번거롭고 난처하게 만들면서 버리지도 못하게 할까. 짐이라는 단어를 톺아보자. 우선 짐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건 부담을 준다. 부담을 준다는 건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찮은 것이 아니란 건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 아, 그렇다면 짐은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의미 있는 것이기에 이고 지고 다니게 되는 무엇 아닌가?
만약 이 짧은 시를 읽고 웃음이 쓸쓸한 미소로 번졌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는 ‘나’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데리고 다니다 죽을 때야 놓여 날 수 있으리란 것. 소중하고 무거운 짐이여.박연준 시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hour ago
2
1 hour ago
2
![[팔면봉]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본회의 20일 전에도 최종 확정 못 해.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검찰 개혁’ 정당성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https://www.chosun.com/resizer/v2/RPFTXPU2VFLHVAW6LGOMKCJ2P4.jpg?auth=fcb8013c236f783adddb828b594913a170c0bbd89e1616d4fa614fea19ad86d4&smart=true&width=2809&height=1998)
![[사설] 일본차 美 관세 인하, 우리도 최종 타결 시급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HPVFXO6S25CKLLASET2BWD3UZM.jpg?auth=d112ee5fa209b79ba99f126c8bf9b03dc42ed21fb42a12774a1cdb328b454547&smart=true&width=5000&height=2224)
![[박정훈 칼럼] 이진숙이 면직이면 임은정·최교진·최동석은?](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에스프레소] 한국 50대 중년 남성의 고독](https://www.chosun.com/resizer/v2/X3QVQAIBDJGFZLWTUWMLWMRJNU.png?auth=c83f860ac7d3c8544dd35671e4b770dab96adf370fc1ced5c326c5fcc5a78ba0&smart=true&width=500&height=500)
![[기자의 시각] 인권 위에 동물권이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WMMWAHEEHZC3NDRPO4JEQNRUEU.png?auth=0e5f07681f120bd2edc5dcc9ddea76f0a0571832097ad027bf5bdef67cb4bc1c&smart=true&width=500&height=500)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304] 여객기, 작품이 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YFG3S32BJNH5LOOLHAIUUJVZLE.jpeg?auth=ba9fd6be8649168c365988c3939713da06467f00c764f7116b489d9104b743d8&smart=true&width=5465&height=4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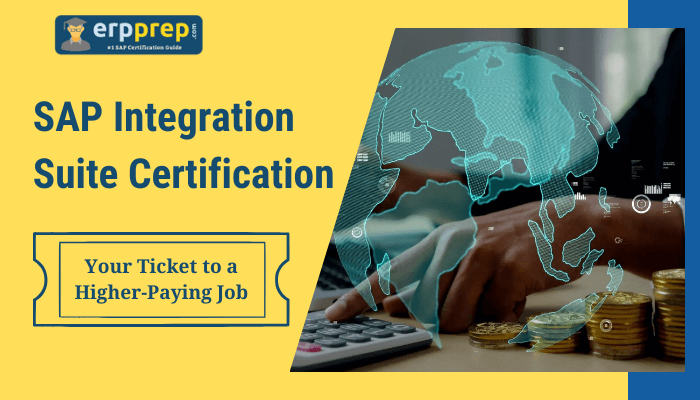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