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관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2035년까지 1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2만 가구를 합하면 국유지에서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셈이다. 기존 용산 유수지(330가구), 대방군관사(185가구) 등에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이 새로 포함됐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이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공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 절차를 단축해 공급 시점을 2032~2033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계 역시 뚜렷해 보인다. 우선 이번 1만5000가구가 모두 임대 등 공공주택이라는 점이 그렇다. 국유지 개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민영주택이 빠지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유휴지 활용의 물리적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계획과 합쳐도 3만5000가구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한 곳에 못 미친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6·27 대책 이후 숨을 고르던 서울 집값은 지난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시장은 조만간 나올 이번 정부의 첫 공급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급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집값 불안은 재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윤곽을 보면 4기 신도시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유지 등 획기적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LH 중심의 공공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공공주택 위주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급 숫자만 늘려서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효과가 있다. 결국 서울 민영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원·학교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도 해볼 만하다.

 1 week ago
5
1 week ago
5
![[기고]홍수는 왜 취약계층에게 더 잔인한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107594614404_1.jpg)
![[부음]조용국(빙그레 홍보담당 상무)씨 모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바로잡습니다] 20일 자 A30면 ‘데스크에서’ 중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https://www.chosun.com/resizer/v2/URP5GVBUCRNB7GHV6L7RYPCP7E.jpg?auth=764fbce059bbee0968ee0fda60929d4915b010588c65fe8af708db85e818cb03&smart=true&width=5202&height=2520)
![[사설] ‘가짜정보 근절법’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음모론부터 적용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TPDXKRSFQBNO7GSOL6JZXNBK6E.jpg?auth=f791d32130855fe4ecedb7089679b374fcc49cee1e2f4f143a01ad7cdb71036d&smart=true&width=2880&height=2024)
![[사설] 개선장군 행세 조국, “사면 피해” 호소하는 대통령실](https://www.chosun.com/resizer/v2/FVFZM2SBJYFH2CAJHKY6LMQOAI.jpg?auth=3dedd63d456cfb9534979d86fac383e22e125fa3b1eae465dbcc12bf2ed740cd&smart=true&width=5214&height=3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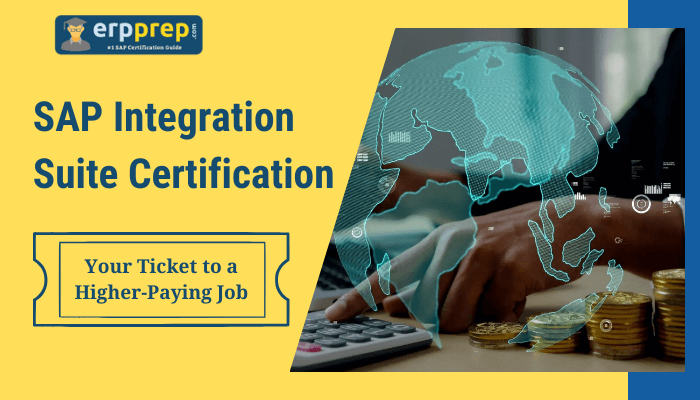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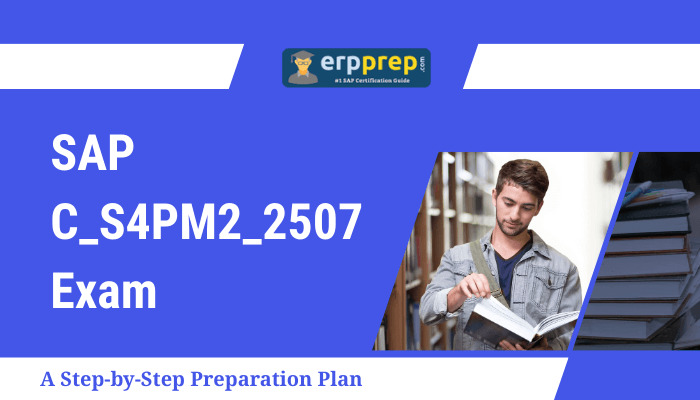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