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우크라 빠진 미·러 정상회담…'韓 패싱' 대비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39223313.1.jpg)
세기의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방미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며 정상회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대러 제재 최후통첩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이 “핵 보복 시스템 ‘데드 핸드(Dead Hand)’의 위험성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배치로 맞불을 놓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출했다.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라는 냉전 시기 강대국의 문법을 소환한 셈이다.
알래스카를 회담 장소로 선택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매각한 땅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하지만 사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미·러 정상 모두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러시아산 LNG 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극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알래스카는 미국과 러시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적의 정상회담 무대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종전 구상을 지지하고,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는 ‘빅딜’이 성사될 조짐이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은 현대판 ‘얄타 회담’이자 세기의 사건이다.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대상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유라시아의 ‘큰손’ 푸틴 대통령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우크라이나 패싱’이다.
미·러 정상이 종전 원칙에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회담 결과를 통보하거나 종전안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러가 제도적으로 합의할 종전 원칙은 군사적 통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불가역적 지배권 인정,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및 대선 실시 등으로 관측된다.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일부 영토를 반환하거나 교환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푸틴 대통령은 막대한 희생을 통해 확보한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포기할 뜻이 없다. 대신 완충지대 구축 등 군사상 필요에 따라 점령한 수미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자포리자 원전 소유권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지지했고, 24%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개전 초기에는 73%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찰권 강화를 위해 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검(SAPO)을 검찰총장 직속으로 재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결정, 죽은 채로 탄생한 결정”이라며 미·러 회담에 반기를 드는 이유다.
사흘 뒤면 광복 8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인 이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이 특수작전군 등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와 직결된 사안이다. 푸틴 대통령의 미국행은 강대국 정치의 복원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서 ‘한국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뒷배를 자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러 간 소통 채널을 점진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

 1 month ago
8
1 month ago
8
![[부음] 김호문(KBS창원총국 제작부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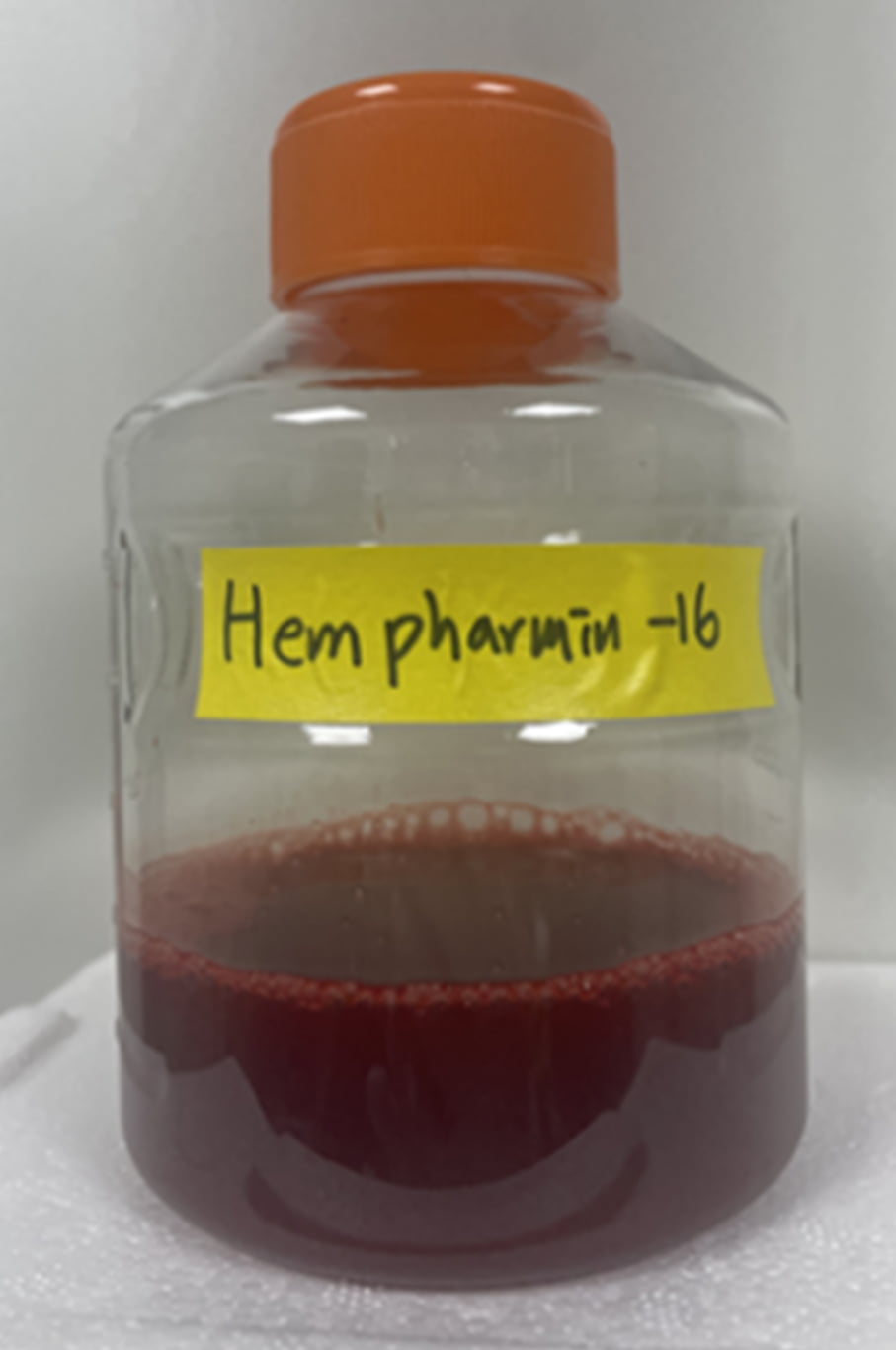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