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명품 매장에선 백발의 영업직원을 찾아보기조차 힘든 게 사실이다. 국내 고령층의 척박한 고용 환경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올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 명이었다. 취업자와 실업자 등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고령층이 1000만 명을 돌파한 셈이다. 그런데 고령층 취업자 가운데 단순노무직(22.6%) 비율이 유독 높았다. 비교적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훨씬 낮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미래에 우려를 더한다.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인이 늘면 빈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퇴직 직후 나오질 않아 당분간 소득 공백기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대량 퇴직으로 빈곤 노인들도 대량 양산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더구나 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일찍 일터를 떠나고 있어 더 안타깝다. 이번 조사에서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52.9세였다. 고학력자가 많은 관리자나 전문가의 경우 평균 53.4세였다. 초고령사회에 맞게 개혁되지 못한 노동시장의 헐거운 틈 사이로 숙련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0대 초반은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베테랑으로 남느냐,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을 재교육하고 재배치하면 노련함이 빛나는 베테랑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일자리나 자영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버티다 빈곤 노인이 되기 쉽다.
기업들도 오래 일한 시니어들을 다시 봐야 할 때다. 최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기업 124곳의 직원 연령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0대 이상’의 비중이 ‘30대 미만’의 비중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젊은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50대 이상의 생산력을 배가할 방법을 찾아야 기업도 이익일 것이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중년층을 계속 고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할 수 있다. 달라진 인력 구성에 맞게 시니어 인력의 노동시간이나 강도는 낮추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고령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중장년 직원의 재교육과 경력 전환, 재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발굴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더욱 늘려야 한다.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4
1 month ago
4


![[부음] 김호문(KBS창원총국 제작부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K바이오 숨통 끊는 사모펀드[류성의 제약국부론]](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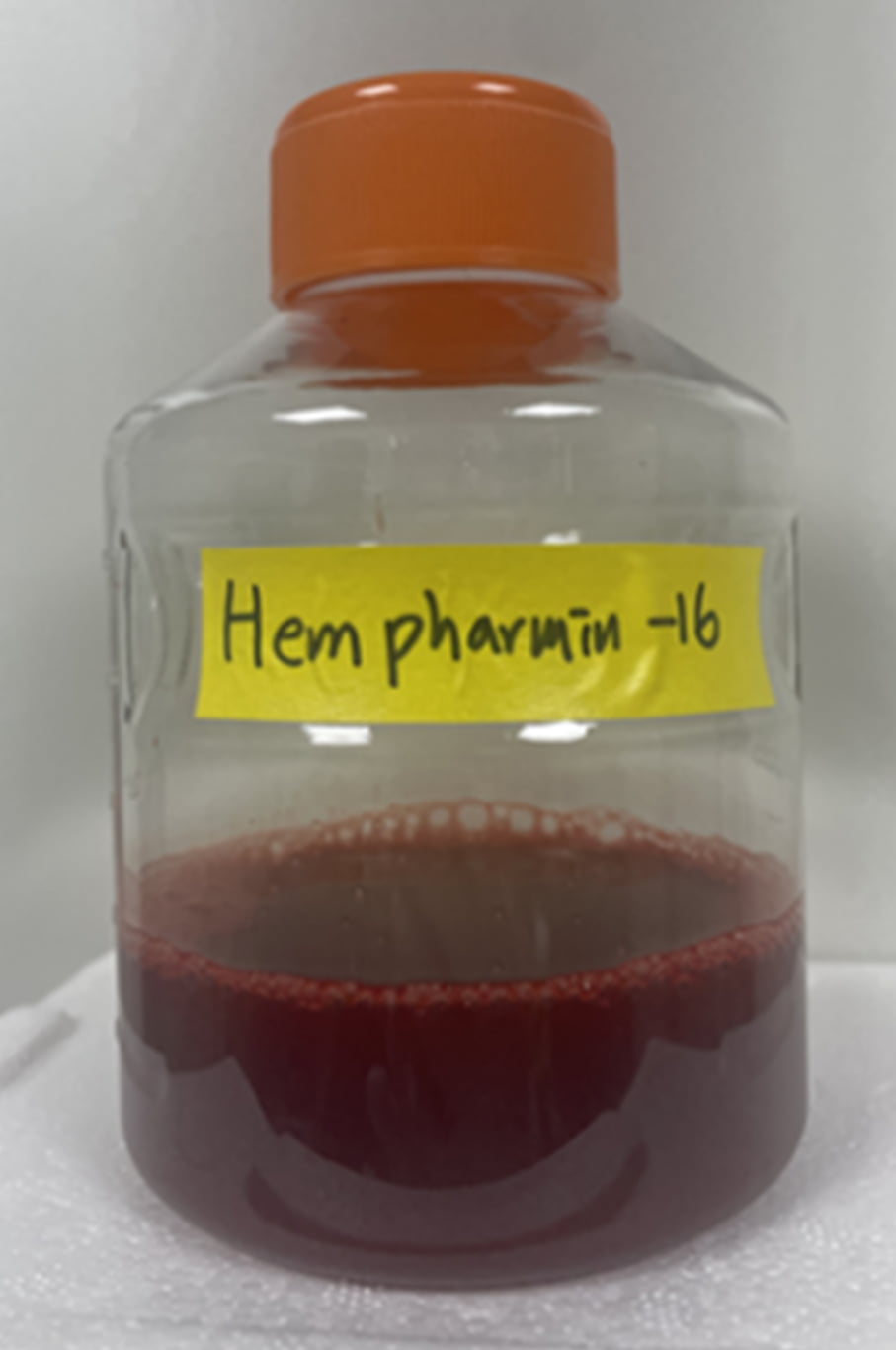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