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주의 테크 인사이드] 삼성이 머스크에 꼭 배워야 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32217296.1.jpg)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자신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연구원’(researcher) 직함을 없앴다. 머스크는 “연구원이라는 용어는 얄팍하게 포장된 허세 가득한 표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의 발단은 xAI 직원인 아디티야 굽타가 올린 “xAI에서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다. 머스크는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스페이스X에 연구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세계 AI 4대 석학 중 한 명인 얀 르쿤 메타 수석과학자는 “연구와 엔지니어링을 구분하지 않으면 혁신이 사라질 것”이라며 머스크에 맞섰다.
지식 추구자 vs 문제 해결자
![[강경주의 테크 인사이드] 삼성이 머스크에 꼭 배워야 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AA.41379530.1.jpg)
미국 내 기류는 엔지니어 우대론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오픈AI, 앤스로픽 등 AI 기업들은 ‘리서처’ 대신 엔지니어링 개념을 접목한 ‘기술 스태프’(member of technical staff)라는 직함을 신설했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연구원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꼬집기도 했다. 빅테크들의 엔지니어 우대는 연봉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AI 인재 채용업체 해리슨클라크에 따르면 빅테크 엔지니어의 연봉과 스톡옵션, 보너스를 포함한 보수 패키지는 올해 300만~700만달러로 2022년보다 50%가량 늘어났다. 연구원의 패키지는 2022년 40만~90만달러에서 올해 50만~200만달러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구원과 엔지니어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원은 지식 추구가 우선이다. 엔지니어는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을 활용한다. 차이의 핵심은 기술 상용화와 산학 협력이다. 머스크가 연구원 직함 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빅테크 내 연구원과 엔지니어 간 보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 상용화가 갈수록 중요해져서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4 한국 특집호’를 통해 “한국의 연구개발(R&D) 성과는 예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혹평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기술 사업화 현황은 처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술이전이 성사된 계약 1만1791건 중 제품 생산에 활용돼 매출을 얻고 있는 사례는 19.2%인 2265건에 불과했다.
기술 전쟁 속 엔지니어는 군인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개최한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은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 275개 기관의 기술 개발은 2023년 3만9930건으로 최대 실적을 썼지만 기술이전 비율은 30.2%에 그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낮추고 인프라와 기업효율성도 지난해 각각 11위, 23위에서 올해는 21위, 44위로 내렸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조한 기술 사업화 비율이 꼽혔다.
엔지니어 군단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머스크가 이 시점에서 기술 동맹 파트너로 삼성 파운드리를 낙점한 것은 기업 간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삼성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직접 엔지니어로 뛰며 수율 개선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삼성으로선 연구 논문 속에서 이론상 가능하던 수율 잡기가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유를 밝힐 기회다. 소통 없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혁할 최적의 타이밍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다.
중세 유럽 시대 엔지니어는 군사 분야에서 활동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쌓고 다리를 건설했다. ‘공병’의 영어 표현이 ‘engineer’다. 현대 기술 패권 전장에서 미국을 지휘하는 머스크의 치열한 엔지니어 정신을 삼성과 국내 학계가 배워야 할 때다.

 1 week ago
3
1 week ago
3
![[기고]홍수는 왜 취약계층에게 더 잔인한가](http://thumb.mt.co.kr/21/2025/08/2025082107594614404_1.jpg)
![[부음]조용국(빙그레 홍보담당 상무)씨 모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바로잡습니다] 20일 자 A30면 ‘데스크에서’ 중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https://www.chosun.com/resizer/v2/URP5GVBUCRNB7GHV6L7RYPCP7E.jpg?auth=764fbce059bbee0968ee0fda60929d4915b010588c65fe8af708db85e818cb03&smart=true&width=5202&height=2520)
![[사설] ‘가짜정보 근절법’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음모론부터 적용해야](https://www.chosun.com/resizer/v2/TPDXKRSFQBNO7GSOL6JZXNBK6E.jpg?auth=f791d32130855fe4ecedb7089679b374fcc49cee1e2f4f143a01ad7cdb71036d&smart=true&width=2880&height=2024)
![[사설] 개선장군 행세 조국, “사면 피해” 호소하는 대통령실](https://www.chosun.com/resizer/v2/FVFZM2SBJYFH2CAJHKY6LMQOAI.jpg?auth=3dedd63d456cfb9534979d86fac383e22e125fa3b1eae465dbcc12bf2ed740cd&smart=true&width=5214&height=3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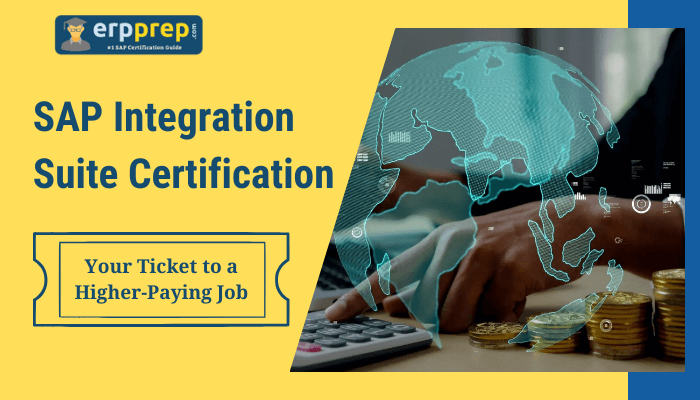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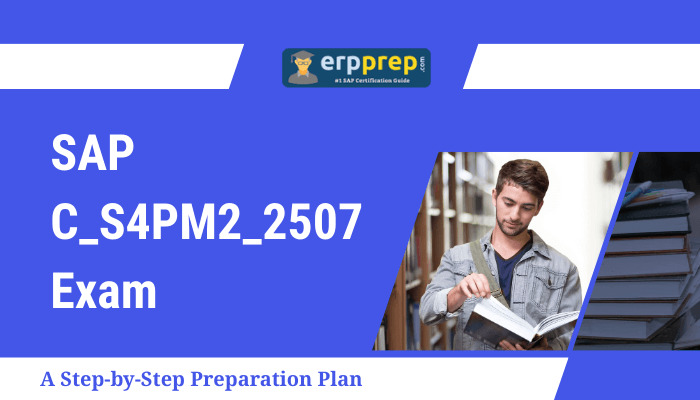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